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내가 갑이라니! 번역가를 ‘갑’으로, 출판사를 ‘을’로 표기한 번역 계약서를 받아들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한다. 출판번역에 입문하기 전 기술번역에 몸담아서인지 몰라도 ‘출판사’라고 하면 곧바로 ‘클라이언트’를 연상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의뢰인’ 또는 ‘고객’으로 번역된다는 사실, ‘고객’이 어떤 진부한 모토에서 특정한 지위와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진짜 갑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가끔 출판사를 ‘갑’으로, 번역자를 ‘을’로 표기한 번역 계약서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땐 그것이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거나 (한발 더 나아가) 프로이트적 말실수라기보다는 번역자에게 “네 주제를 알라!”라며 내리치는 죽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원고와 씨름할 땐 누구 못지않게 고귀한 정신노동에 종사하고 세계적인 지성과 대결하고 창작의 고통과 희열을 맛보지만, 계약서에 서명할 때만큼은 내 주제를 자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창작 못지않게 노동임을 명심하고 노동의 대가를 악착같이 받아내겠노라 다짐한다. 계약서는 내 속의 속물을 깨운다.
번역을 전업으로 선택하면서 기대한 것 중 하나는 ‘원치 않는 인간관계’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치 않는’은 ‘인간관계’의 수식어가 될 수 없었다. 인간관계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였다. 전업 번역가가 되고부터는 조금, 지나치게, 외로울 정도로 인간관계와 단절되었다. 물론 번역이라는 일 자체가 정의상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 상대방은 지금 내 앞에 없고 내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 당신은 내가 이 순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나는 당신이 부디 그래주길 간절히 바라지만!―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즈음 나는 번역 인생 최대의 위기라 할 어떤 잘못된 만남으로 고통받느라 당신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다다음주에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고 신선놀음을 하던 번역가가 어쩔 수 없이 속세에 발을 디뎌야 하는 순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번역료 협상이다. “번역료는 실력이 아니라 속력에 비례한다”라는 지론에 따라, 번역료 한두 푼 가지고 실랑이 벌일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번역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선배들이 번역료를 올려 받아야 후배들도 혜택을 본다”라는 말을 동료 번역가에게 듣고서 내 번역료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번역계의 문제라는 묘한 사명감을 품게 되었다. (‘명분’이나 ‘정당화’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건 뇌의 신경 회로에 단락短絡이 일어난 탓이겠지?)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 뒤로는 번역료 올릴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15년 전, 내가 번역가로 데뷔했을 때의 번역료는 지금 시세와 비교하면…… 정확히 동일하다. 내가 번역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던―내 이름으로 된 번역서가 한 권도 없었으니까!―초창기에는 매당 1500원에 번역한 적도 있다. (그 출판사 사장이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초보를 믿고 번역을 맡겨준 것이니 어떻게 보면 은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은 출판사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 나는 대체재가 차고 넘치는 제품 같은 존재였으니까. 쥐꼬리만 한 번역료를 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쥐꼬리만 한 번역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최종 원고를 보내고 한 달 뒤에 번역료를 받기로 계약해도 출판사 사정을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자신의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자신이 버젓한 직업인이 못 된다는 생각은 번역가의 으뜸가는 슬럼프 원인일 뿐 아니라 번역가라는 꿈을 품은 수많은 이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번역가들이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신도 살아남았군요’라는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 아닐까.
 언스플래쉬내가 번역료를 200자 원고지 1매당 500원 인상한 것은 2012년 8월 31일이다. 그때까지 나온 번역서가 스물세 종쯤 되니 경력이 꽤 쌓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기는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민음사, 2011)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번역가를 대표하여 온라인에서 떠들썩하게 벌인 번역 논쟁이 몇몇 언론에 소개되고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서 번역가로서의 인지도가 조금 높아진 것이다. 나는 번역가의 몸값이 이름값과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막연히 판단했다. 물론 번역자가 책의 판매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읽는 번역가’가 되고 싶기는 하다.
언스플래쉬내가 번역료를 200자 원고지 1매당 500원 인상한 것은 2012년 8월 31일이다. 그때까지 나온 번역서가 스물세 종쯤 되니 경력이 꽤 쌓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기는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민음사, 2011)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번역가를 대표하여 온라인에서 떠들썩하게 벌인 번역 논쟁이 몇몇 언론에 소개되고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서 번역가로서의 인지도가 조금 높아진 것이다. 나는 번역가의 몸값이 이름값과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막연히 판단했다. 물론 번역자가 책의 판매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읽는 번역가’가 되고 싶기는 하다.
몸값과 이름값의 관계는 번역가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하다. 선배 번역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잘나가던 한 번역가가 1년간 일을 쉬었더니 그 뒤엔 어떤 출판사도 번역을 의뢰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내가 SNS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개인 계정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번역가 노승영’ 계정만은 차마 포기하지 못한 데는 이런 탓도 있다(답답한 속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출판사)가 찾아주지 않으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프리랜서에게 ‘잊힌다는 것’은 실존적 공포의 대상이다. 번역할 책이 몇 권 남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내가 어떤 책도 마다하지 않는 잡식성 번역가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측건대 출판사에서 번역가를 고를 때 이름값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동료 편집자들의 평가다. 번역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는 “OOO 편집자에게 추천받았는데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작업 의뢰 메일을 받았을 때다. 내 번역을 좋게 봐주고 동료들에게 소개한 편집자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은인이다. “편집자들이 뽑은” 《시사인》 ‘올해의 번역가’ 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서툴고 하기도 싫어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밀당이다. 얼마나 싫으냐면 문예지 《악스트》 편집위원을 지낼 때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하소연을 편집후기에 썼을 정도다. 원고를 청탁하고 종종 퇴짜를 맞는 일이 힘겨워서 엄살을 부린 것인데, 사실 번역가에게도 밀당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 꼭 찾아온다. 출판사로부터 번역 의뢰를 받을 때면 종종 “그런데 번역료는 얼마 받으시나요?”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온갖 상념이 회오리친다. ‘얼마를 부르면 저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일까? 너무 욕심 부리다가 일 끊기면 어떡하지? 아무개 번역가는 얼마를 받았을까? 내 깜냥보다 더 받았다가 편집자에게 먹튀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 게다가 출판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료를 마냥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는 것은 200자 원고지 1매당 500원을 올려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내 자존심과 생계와 (출판사 입장에서의) 가성비가 500원에 좌우되는 것이다. (하찮은 금액이라고 생각된다면 단행본 한 권이 원고지 1000~2000매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다음번 번역 계약서를 써야 할 때가 되면 나는 다시 내 속의 속물을 깨워 언제쯤 500원을 더 올려 부를 수 있을지, 과연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줄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것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노승영(번역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환경 단체에서 일했다.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을 썼으며, 『제임스 글릭의 타임 트래블』, 『당신의 머리 밖 세상』, 『헤겔』, 『마르크스』, 『자본가의 탄생』 등을 번역했다.







![[노승영의 멸종 위기의 나날들] 리셋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8/b/a/d8ba18c878d4a70c9eaa33fbdf57b89e.jpg)

![[홍승은의 무해한 말들] 서로의 떨림에 접속하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5/6/9/05698ed894ac8aacbfc032f6c6fe120c.jpg)

![[윤경희 칼럼] 인 메디아스 레스 IV (사건의 한가운데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7-01550e2f.jpg)

![[더뮤지컬] 애정으로 읽어낸 여성 캐릭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4-e1e5d4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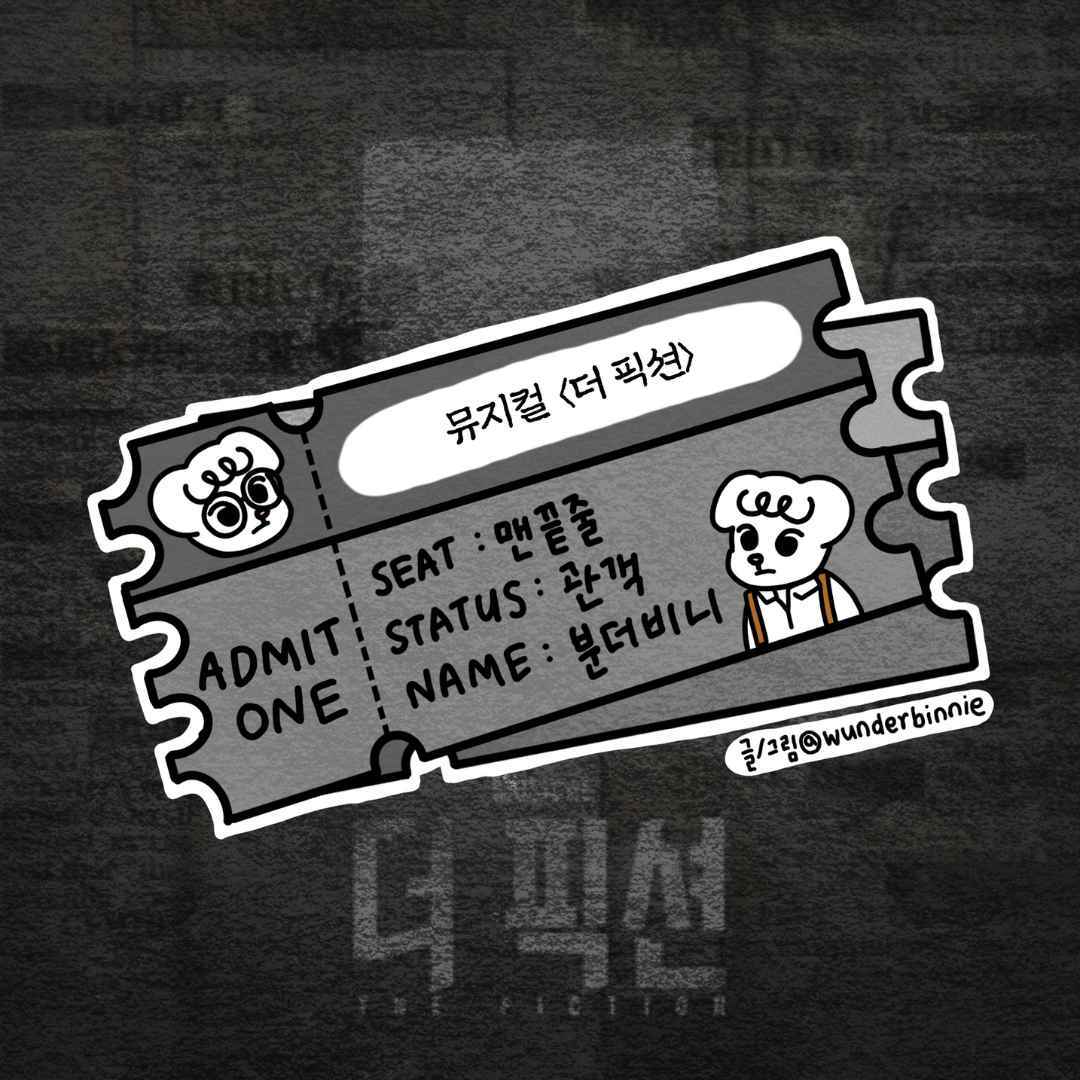
![[큐레이션] 자궁근종인의 식탁에는 고기가 없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3-acdded8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