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프로필은 짧을수록 좋다. 구구절절 자신의 이력을 밝히는 건 되게 촌스럽다. 독자에게 상상력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에요” 보다는, “커피를 좋아한다”, “두 권의 시집을 냈다”는 이야기가 더 끌린다. 가끔 궁금하다. 책 날개에 적힌 저자의 프로필, 누가 썼는지. 담당 편집자가 적어서 저자에게 컨펌을 받았을지, 저자가 직접 적었을지? 대부분 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꽤 간지러운 수식어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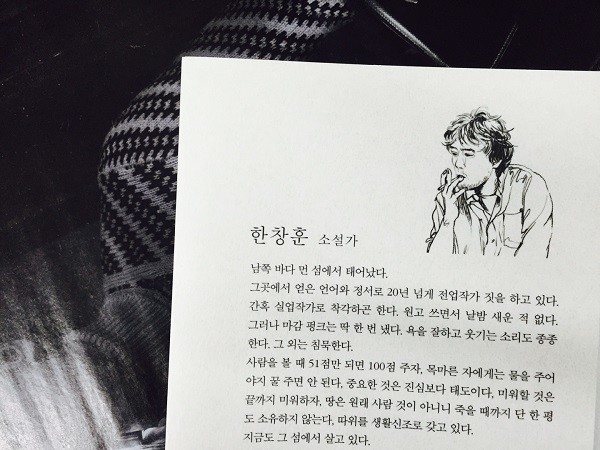
51점인 사람에게 100점 주기, 참 힘들지만
2주 전, 한창훈 작가의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 를 읽으며 프로필을 봤다. “남쪽 바다 먼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저자 소개. “원고 쓰면서 날밤 세운 적 없다”고 밝힌 저자는 “마감 펑크는 딱 한 번 냈다”고 썼다. 엇,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마감 잘 지키는)! (인터뷰 때 여쭤보니, “펑크를 낸 것도 달을 착각해서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귀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사람을 볼 때 51점만 되면 100점 주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어야지 꿀 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이다, 미워할 것은 끝까지 미워하자.”
몇 해 전, 사회생활에서 맺은 여러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그 때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의 장점이 몇 개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면” 좋은 사람으로 여기자는 것이었다. 단점 없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단점들 때문에 장점까지 인정하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다. 물론, 커버해줄 장점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 단점이 무지막지하게 커서 대화조차 하기 싫다면 그 사람과의 연락은 쫑.
소개팅을 한 후 “이 남자 만날까?”라고 묻는 친구들에게도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만나”라고 했다. 우리는 누구에게 100점짜리 인간이 되어본 적이 있나?
가끔 이상형 리스트를 적어서 보여주는 후배들이 있다. 한 달 전, 내가 어여삐 여기는 후배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리스트를 내밀었다. 실로 대단했다. 이건 무슨 논문도 아니고. 항목이 20개가 넘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능력, 성격, 취향 등등. 뺄 건 다 뺀 거라고 했다. 난 훅 훑어 보고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넌 이 리스트에 몇 개를 동그라미 칠 수 있어?”라고 물었다. 후배의 두 볼이 발그레 물이 들었다. “너 요리 잘해? 재테크 잘해? 너 영어 잘해? 왜 너도 못하는 걸 상대에게 원해?” “제가 못하니까 상대가 잘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 두 개만 바라야지. 이건 좀 심하지 않니?” 미안하지만, 그 후배는 한동안 연애를 못할 것 같았다.
요즘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51점’ 기준을 두려고 한다. 내가 상대에게 49점일 수도 있는데, 뭘 100점을 바라나. 마음에 들지 않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떠올린다. “아, 이런 장점이 있지? 그러면 패스.”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봐줘야 하는 거 아냐?
소설가 한창훈의 소개글에서 다시 한 번 밑줄을 그었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문제다. 진심은 이게 아니니까 봐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다. 지난 4월, 개그맨 장동민이 과거 방송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당사자에게 자필 편지를 전달해 사과를 받았단다. 그러나 장동민은 <무한도전> 식스맨 촬영에서만 빠졌을 뿐 방송활동을 예전과 다르지 않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했고 사과했으리라 믿고 싶지만, 잘못마저도 개그 소재로 사용한 장동민의 행동은 ‘글쎄’다. 진심이 어떻든 나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사사로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 고마운 건 고맙다. 표현을 해야 한다. 어제 한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일을 하고 있는데, 옆 팀 직원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서성거리고 있길래, 쪼그려 앉아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줬단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2초간 자신을 훑고 지나갔단다. 이게 가능한 행동인가? 인사를 안 하는 사이라 어색해서? 나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그 직원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타인을 이처럼 하대하는 사람은 싹수가 보인다.
한 페친의 말처럼 “쿨병에 걸린 현대인들은 마치 불친절한 태도가 쿨의 상징”인 줄 착각한다. 시크하다못해 때론 무서운 느낌마저 든다. 가끔 속으로 생각한다. 언젠가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 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행동하지? 사회적 관계뿐만이 아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평생 갈 사람이니까”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한 유명칼럼니스트는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로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자동화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시동은 사람이 건다. “진심은 달라”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아야 할까. 이해를 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한 출판사 마케터 분이 인터뷰 날짜를 저자에게 잘못 전달해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다. ‘어휴, 초보도 아니신데 왜 이런 실수를?’ 한창 짜증이 났는데, 마케터의 확실한 사과와 빠른 대응이 화를 달아나게 했다. 그래, 이렇게 인정하고 정확히 사과하면 됐지 뭐. 끝.
마을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요즘, 확실히 시내버스의 풍경과는 다르다. 버스기사와 인사를 하는 손님들이 어찌나 많은지. 승차감은 최악인데, 마음은 참 푸근하다. 누가 내 진심 알아주지 않고, 나도 타인의 진심, 절대 모른다. 그러니 태도가 중요하다. 옆 사람의 말 한 마디로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 다 알지 않나. 중요한 건 태도다.
[추천 기사]
- 1990년대를 추억하는 책 2권
-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지
- 범인은 바로 이 맨션에 있다
- 인생도, 독서도 타이밍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
출판사 | 교유서가

엄지혜
eumji01@naver.com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김승일의 시 수업] 내가 쓴 시를 책임지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3-5219395c.jpg)
![[김승일의 시 수업] 서간체로 시 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5-2e229c91.png)
![[젊은 작가 특집] 예소연 “소설이 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e92deffa.jpg)
![[더뮤지컬] 김가람 작가, 세상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db5e43a3.jpg)



silvermoon
2015.06.15
서유당
2015.06.06
감귤
2015.06.06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