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기억의 흐름에 관한 왜곡은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적 장치이다. 그래서일까? 영화의 중반부에 이미 반전을 예측하고 말았다. 여기에 포스터는 물론 영화의 홍보를 위해 내세운 ‘반전’이라는 선언, 심지어 영화의 시작에도 큰 사건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자막도 한몫하고 말았다. 뇌리에 박힌 반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측 가능한 빈틈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니시에이션 러브>를 보는 것은 시시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결말을 보고서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반전이라 불리건 깜짝쇼라 불리건 <이니시에이션 러브>는 마지막 5분을 위해 100분을 허비하는 반전 강박 영화는 아니다. 어떤 관객에게 영화의 반전이 뻔하게 느껴졌겠지만, <이니시에이션 러브>는 그저 그런 뻔한 영화는 아니다.
80년대 복고 감성을 소환하는 영화의 장치를 위해 추억의 물건인 카세트테이프 앞면인 Side-A와 뒷면 Side_B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를 나눈다. 80년대, 잘나지 못한 외모와 수줍은 성격 때문에 모태솔로인 스즈키는 대타로 나간 단체 소개팅에서 청순한 이미지의 마유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다. 서툴지만 순수한 스즈키의 진심에 마유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하지만 스즈키가 도쿄에 발령이 나면서 둘은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두 사람의 거리처럼 마음도 멀어지는데 스즈키는 직장 동료 미야코에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마유가 임신했다 한다. 스즈키는 급기야 마유에게서 달아난다.

줄거리만으로도 이미 촌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이 영화를 제대로 본 것이다. <이니시에이션 러브>는 촌스러운 표현을 감추지 않는다. 촌스러움이 서툴지만 순수했던 마음의 한편에 자리한 추억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더 그렇다. 혹자는 이 영화를 <응답하라, 1988>의 일본판쯤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낡았지만 진실했던 순간을 회고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굳이 두 작품을 비교해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직접 꺼내어 돌려야 뒷면을 들을 수 있었던 카세트테이프, 정장을 입고 가야 했던 경양식집, 그 시절의 일본가요, 어깨 뽕이 들어간 재킷과 허리가 높은 바지, 알이 큰 안경, 오직 유선 전화기로만 연락이 가능했던 소통의 시간, 촌스럽지만 가슴 설렜던 그룹 소개팅, 볼록하게 세운 앞머리, 나이키 운동화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시절, 뚱뚱한 흑백 모니터, 오래된 자동차와 바닷가 데이트 등 영화는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친숙한 80년대의 풍경을 소환해 낸다.
<이니시에이션 러브>는 또한 전후반부의 배열을 통해 남자의 순애보와 여자의 순애보의 전형성을 보인다. 전반부는 한 남자의 진정한 순애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수난기라고 할 수 있다. 못생겼지만 순수한 모습에 끌리는 여자와 순정을 바쳤지만 버림받는 여자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통해 다시 한 번 사랑의 의미를 환기한다. 게다가 반전을 담고 있다기에 너무나 평이하고 지루할 정도로 일상적이다. 그런데 이 영화 느긋하게 즐길 수가 없다. 광고를 통해 반전이 있다고 밝힌 것도 모자라, 자막을 통해 영화의 말미에 큰 반전이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관객들을 부추긴다. 평범한 상황도 의심하게 되고, 못생긴 스즈키를 좋아하는 마유의 속내도 의심스럽다. 별 의미 없이 등장하는 조연들의 행동에도 촉각을 세우게 되고 소소한 소품들도 반전을 위한 장치가 아닐까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반전을 직접 찾고 자아내고 만들어가면서 관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긴장감이야말로 <이니시에이션 러브>라는 평범한 영화가 이뤄낸 가장 큰 반전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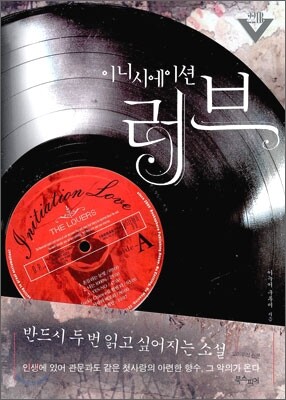 |
 |
이 영화의 원작인 이누이 구루미의 동명소설 <이니시에이션 러브>는 책의 소제목을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사랑 노래의 제목으로 만들어, 소소한 복고의 향취를 치밀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서툴지만 풋풋한 사랑 이야기는 가슴을 설레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반전을 이뤄내는 뒤틀린 서사가 주는 충격과 재미는 오히려 영화보다는 책에서 더 강렬하게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겐 <20세기 소년> 시리즈로 잘 알려진 츠츠미 유키히코 감독은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구현해 내지만, 원작의 치밀한 묘사보다는 만남의 설렘과 일상의 지루함, 달아나고 싶은 욕망 속에 대치 가능한 새로운 사랑 등 연애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할 법한 연애의 시작과 끝을 들여다보는 것에 집중한다. ‘통과의례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영화 속 인물에게도 우리에게도 첫사랑은 늘 통과의례 같은 것이라는 감수성은 <건축학개론>에서 우리가 떠올렸던 그 감수성과 맞닿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니시에이션 러브>가 선물하는 것은 반전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고, 첫사랑의 감정을 현재로 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첫사랑의 맛이 어땠는지 반추하게 한다. 달고 시고 때론 쓴 첫사랑의 맛은 이제 더 이상 다시 찾게 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불량식품처럼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그 시절 우리가 기억하는 첫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절 내가 느꼈던 감정일지도 모른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사랑니>

2005년 작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는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 달라는 사람에게 어김없이 추천하는 영화다. 추천받고 영화를 본 사람들의 99퍼센트에게 욕을 들어먹지만 여전히 추천 1순위가 이 영화다.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 관객이 품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면서 반전 아닌 반전을 만들어낸다. ‘타이밍하고는…….’이라는 허를 찌르는 대사처럼 영화는 줄곧 우리가 믿고 있는 시간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다. 당연히 과거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현재이고,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거일 수도 있는 시간이 오간다. 독창적이지만 친절하지 않았던 영화는 툭툭 시와 같은 대사를 던지고, 단절되고 왜곡된 시간은 다시 한 번 통과의례같이 아픈 첫사랑의 기억을 환기한다.
[추천기사]
- ‘권석천의 무간도’를 시작하며
- 존중받아야 할 삶, 기억해야 할 역사 : <귀향>
- 현실주의자의 3원칙 <검사외전>
- <스포트라이트>가 벗긴 양심의 가면
- 영화 <클래식>, 남편과 보고 싶지 않은 이유

최재훈
늘 여행이 끝난 후 길이 시작되는 것 같다. 새롭게 시작된 길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느라, 아주 멀리 돌아왔고 그 여행의 끝에선 또 다른 길을 발견한다. 그래서 영화, 음악, 공연, 문화예술계를 얼쩡거리는 자칭 culture bohemian.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후 씨네서울 기자,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활동 중이다.










![[미술 전시] 2025년 상반기 기대되는 전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31-26f67f3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