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라 믈리아 셰리프Vera Mlia Sheriff, <여자의 입>
파리에서 어느 날 감자탕을 먹으러 가자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파리에 감자탕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을 줄이야. 급한 호기심에 따라나섰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감자탕을 팔았다. 소주는 그냥 준다고 했다. 감자탕 맛이 원래 어떤 맛인지도 기억나지 않던 상태라 무조건 맛있었다.
음식 솜씨가 있고 바지런한 사람들은 직접 뼈를 사다가 감자탕을 만들기도 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가면 1유로에 돼지 뼈를 잔뜩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뼈로 국물을 우려내는 음식이 한국처럼 많지 않아서 프랑스에서 고기 뼈는 대부분 버린다. 나는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감자탕을 그리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천 공항에 내리면 얼큰한 고깃국물이 먹고 싶어져서 가족들과 감자탕을 먹으러 직행한 적이 여러 번이고 자연스럽게 가족 상봉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나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감자탕이 ‘개념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감자탕에 대한 상념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감자탕은 어떤 ‘개념’을 풀어서 만든 음식이길래. “나는 병천이 형한테 그동안 술 얻어먹은 것 염치도 없고 하니 / 그런 날 저녁에는 소주에다 감자탕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한다”던 시인에게 감자탕은 최소한의 염치를 표현하는 음식이다.(안도현, ‘나의 경제’ 중) 이런 염치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격이 ‘서민적’인가. 가격을 생각하면 아마 파리에서 1유로에 뼈를 사서 직접 만든 감자탕이 가장 ‘개념’ 가득한 음식일 텐데. 아, 그런데 파리에 있으면 ‘유학녀’라서 개념녀의 자격을 상실하겠구나.
대체로 전설처럼 퍼지고 있는 ‘개념녀 음식’이란 ‘서구’의 탈을 쓰지 않은 음식이다. ‘차도남’이 등장하는 한 로맨스 소설에서는 ‘의외의 여성’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감자탕 잘 먹는 여자를 내세운다. 남자는 여자에게 감자탕을 사주며 순댓국은 먹는지 묻고, 족발과 보쌈, 막창과 곱창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여자는 이 모든 음식을 좋아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닭발과 돼지 껍데기까지 읊어댄다. 남자는 이 여자에게 묘한 흥분을 느낀다.
이러한 흥분은 종종 파스타를 말아 올리는 여자에 대한 혐오와 짝패를 이룬다. 여성에 대한 혐오는 괴상한 애국주의로 둔갑한다. 속박당하는 ‘종족’치고 마음대로 먹는 존재는 없다. 음식이란 개인에게 침투하는 가장 평범한 외부 문화다. 다른 문화가 여성의 몸에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필코 비싸지도 않은 파스타를 감자탕 혹은 순댓국의 대립항으로 만든다.
나라 밖을 돌아다니는 여자나 나라 안에서 ‘외부’ 음식을 즐기는 여자는 오염된 여자다. 여기서 ‘외부’ 문화에 대한 기준은 물론 GDP 차별주의에 입각한다. 파스타 먹으면 김치녀가 되지만 쌀국수를 먹는다고 김치녀가 되진 않는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국을 끓이는 기본적인 관문을 넘어야 ‘한국 사람 다 되었다’고 인정한다. 이 여성들은 자국의 남성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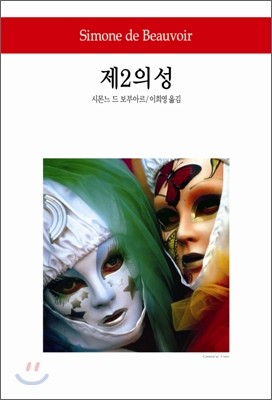 |
 |
김치녀의 정의는 ‘권리는 챙기려고 하면서 의무는 안 한다’로 요약되었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신앙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의식이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여성의 ‘특권 챙기기’가 되고, 성 역할 거부가 여성의 ‘의무’ 불이행이 된다. “여자는 권리의 매개자에 불과하며 그 보유자는 아니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111쪽)라는 문장을 ‘김치녀’의 정의에서 상기하게 될 줄이야.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가 ‘있기’를 원하지만 여자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한때는 여자’를’ 끼고 남자가 커피를 마셨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제 손으로 커피를 제 입에 넣고 있다. 김치나 된장처럼 어느 집 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 ‘김치녀’나 ‘된장녀’는 ‘지가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권리를 말한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 문제였듯이, 음식이 들어오고 말이 나가는 입은 욕망의 회로이기 때문에 피지배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통제받는 신체 기관이다. ‘앵두 같은 입술’이어야 할 여자들의 그 입,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인 그 입, 그 주둥이가 다른 세계를 여행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말을 뱉어낸다고 생각하기에 온 사방에서 이 입을 증오한다. 입술은 ‘훔쳐야’하는 장식물이지만 입은 막아야 한다.
여성은 사람이기 보다는 벌레로 변태하기가 더 쉽다. 어차피 뭘 해도 발효식품으로 조롱받다가 궁극에는 벌레가 된다. 메갈충이나 낙태충, 맘충처럼. 프랑스의 소설가 앙리 드 몽테를랑은 1922년 작 『꿈』에서 “애인의 팔에 연체동물처럼 매달려 산책하는 여자들은 위장한 커다란 괄태충(민달팽이)과 같다”고 묘사했다. 여성의 ‘충’ 되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누가 김치녀이고 된장녀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원래’ 유대인은 탐욕스럽듯이 ‘원래’ 여자들이란 허영덩어리다. 해석의 대상은 김치녀가 아니다. 누가 유대인을 탐욕스럽다고 부르며, 누가 여성을 김치녀라고 호명하는가가 문제다.
말하는 입, 먹는 입, 섹스하는 입,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성의 입은 주로 한 가지 영역에서 ‘수동적 쓸모’를 허락받는다. 섹스하는 입. 밥은 동물적 힘이며 말은 정치적, 지적 자유다. 여성의 말과 여성의 밥이 억압당하는 방식은 같은 맥락을 가진다. 힘과 자유의 박탈이다. 여성은 먹는 입에도 말하는 입에도 속하지 못한 채 만드는 손으로 얼굴 없이 우두커니 있다. 김치녀라는 조롱으로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커피를 경멸하고, 입에 들어가는 파스타를 싫어하며, 프랜차이즈 샐러드 바에서 이것저것 집어먹는 그 입들을 혐오하지만, 그 수많은 ‘김치녀’들이 김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여성은 일단 먹는 입의 권리와 말하는 입의 권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되기’의 정치 활동이다.
발효식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만, 유난히 발효식품을 한국 음식의 특징으로 꼽더니 어느덧 여성들도 발효식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김치/녀와 된장/녀가 많으면 사회가 건강해지겠네. 먹으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먹는 입들의 발광이 이 사회의 면역체다.
한 24시간 뼈다귀 감자탕 식당 앞을 지나다 유리문에 붙은 ‘아줌마 구함’을 보았다. 근무시간은 12시간, 한 달에 두 번 쉰다. 월 180만 원. 시간당 5,357원인 셈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제2의 성
출판사 | 동서문화사

이라영(예술사회학 연구자)
프랑스에서 예술사회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며 예술과 정치에 대한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여자 사람, 여자』(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가 있다.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더뮤지컬] 강렬한 총성·나지막한 자장가…이혜영의 <헤다 가블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30-85a48382.jpg)
![[더뮤지컬] <라흐 헤스트> 홍지희, 마음이 전하는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7-fec6e03d.jpg)
![[더뮤지컬] <홍련> 배시현·박신애, 객석에 가닿은 목소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6-1067d3e5.jpg)
![[더뮤지컬] 다양화되고 정교해진 여성 서사 창작뮤지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4b956a0c.jpg)



Earthbound
2017.05.18
Earthbound
2017.05.18
Earthbound
2017.05.18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