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 작품의 완성도 혹은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과는 무관하게 특정 장면이 엉뚱하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그 순간은 대개 영화의 큰 줄기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장면이 관람자의 사적인 경험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것 같다. 영화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은 채, 한 장면에서 시작된 단상을 자유롭게 뻗어가 보려고 한다. |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주는 안정감은 전적으로 그곳을 둘러싼 나무들의 품위에서 온다고 느껴왔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마포구 아파트의 나이는 올해로 스물다섯 살. 가끔 방문할 때마다 복도 공지란에는 엘리베이터, 난방, 수도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늙어가는 것은 결국 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종종 침울해지지만, 아파트에 쌓인 시간의 더께가 주는 평온함도 있다. 단지 내에 늘어선 나무들 덕분이다. 아파트의 세월을 흡수할수록 나무들은 쇠약해지기는커녕, 매해 더 강한 생명력으로 계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품고 표출하는 것 같다. 신축 아파트의 깔끔하고 세련된 조경과는 다른 차원의 위세와 아름다움이 시간을 버티며 아파트 곁을 지켜온 나무들에는 존재한다.
두 해 전, 그 나무들이 가지치기 명목으로 볼품없이 무자비하게 잘렸을 때, 이 아파트가 나무들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 풍경의 처참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파트는 금세 볼품없어졌다. 몇 달이 지나 나무들은 다시 싹을 틔우고 놀라운 속도로 잎을 드리우기 시작했지만, 그 무렵부터였을까. 그 나무들 앞에 서면 예전 같은 찬탄 대신, 이상한 서글픔 같은 감정이 먼저 든다.
2020년 봄, 청주시 봉명동 주공 아파트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1983년에 지어진 이 단층의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어울려 살던 주민들은 하나둘 이사를 나가기 시작한다.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니 세간살이가 빠져나간 텅 빈 집들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만 초라하게 새겨져 있다. 아이들로 시끌벅적하던 동네 가게는 문을 닫는다. 아파트 현관문에는 “위험 건축물”이라는 위협적인 스티커가 붙는다. <봉명주공>은 한 마을의 역사가 ‘철거’되기 직전의 시간을 찍는다. 이 영화의 특별함은 떠나는 사람들, 사라지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역사의 일부이자 증인인 아파트 주변 나무들을 응시하는 카메라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어김없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은 이곳이 이내 사라질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의 몫을 살아내는 현재의 장소임을 홀로 외롭고 강인하게 증명해낸다.

그 기록에 각인된 두 개의 사운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전동 톱이 돌아가는 소리다. 이미 영화의 도입부에서 두 소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가차 없이 제시된다. 새소리가 생기롭게 울려 퍼지던 커다란 버드나무가 다음 장면에서 시끄러운 기계음과 함께 땅으로 풀썩 쓰러진다. 저토록 울창한 한 세계의 몸체가 너무도 신속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리는 광경은 극영화 속 피가 난무한 살해 장면보다 무섭다. <봉명주공>은 사라지는 것들을 아련하게 기억하는 영화가 아니라, 조용하고 침착한 말투와 눈으로 죽음을 꼿꼿이 바라보는 영화다. 그 시선에 재개발에 대한 어떤 논평보다 날 선 힘이 담긴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들. 이사센터 트럭이 꽃이 활짝 핀 나뭇가지에 걸려 집 앞까지 당도하지 못하자 떠나는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는 그 가지는 바로 베인다. 그 나무는 얼마 전까지도 주민들에게 봄을 알리는 기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행동을 망설이거나 막지 않는다. 영화는 너무도 기품있던 꽃나무들이 전동 톱질에 철퍼덕 무력하게 땅으로 꺼지는 모습을 멀리서, 혹은 근접해서 바라보고 그 순간들을 이어붙인다. 폐허의 장소를 끝까지 빛내던 나무들이 시체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진다.
나무에서 놀던 새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나무 밑을 거닐던 고양이들은 어디로 갈까. 뿌리가 보존된 상태로 땅에서 뽑혀 기중기에 들려 공중에 매달린 나무들, 트럭에 실린 나무들은 어디로 갈까. 자기 장소를 빼앗긴 그 나무들을 보며 살아남아 운 좋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영화 속 한 노인이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고이고이 키운 식물들을 감독에게 자랑하는 대목이 있다. 자기 집에서만 독특한 꽃을 피우는 식물 얘기로 그의 얼굴이 환하다. 이사 갈 때도 식물들을 가져갈 거냐는 감독의 물음에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지만, 영화 끝에 우리는 딸 집으로 이주한 노인이 그 식물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희귀한 꽃이 핀다던 그 식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봉명주공’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세상에 들어설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영화를 통해 그곳이 잘리고 버려진 나무들의 무덤이라는 사실만은 알게 되었다. <봉명주공>은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를 충만하고 충실히 살아낸 나무들의 역사에 바치는 영화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남다은(영화평론가, 매거진 필로 편집장)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난 길을 잃었어요” - <스펜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5/8/e/358e116fcc234018c69b2999fa6b0fd7.jpg)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생을 향한 환희의 순간 - <나의 집은 어디인가>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d/f/1/edf11952407c99239e13d0de7a777a1f.jpg)
![[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혈연 바깥으로 나가는 여성들 - <패러렐 마더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9/e/3/a9e3df99f0b752e665833c70f5bbb6fc.jpg)

![[김이삭 칼럼] 숏드로 보는 중국](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4-0942d3d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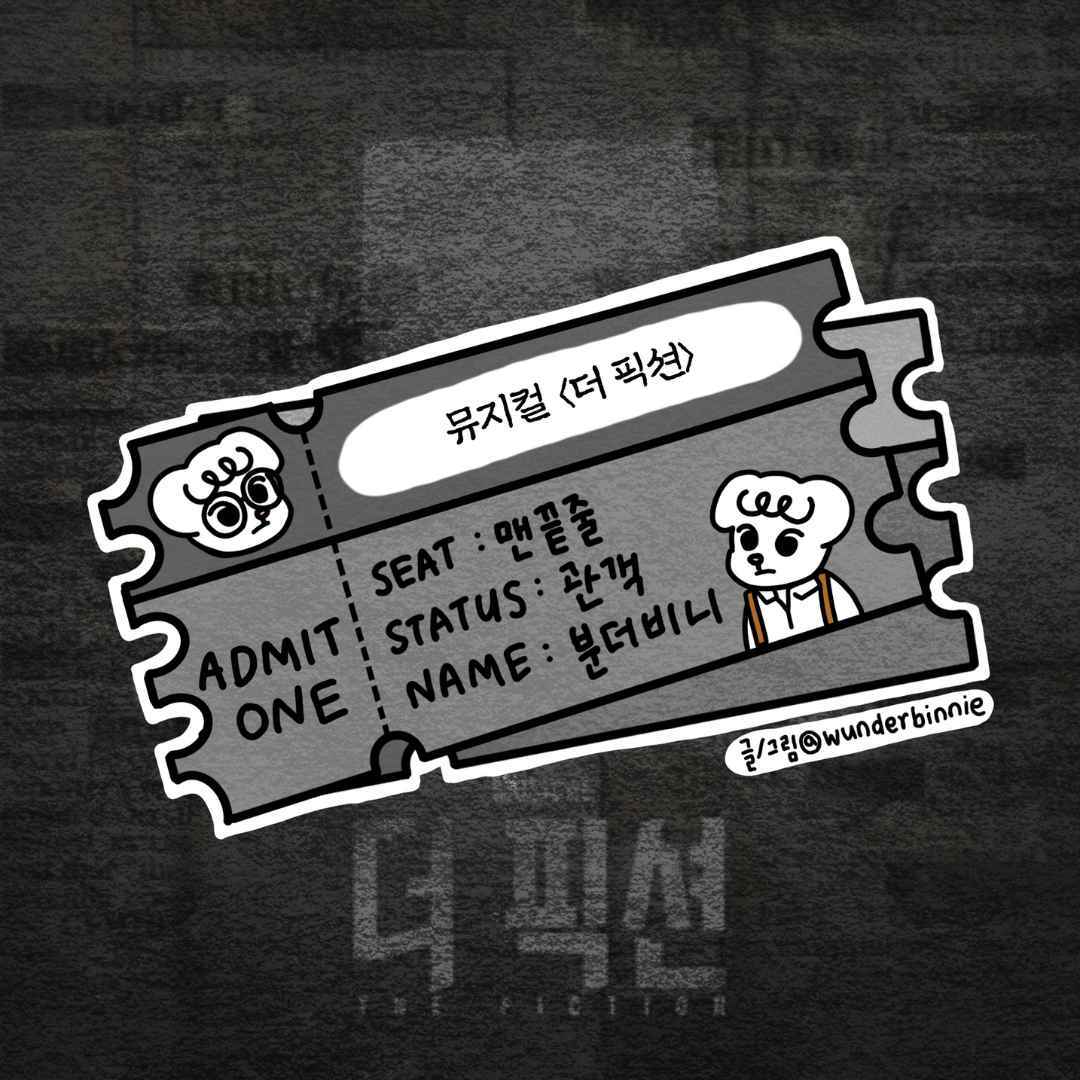
![[더뮤지컬] "할머니의 삶에서 소녀가 보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8-9cc193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