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이링 저/문현선 역 | 민음사
책을 덮은 뒤 생각했다. 여름에 읽어서 다행이다, 겨울에 읽었으면 너무 쓸쓸했을 텐데. 장 아이링의 소설은 피부에 먼저 닿고 그 후 심장에 닿는다. 아마 사랑과 고독에 관한 명징하고도 저릿한 묘사 때문이 아닐까. 얇은 비단이 살갗을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부드러운 감촉이 아닌 –묘하게도- 서늘한 통증만 남는다. 그 멍이 다 가실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린 아픈 작품이었다.

B급 영화
B급 영화를 좋아한다. 나의 삐딱한 취향을 제대로 건드린달까. 진지함을 비껴가는 과장된 연출, 완성도보다는 열정을 앞세우는 뜨거움도 좋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패기 때문인지 여름에는 B급 영화가 더 끌린다. -이게 이열치열 아니겠는가- 존 카펜터의 <보디 백>, 주성치의 <희극지왕>, 저메인 클레먼트의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는 꼭 보셨으면.
소복이 글그림 | 사계절
어느 서점에서 북토크를 하던 날, 옛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흘렸다. 나도 독자들도 센티멘털해 있는데, 서점 한 편에 진열되어 있던 책 때문에 웃음이 터졌다. ‘왜 우니?’ 북토크가 끝나고 한 독자분께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고, 집으로 돌아와 읽었다. 소복이 작가의 책은 다정하고, 그 다정함이 참 고맙다. 그 밤의 눈물이 주책맞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가셨다. ‘사람과 고양이와 개미가 위로해 줘서 울어’ 내 슬픔을 닦아준 건 이 책일 수도 있지만, 그 밤의 독자분들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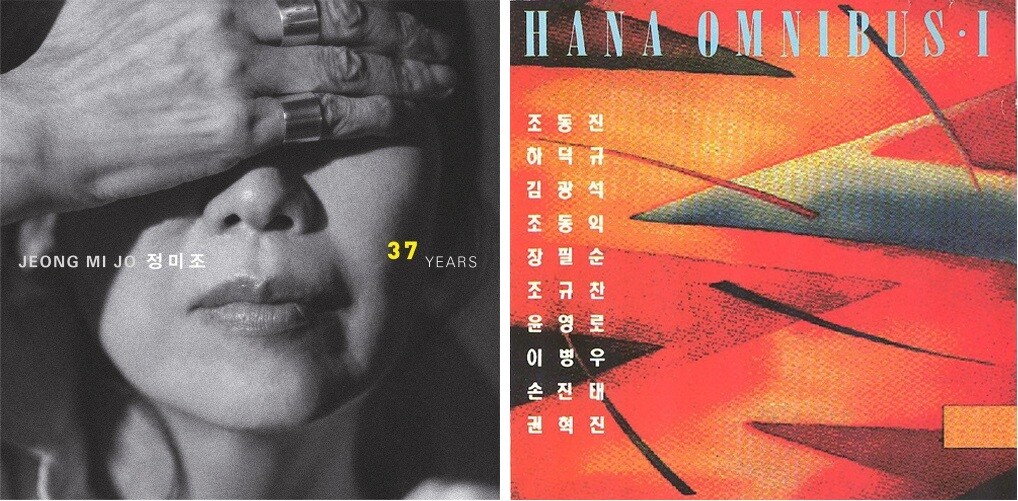
보사노바
여름만큼 보사노바가 어울리는 계절이 있을까. 일어나서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판을 튼다. 아침이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다. 한국 가요 중에도 보사노바풍의 음악이 많다. 정미조의 <7번 국도>나 손진태의 <이 계절이 가기 전에>를 듣다 보면 오후가 별 탈 없이 지나간다. 밤이 되면 밥 브룩마이어가 보사노바로 편곡한 곡들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음악만으로 여름 한나절이 풍요로워진다.
후니모리 데루노부, 미나미 신보 저/아카세가와 겐페이 편/서하나 역 | 안그라픽스
이런 더위에는 바깥을 누비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 산책자들의 탐방기를 읽는 게 더 좋다. 그들과 동행하는 기분으로. 단순히 산책하는 기분만 느끼게 해주는 책은 결코 아니고, 계단 타일 얘기를 하다 외계인으로 느닷없이 신학개론으로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관찰자들의 대담이다. 그 때문에 누워서 읽다 몇 번이나 일어섰다. ‘아니, 갑자기?’ 나 정도면 섬세한 관찰자라고 여겼는데 이들에 비하면 나는 그저 ‘흉내만 내는 놈’이 아닐까. 맨홀 하나에서도 뜻을 찾는 이들의 관찰기를 읽다 보면 나가서 뭐라도 발견하고 싶다는 기분 좋은 조바심이 든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성해나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는 소설집 『빛을 걷으면 빛』, 『혼모노』, 경장편소설 『두고 온 여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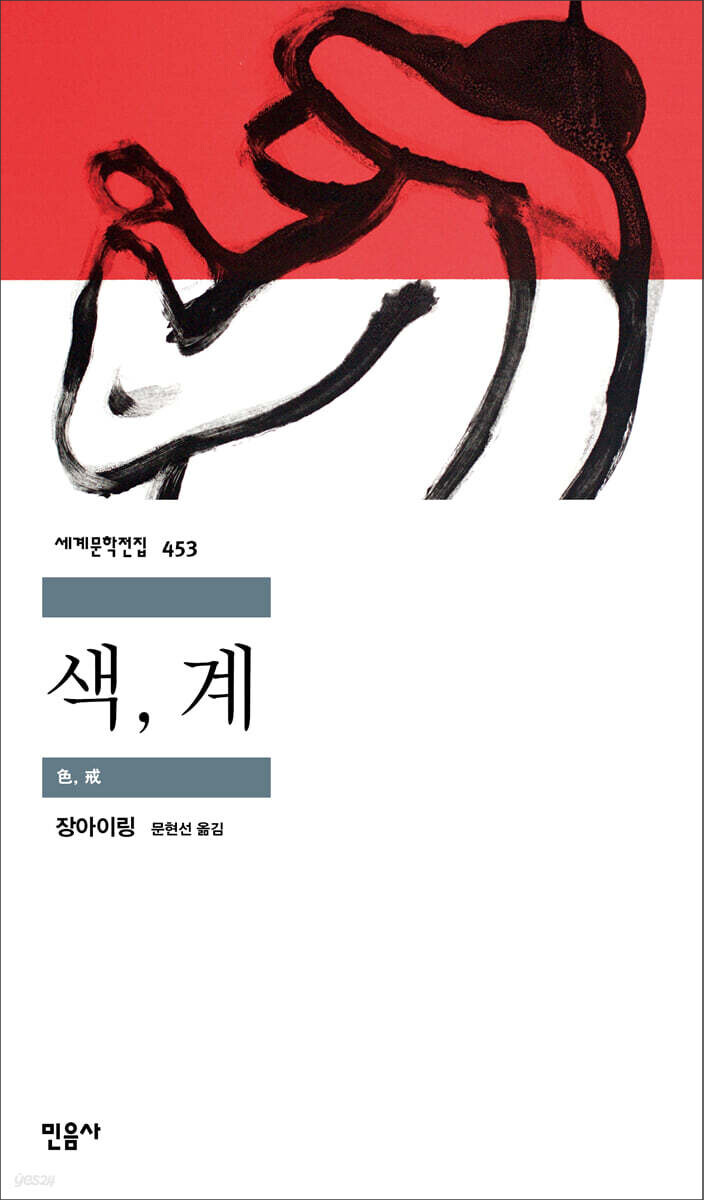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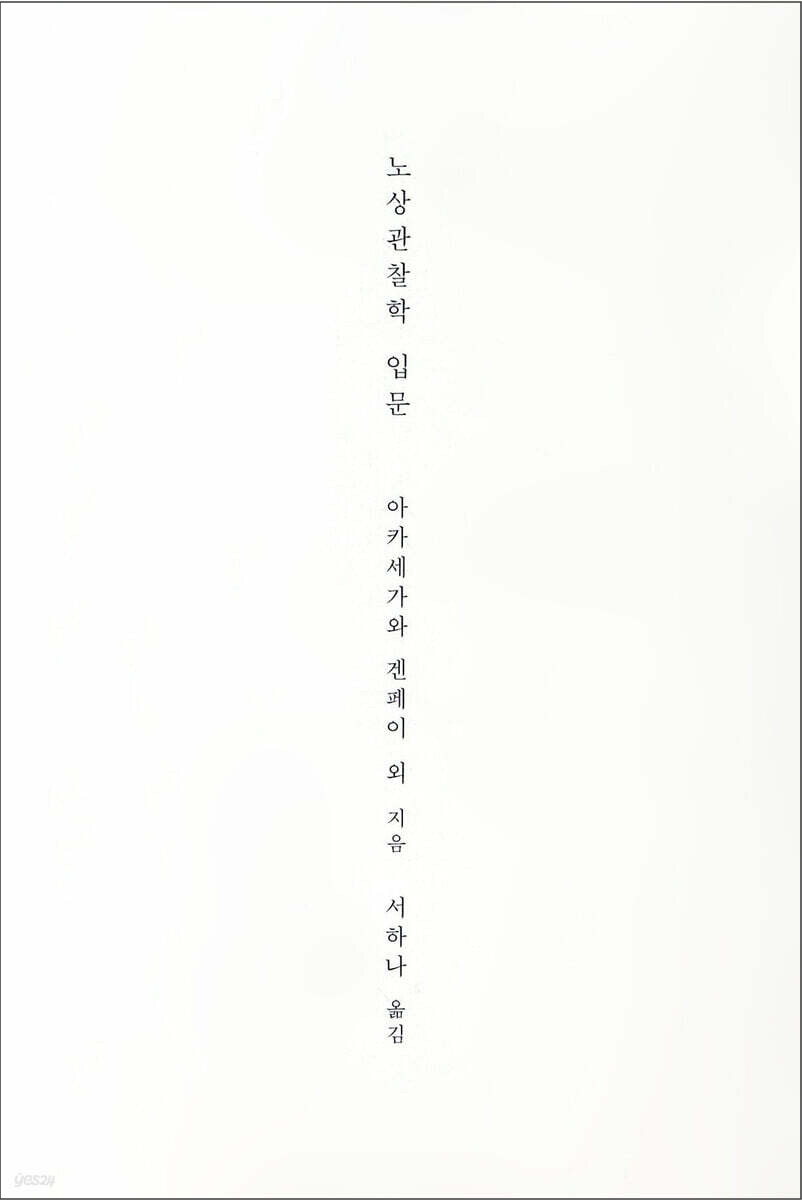

![[더뮤지컬] <인화> 외면과 배제가 아닌 것](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f2b5a203.jpg)

![[미술 전시] 동시대 미술의 반짝이는 ‘현재성’](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6-4137b8d4.jpg)
![[둘이서] 서윤후X최다정 – 내 방 창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7f862cf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