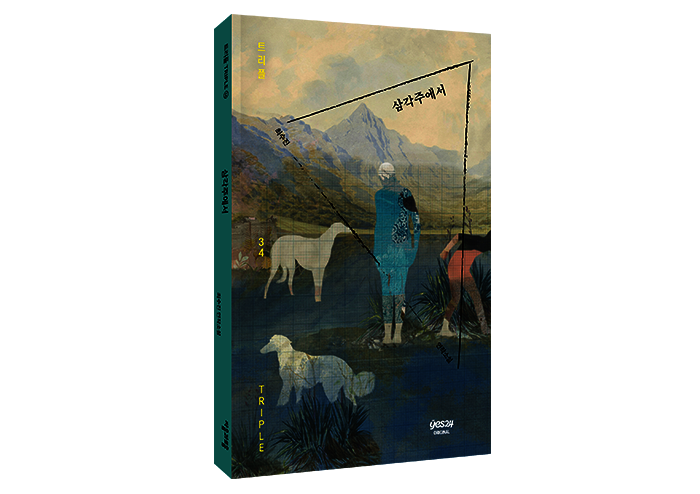『삼각주에서』는 재난과 상실의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여전히 감각해야 할 인간적 자리를 묻는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는 이러한 물음 속에서 애도의 윤리를, 부재 이후에도 계속되는 존재의 책임을 천착한다. 전작 『점거당한 집』으로 제4회 박지리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는 이번 신작을 통해 한층 깊어진 사유의 지평을 펼쳐 보이는데, 상실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감정의 파문 속에서,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래된 윤리를 복원한다. 그리고 그 복원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언어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삼각주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가 얽혀 '죽음 이후의 삶'을 탐색하는 연작소설로 보입니다. 이 연작소설이 작가님 마음속에서 태동하게 된 시점이 있었을까요?
네, 돌이킬 수 없이 저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변화한 뒤의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그럼에도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살았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경험도 변화도 돌이킬 수 없었고, 저는 그것을 글로 써야 했습니다.
소설에서 '개'와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생명'과 '돌봄' '책임'의 상징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은 작품 속에서 어떠한 '감정의 매개체' 혹은 '인간성의 거울'로 놓이게 된 것일까요?
개, 고양이 외에도 개울에서 주운 거북, 냉장고에서 싹 틔운 양파 등 다양한 비인간 생명체가 나오는데요. 흔하고 낮은 것이 인간과 매개될 때 드는 감정이 각별하다 느꼈습니다. 예컨대 저는 실제 제주도 여행 중 길에서 큰 유기견에게 쫓겼는데요. 녀석의 다정한 덤벼듦에 당황하며 숙소로 달려들어와 보니, 숙소 1층에 엄청나게 꼭 닮은 개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의 묘한 놀라움이 마음에 작은 매듭으로 묶여 풀리지 않았고 그 꼬임을 더듬어보고 싶게 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회피인가'를 끊임없이 천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애도의 윤리'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애도에 윤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제 일기를 보면 저는 차츰 회복될 미래의 제게 마구 화를 냅니다. 나아져서 되돌아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안티고네는 살해된 오빠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 애도하고자 홀로 법과 제도에 맞서고,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갇힌 동굴에 머리를 부딪쳐 목숨을 잃습니다. 애도는 경계에 부딪치면서 멀리 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애도는 되돌아오지 않고 멀리 갑니다.
『삼각주에서』에는 '사촌 언니'와 '사촌 동생' '친구' 등 여성들 사이의 '공명'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간의 연대' 혹은 '전승'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연대에 앞서 먼저 여성들 간 차이를 보게 됩니다. 제 소설 속 중산층 집안 여학생과 지방 출신 이주민 2세 여성 사이 우정에는 갖가지 요인이 얽혀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는 꿈을 꾸려면, 먼저 우리가 다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성은 지금껏 배제되어 왔기에 역설적으로 앞날에 필요한 강함을 선취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힘에 걸맞는 책임도 있어야겠지요.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죽음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작가님에게 이 작품은 어떤 '삶의 방식'을 되묻는 기록이었을까요?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더욱 잘 사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작 『점거당한 집』에서 저는 “제자리걸음일지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다행인 걸까?”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자문했습니다. 『삼각주에서』 속 인물들은 모두 대부분 제 발로 땅을 딛거나 휠체어 바퀴를 직접 밀며 여기저기 갑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채로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삼각주에서』는 죽은 이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살아 있는 자의 윤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팬데믹과 재난, 사회적 죽음을 목격한 지금의 독자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위로 혹은 질문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이세요. 운동이 exrcise든 movement든 상관없습니다. 막다른길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혁명적 운동입니다.
『삼각주에서』는 제목처럼 세 갈래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삼각주는 물이 머무는 곳이자, 다시 흘러나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서사적 구조와 미학적 형식(삼각주라는 이미지)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경계짓기와 흑백논리가 워낙 싫어 세 겹의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제 3의 길, 대안, 낯선 가능성. 다만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 드러내듯 제 3의 길이 마냥 도피처는 아니어서 경계를 넘어서며 남은 고통은 떨쳐지지 않습니다. 강 하류의, 바다로 흘러들기 전 고인 삼각주는 제게 그 고통과 상흔을 되짚는 서사적 장소였습니다. 별개로 『점거당한 집』에 이어 또 세 갈래 이야기를 쓰고 나니 이 구조에는 조금 질려버렸어요(웃음). 성격이 변덕스럽거든요. 다음 소설은 네 갈래 이야기로, 그러니까 제 4의 길을 탐색하면서 쓰고 싶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