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의 팝 앨범
늘 그래왔듯이 팝 음악은 ‘레전드 아티스트의 건재’와 ‘천재성을 지닌 신성의 출현’이라는 두 바퀴로 궤적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을 낼 수 없는 명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륜과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은 수작들이 골고루 나와 국내 팝 팬들에게도 다채롭게 들을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해주었다.
2012.12.26
늘 그래왔듯이 팝 음악은 ‘레전드 아티스트의 건재’와 ‘천재성을 지닌 신성의 출현’이라는 두 바퀴로 궤적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을 낼 수 없는 명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륜과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은 수작들이 골고루 나와 국내 팝 팬들에게도 다채롭게 들을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해주었다. 올해는 현재 이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음악평론가의 의견을 취합해 의미를 더했다. 순서는 알파벳순으로 순위와는 무관하다.
밥 딜런(Bob Dylan) < Tempest >
밥 딜런은 자신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이다. 로큰롤 이전의 블루스, 컨트리, 포크, 이른바 '루츠'라고 불리는 테마를 그 시대의 사운드, 오래된 주법, 낭만을 가득 담아 시간을 거스른다. 가장 시대착오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시의적절한 회귀.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 Wrecking ball >
월가는 99%에 점령당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이제 참여의 움직임은 소멸하는 듯 보인다. 평생을 노동자 계급 편에서 노래하던 로커는 이런 현재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얼핏 생각하면 그저 허무주의에 빠져있을 듯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의 보스가 그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이다. < Wrecking Ball >은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과 희망을 찾는 이상주의적 시선이 공존하는 앨범이다. 올해, 미국발(發) 힐링의 소리라면 단연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다.
도널드 페이건(Donald Fagen) < Sunken Condos >
듣는 이들을 설득하고자 할 때 가장 보편적인 선택은 ‘압도적인 장관’을 그려내는 것이다. 간단하게, 멜로디와 사운드 모두에서 현격한 낙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장엄한 발성이나 도취적인 호흡 없이도 도널드 페이건은 거장의 풍모를 뽐내왔다. < Sunken Condos >에서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 스틸리 댄(Steely Dan) 시절부터 재즈와 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고수해온 도널드 페이건은 < Sunken Condos >에서도 타고나기를 냉소주의자여야만 완성 가능한 음악을 창조하고 노래한다. 자기 스타일에 대한 고집으로 한껏 충전된 이 음반은 이를 통해 올해의 넘버원 후보 중 하나로 스스로를 추켜세운다. 전 파트에 걸쳐 완벽에 가까운 기술적 완성도를 뽐내면서도 시종일관 여유롭고 능란한 태도를 유지할 줄 아는 것. < Sunken Condos >는 오직 도널드 페이건만이 해낼 수 있는, ‘경험의 앨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엘 바너(Elle Varner) < Perfectly Imperfect >
신인 R&B 뮤지션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 그러나 이 흐름에 속하는 인물들 다수와 달리 엘 바너는 스타일보다는 가창력으로 더 돋보였다. 여러 장르를 마구 합치는 작금의 퓨전에 동참하지 않고 보컬을 드러낼 수 있는 음악을 선택했다. 메이시 그레이(Macy Gray)의 탁함과 메리 제이 블라이즈(Mary J. Blige)의 무게감을 겸비한 중에 시원스럽기까지 한 그녀의 싱잉은 앨범 전반을 장악한다. 대단한 보컬리스트의 등장이다.
프랭크 오션(Frank Ocean) < Channel Orange >
프랭크 오션은 흔히 생각하는 알앤비 싱어의 규범을 벗어난다. 물론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의 예민한 감성은 부재에 기인하는 멜랑콜리의 정서에 가깝다. 짧은 곡 안에서 주제를 풀어나가는 감독자의 역할은 경이롭다. 현실 속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공상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기묘한 오렌지색 세계를 구축한다. 소울과 펑크(Funk)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해를 현대적 사운드로 재구성하는 능력은 화룡점정(?龍點睛)이다. 데뷔앨범으로 모든 능력이 소진되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될 정도다. 흑인 솔로가수의 앨범이 이처럼 올해의 앨범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기는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다.
고티에(Gotye) < Making Mirrors >
2012년을 재패한 노래는 2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24개국에서 정상에 오른 고티에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다. 브라질의 재즈 기타리스트 루이즈 본파의 「Seville」을 샘플링한 「Somebody that I used to know」의 성공은 3집 가수 고티에를 싸이처럼 신인가수로 만들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단상을 담은 < Making Mirrors >는 전자음으로 단절된 우리 삶을 고전적인 작법과 세상에서 고립된 듯 쓸쓸한 음색으로 해석하고 풀어낸다. 2010년대 음반이지만 ‘Oldies but goodies’라는 격언에도 들어맞는 < Making Mirrors >는 사실은 있지만 진실이 없는 세상의 불편함을 편하게 고한다.
존 메이어(John Mayer) < Born And Raised >
존 메이어는 ‘제55회 그래미 어워드’에 초대되지 않았다. 앨범이 발매될 때마다 노미네이션됬었던 그이기에 ‘후보 제명’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 Born And Raised >는 수상경력의 이력을 쌓기보다는 ‘뮤지션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부분이 많다. 그간의 작품들이 직관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른바 ‘청각 자극의 제스처’였다면,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스스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내비친다. 음악 활동에 대한 자기 노선을 명확히 하려는 ‘원숙의 미학’ 또한 앨범 깊숙이 내재한다. 또 누가 아는가. 그가 먼 훗날 밥 딜런이나, 에릭 클랩튼 혹은 폴 사이먼 같은 이름들과 함께 거론되는 마에스트로로 남을지. 존 메이어가 행한 ‘내면의 대화’는 그 운명을 조정할 것이다. ‘나고 자람’이라는 음악 인생의 길, 여전히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 < Born To Die >
한 해를 통틀어 이보다 섹시한 울림은 없었다. 희열을 슬픔으로, 빛을 어둠으로, 허구를 진실로 풀어내는 목소리는 습기 차 있으나 싱그럽다. 코끝을 찌르는 개성과 허무하리만치 아름다운 외모에 소외감을 느끼는 머릿수가 늘수록 그녀를 둘러싼 벽은 얇아졌고 서 있는 단상은 높아져 갔다. 데뷔 앨범 단 한 장으로 이렇게나 스스로를 올려놓은 괴짜다. 덕분에 아델의 빈자리에 힘겨워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다. 과대평가인가 재능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연 필요한가.
나스(Nas) < Life Is Good >
연륜을 쌓아가는 래퍼가 밟아가야 할 궤적을 몸소 보여줬다. 치기어린 무용담을 늘어놓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멘토로서의 제언을 던진다. 거시적으로는 경제 양극화된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춘기로 들어선 딸을 우려스럽게 보는 보통 아빠의 시선도 담겨 있다. 나이를 먹어도 꾸밈없이 ‘리얼’함을 지키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중구난방식이 아니라 살람 레미(Salaam Remi)와 노 아이디(No I.D)에게 전권을 위임한 프로듀싱 전략 역시 비트 선정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퇴물과 고스트라이터 논란을 잠재우니 힙합 팬들은 대부(Don)의 면류관을 힘써 바쳐 올렸다.
스크립트(The Script) <#3>
비록 창의성의 충격에 있어서 「The man that can't be moved」, 「Breakeven」, 「Nothing」의 앞선 두 앨범에 못 미친다고 해도 이들의 진화는 가속페달을 밟는다. 진전된 것은 힙합 업 비트에 포커스를 두고 록이 청춘 대중과의 소통에 있다는 기본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청춘들은 모처럼 「Hall of fame」, 「Good ol' days」로 희망의 대본을 읽었다.
아일랜드 고유의 켈틱 정서 때문일까. 누구에게도 잘 들리는 멜로디 생산력은 당대 록밴드 중 최강이다. 막장 분노와 폭발보다는 참을 줄 안다. 어느덧 변칙과 재미라는 시대의 키워드에 밀려 폐기처분된 ‘충실’이야말로 음악가의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안다. 충분히 세련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박함이 있다. 이 그룹의 특수 DNA는 세련과 소박의 대칭이다.
선정인(가나다 순, 18명) : 김근호, 김반야, 배순탁, 성우진, 소승근, 신현태, 여인협, 위수지, 윤은지, 이대화, 이수호, 이종민, 임진모, 조아름, 한동윤, 허보영, 홍혁의, 황선업.
밥 딜런(Bob Dylan) < Tempe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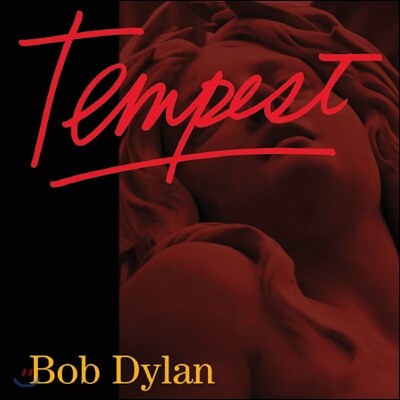 |
 |
글/ 이대화 (dae-hwa82@hanmail.net)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 Wrecking ball >
 |
 |
글/ 여인협(lunarianih@naver.com)
도널드 페이건(Donald Fagen) < Sunken Condos >
 |
 |
글/ 배순탁 (greattak@hanmail.net)
엘 바너(Elle Varner) < Perfectly Imperfe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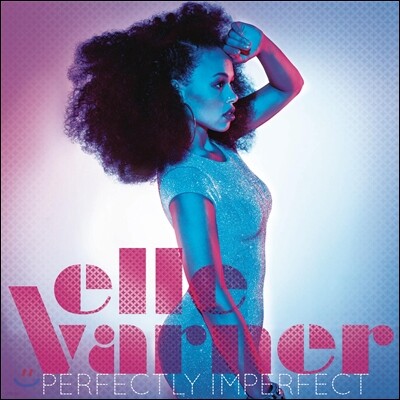 |
 |
글/ 한동윤(bionicsoul@naver.com)
프랭크 오션(Frank Ocean) < Channel Oran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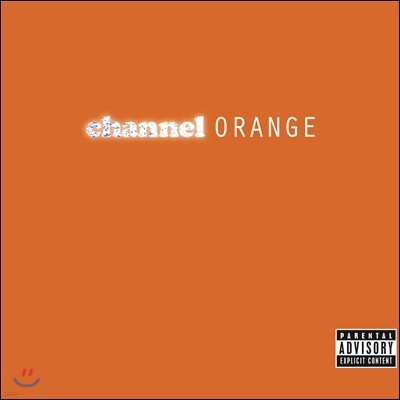 |
 |
글/ 홍혁의 (hyukeui1@nate.com)
고티에(Gotye) < Making Mirro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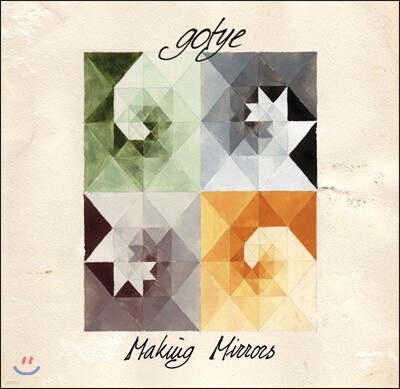 |
 |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단상을 담은 < Making Mirrors >는 전자음으로 단절된 우리 삶을 고전적인 작법과 세상에서 고립된 듯 쓸쓸한 음색으로 해석하고 풀어낸다. 2010년대 음반이지만 ‘Oldies but goodies’라는 격언에도 들어맞는 < Making Mirrors >는 사실은 있지만 진실이 없는 세상의 불편함을 편하게 고한다.
글/ 소승근 (gicsucks@hanmail.net)
존 메이어(John Mayer) < Born And Raise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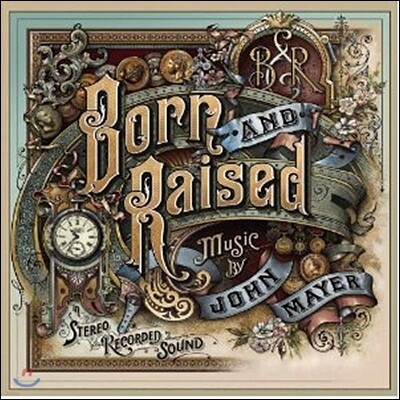 |
 |
글/ 신현태 (rockershin@gmail.com)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 < Born To Di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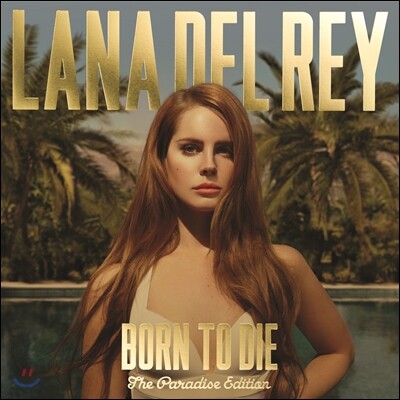 |
 |
글/ 조아름(curtzzo@naver.com)
나스(Nas) < Life Is Goo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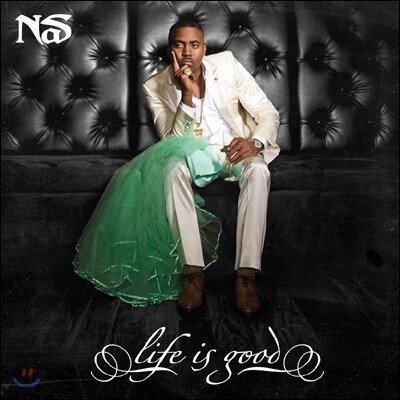 |
 |
글/ 홍혁의 (hyukeui1@nate.com)
스크립트(The Script) <#3>
 |
 |
아일랜드 고유의 켈틱 정서 때문일까. 누구에게도 잘 들리는 멜로디 생산력은 당대 록밴드 중 최강이다. 막장 분노와 폭발보다는 참을 줄 안다. 어느덧 변칙과 재미라는 시대의 키워드에 밀려 폐기처분된 ‘충실’이야말로 음악가의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안다. 충분히 세련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박함이 있다. 이 그룹의 특수 DNA는 세련과 소박의 대칭이다.
글/ 임진모(jjinmoo@izm.co.kr)
선정인(가나다 순, 18명) : 김근호, 김반야, 배순탁, 성우진, 소승근, 신현태, 여인협, 위수지, 윤은지, 이대화, 이수호, 이종민, 임진모, 조아름, 한동윤, 허보영, 홍혁의, 황선업.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5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John Mayer - Born And Raised
출판사 | SonyMusic
필자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큐레이션] 독주회 맨 앞줄에 앉은 기분을 선사하는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a343a9af.pn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waterunicorn
2013.02.25
집짓는사람
2013.01.02
우유커피좋아
2012.12.27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