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기엔 당연 전래동화였죠. 읽기라는 새로운 행위에 온통 빠져있을 때라 부모님을 어지간히 피곤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전래동화전집을 사다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책을 더 사달라고 하자, 읽지는 않고 새 책을 사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 억울해서 아버지 앞에서 그 전래동화 전집 내용을 쫙 외워서 결국 새 책들을 받아냈죠(웃음). 초중고교 시절엔 뭐니뭐니해도 만화책이었고요. 황미나 작가의 『불새의 늪』이나 신일숙 작가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같은 책들은 아직도 몇몇 대사를 외울 정도니까요. ‘인생은 언제나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언제나 그 의미를 갖는다’라는 구절은 살면서 꽤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여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천도룡기』 『신조협려』 같은 무협소설에 심취해 만화가게에서 더벅머리 오빠들한테 라면도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희 최민식 씨의 <에쿠우스>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연극이라는 장르에 감전되듯 매료됐고 그 때부터 희곡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세자매』 『갈매기』를 읽었는데, 특히 이 작품들과 굉장한 기 싸움을 했던 기억이 나요. T.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 입센의 『인형의 집』 등은 지금 읽으라면 진저리를 칠만큼 복잡한 내용들인데, 그 당시엔 왜 그렇게 꽂혀있었는지 모르겠어요(웃음).”
“닐 사이먼의 <굿 닥터>, <브라이튼 해변의 추억> 등 전개가 빠르고 매혹적인 대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작품들은 도저히 묵독이 힘들어질 정도로 대사 하나하나가 팔딱거려 남산 도서관 뒤뜰에서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존 그리샴 『의뢰인』이나 로빈 쿡 『코마』와 『복제인간』, 톰 클랜시의 『붉은 10월』 등의 소설들을 그야말로 들이마시듯 읽었어요. 이 시기엔 복잡하거나 스릴 있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취향이 좀 여성스러워졌다고나 할까요. 일본작가들에 빠졌죠. 무라카미 하루키야 말해 무엇하겠어요.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이나 『N.P』, 에쿠니 가오리의 『낙하하는 저녁』, 츠지 히토나리와 함께한 『냉정과 열정 사이』 등의 감수성에 빠져든 시기도 있었지요. 요시모토의 소설이 소녀의 무릎같이 담백하고 생동감 있다면, 『N.P』는 좀 도발적인 면이 있었죠. 에쿠니의 소설은 왠지 여인의 흰 목덜미 같이 무기력하게 건조하다가도 휙~하는 바람 한 자락에 배가 오그라드는 관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무척 매혹적이었죠.”
“그러다 또 심심해지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범인 없는 살인의 밤』, 『용의자 X의 헌신』, 『악의』, 온다 리쿠의 『흑과 다의 환상』등 추리나 판타지로 힘을 좀 받기도 했네요.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은 따뜻하면서도 번뜩이는 유머가 살아있다는 이유로 성석제 작가 다음으로 좋아해요. 『공중그네』의 모서리 공포증에 걸린 건달의 이야기는 몇 번을 읽어도 피식피식 웃게 된다니까요.”

성석제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는다
최근 가와카미 미에코의 에세이 『인생이 알려준 것들』을 번역한 정선희. 그녀는 “가와카미 미에코라는 작가는 분명 요시모토나 에쿠니와는 다른 맥락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가”라고 말했다. 소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와카미 미에코의 매력을 편안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선희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일상'에 자꾸 관심이 간다. 아마 번역을 하면서 소소하고 엉뚱한 작가의 일상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정선희는 모든 작품에서 작가로부터 삶의 영감을 받는다. 방송 일에 관해서는 성석제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다. “성석제의 깨알 같은 표현들은 물론이고 인물묘사나 성격분석 면에서도 전면적으로 자극을 얻는다”는 정선희. 성석제의 작품을 보며, 불필요한 열정을 식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조하면 어떤 아수라장에서도 유머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반짝이는 유머가 많아져야 ‘버티는 하루’가 아닌 ‘누리는 하루’가 된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우렁찬 목소리와 누가 봐도 뚜렷한 업적이 보이는 삶의 궤적보다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속살거림이 더 살가운 매력을 느껴요. 때때로, 소리 없이 만들어내는 견고한 일상들이 커다란 목소리보다 확실하고 꾸준하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선희의 독서법은 ‘꼬리 물기’다. 어떤 책을 읽고 나면 그 작가의 전작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작가가 영감을 받은 또 다른 책이나 영화가 알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고 싶은 책들이 몰려온다. 요즘은 정유정 작가의 『28』을 읽고 있는데, 오쿠다 히데오의 신간 으로 『소문의 여자』로 한 템포를 쉰 뒤, 『내 심장을 쏴라』도 읽어볼 계획이다. 같은 작가의 글을 연달아 읽는 건 오히려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의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
“제 서재는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자체에요. 날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이야기가 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요. 요즘엔 제발 책들 좀 정리하라고 말을 걸어오네요(웃음).”
사진/M&K
정선희가 추천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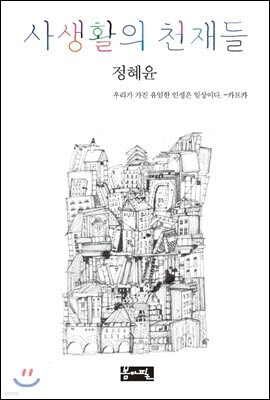 |
정혜윤 저
최근에 읽은 기억에 남는 책이에요. 책 표지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라는 카프카의 말이 시선을 끌어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만났던 8명의 삶의 행보를 그려나간 책이죠. 그들의 목소리와 저자의 내레이션 느낌의 소개가 무척 돈독하게 느껴져 온기가 더 느껴졌던 글들이었어요.
 |
영화가 오래도록 울림이 남는 경우는 음악과 함께일 때인 것 같아요. <바그다드 카페>는 오래 전에 본 영화인데, 내용은 흐릿한데(여자들의 우정이야기였죠 아마) 아직까지도 그 먹먹함이 선명해요. 영화 제목만 떠올려도 제베타 스틸의 흐느끼는 듯한 'calling you'가 너무나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요.
 |
성석제 저
성석제 작가의 열혈 독자입니다. 그 옛날 '어린 도둑과 49마리의 어린염소'라는 단편으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나오는 신간은 죄다 먹어 치우는(?) 독자입니다.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아직도 침대 머리맡에서 제가 ‘말 맛(입심)이 떨어질 때마다 보충제처럼 복용(?)하는 존재들이죠.
 |
천명관 저
『고래』『고령화 가족』 『나의 삼촌 부루스 리』의 저자 천명관 작가의 글도 너무나 좋아해요. 뭔가 땀냄새처럼, 살짝 불편한데 에너지가 느껴지는, 흡입력이 정말 쟁쟁한 필력을 가진 작가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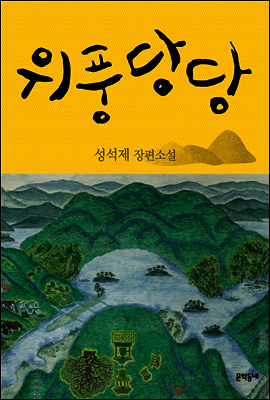 |
성석제 저
성석제의 장편소설 중에 『위풍당당』은 이야기꾼 성석제의 ‘밀땅’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죠.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뱃속이 근질거리며 계속 반푼이처럼 웃게 되는데 이게 또 마냥 웃을 내용만은 아니거든요. 정색하고 덤벼드는 충고보다 웃으면서 스며드는 유머에 자정 능력이 더 있듯이 성석제의 글에는 그런 정화력이 있는 것 같아요.
 |
<원스>도 그렇고 <레미제라블> 역시(생각보다 남자배우들 목소리가 미성이라 오글거리긴 했지만) 앤 해서웨이의 재발견이었죠.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은 배우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비주얼도 포함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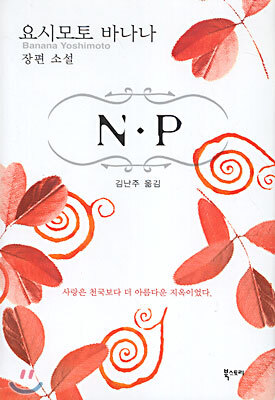 |
김난주 역/요시모토 바나나 저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이 소녀의 무릎같이 담백하고 생동감 있다면, 『N.P』는 좀 도발적인 면이 있었죠.
 |
김난주 역/에쿠니 가오리 저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은 왠지 여인의 흰 목덜미 같이 무기력하게 건조하다가도 휙~하는 바람 한 자락에 배가 오그라드는 관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무척 매혹적이었죠.
 |
오쿠다 히데오 저/이영미 역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은 따뜻하면서도 번뜩이는 유머가 살아있다는 이유로 성석제 작가 다음으로 좋아해요. 『공중그네』의 모서리 공포증에 걸린 건달의 이야기는 몇 번을 읽어도 피식피식 웃게 된다니까요.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취미 발견 프로젝트] 손으로 독서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08dcde92.jpg)

![[김해인의 만화 절경] 이거 읽고 그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1ad97d18.jpg)

![[젊은 작가 특집] 이유리 “최초로 쓴 글은 저를 위한 이야기였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23adec02.jpg)













마에노
2015.11.30
moo2m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