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며칠 전이었다. 내가 속한 한 모임의 단체 SNS 방에 누군가가 ‘사건의 진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공유했다. 나는 굳이 그 주소를 클릭하지 않고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몇 번이나 봤기 때문이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그 외 각종 웹사이트에서 그 동영상은 소위 말하는 ‘핫’한 게시물이 됐고 영상 속 두 여자 연예인은 욕설이 나쁘다는 쪽과 욕설을 부르는 태도가 나쁘다는 쪽의 갑론을박 속에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뉴스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에는 남녀 톱스타의 열애 소식으로 시끄러웠고, 그 얼마 전에는 섹시 스타가 소속사 사장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화제에 올랐으며, 또 그 얼마 전에는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남자배우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생활이 드러나는 바람에 인터넷 공간이 뜨거웠다. 어디 그뿐이랴, 한 가수의 도박 의혹과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 유명인사의 말실수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떡밥’들이 쏟아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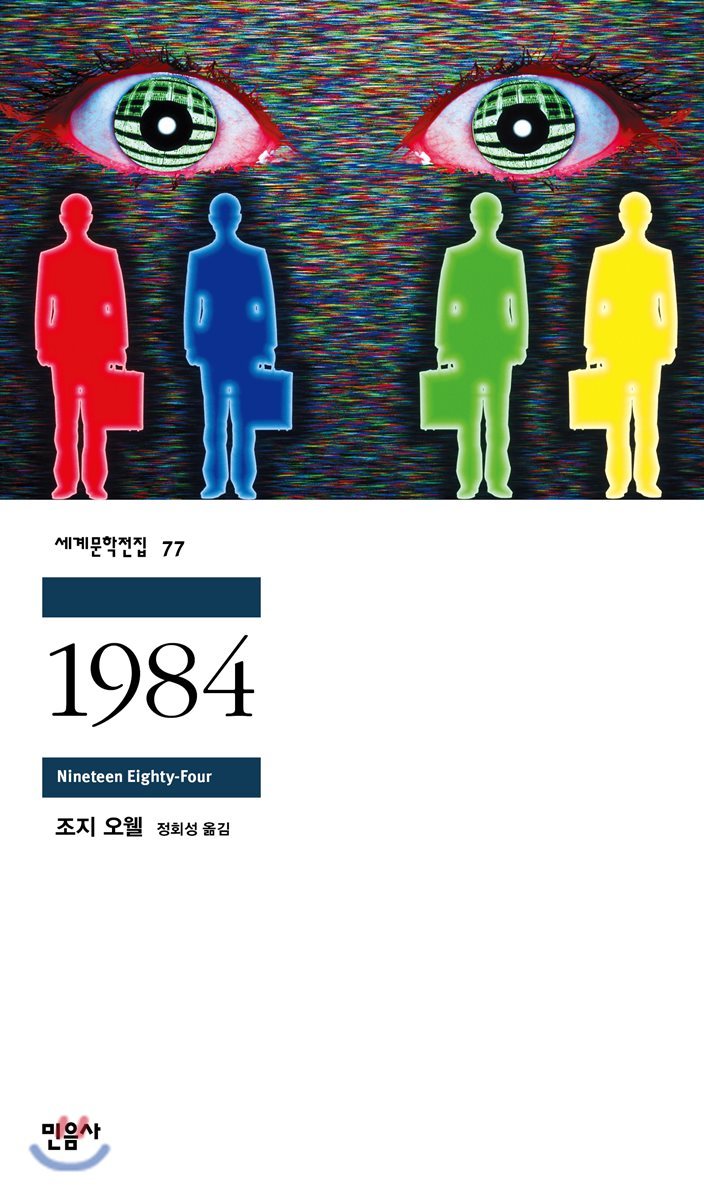 |
 |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적 이슈를 접하면서 기꺼이 법관이 되기를 자처한다. 단순한 관객이길 거부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다.
단체 SNS 방의 그 동영상 링크 주소 밑에도 주르르, 각자의 판결이 달렸다. 덕분에 내 휴대전화는 일 분이 멀다하고 징징징 몸을 떨어야 했다. 아예 알림을 꺼버리고 그 참에 관심도 꺼버렸으면 좋으련만 나 역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그리하여 메시지가 하나 씩 추가될 때마다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건지 메시지 앞의 작은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유명인의 다툼을 엿보며 낄낄거리거나 분노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역시 또 다른 누군가가 엿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추리소설을 쓰는 선배 작가가 어느 날 이런 불평을 했다.
“요즘은 CCTV 때문에 추리소설을 쓸 수가 없어.”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작가가 거들고 나섰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무슨 일이건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 이 시대에는 셜록 홈즈와 같은 낭만적인 탐정이 탄생하기 힘들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추리하는 대신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혹은 아이디를 검색하기만 하면 끝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감시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예인에 대한 가십기사뿐 아니라 일반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나 게시물도 ‘유머’라는 이름을 달고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린다. 그 댓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댓글 밑에는 또 다른 댓글이 달린다. 모두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판결문들이다.
이쯤 되면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를 넘어서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야말로 감시사회인 것이다.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라는 소설을 썼다. 제목이자 소설의 배경인 ‘1984’는 자신이 소설을 완성한 해의 뒤 두 자리 숫자를 바꾼 것이다. 모든 위대한 SF 소설이 그렇듯 『1984』 역시 동시대성을 띠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살고 있는 작품 속 오세아니아는 ‘빅 브라더’라는 인물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텔레스크린’이라는 첨단 기기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밀고한다. 빅 브라더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운 당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한다.
『1984』는 명백히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49년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냉전에 들어가던 시기였다. 이미 전작인 『동물농장』에서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적으로 그려 낸 조지 오웰은 디스토피아적 SF 소설을 통해 동시대를 은유한 것이다.
그가 그려 낸 1984년의 세계는 2015년인 지금도 유효하다.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등은 현시대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 감시도구로서의 기능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알 권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아마 오랜 시간 너무나도 많은 진실들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 반발작용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알 권리’라는 주장은 어느 순간부터 ‘감시를 해도 될 권리’ 쯤으로 바뀌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그악스레 뒤쫓는 언론사가 내세우는 것도 알 권리이고, 개인의 신상을 캐는 것 또한 알 권리이며, 타인의 치부를 들춰낸 후 씹고 뜯고 즐기는 것 또한 알 권리라는 논리 아래 용서가 된다.
1984년의 오세아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감시 체제 아래 자신이 감시받고 또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단죄하는 데에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67년 전, 전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쓴 작품이 지금의 시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느끼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내일 다른 사건이 터진다면 나는 또 클릭을 할 것이다. 블랙박스에 찍힌 ‘김여사’들의 만행을 보며 분개할 것이고, 연예인들의 가십을 읽으며 킬킬댈 것이며, 누군가의 ‘무개념’ 게시물을 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훔쳐보며 은밀히 즐길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또한 건강한 자정작용을 돕는다고. 싸가지 없는 연예인을 단죄하고 뻔뻔한 정치인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냐고. 우리 모두 즐기고 있지 않느냐고.
개인이 개인을, 다수가 개인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나 역시 즐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감히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가끔 섬뜩할 때가 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1984 조지 오웰 저/정회성 역 | 민음사
『동물농장』과 함께 조지 오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전제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 과정과 양상, 그리고 배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추천 기사]
- 책따라고 놀리지 말라!
- 노래 속 전파 찾기
- 내가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 해 줄까?
- 『B파일』 밤새 안녕하셨나요
- 옆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동물농장
출판사 | 민음사
1984
출판사 | 민음사
동물농장 (한글)
출판사 | 미르북컴퍼니
1984
출판사 | Project Gutenberg
1984 (한글+영문)
출판사 | 미르북컴퍼니

전건우
남편, 아빠, 백수, 소설가, 전업작가로 살아간다. 운동만 시작하면 뱃살이 빠지리라는 헛된 믿음을 품고 있다. 요즘 들어 세상은 살 만하다고 느끼고 있다. 소설을 써서 벼락부자가 되리라는 황당한 꿈을 꾼다.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3』,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4』에 단편을 실었다.








![[더뮤지컬] 32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이영애 "새로운 색깔 찾게 해준 <헤다 가블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18-85650a2a.jpg)
![[더뮤지컬] "1인극,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 연극 <지킬앤하이드>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3-bc1ffabd.jpg)
![[더뮤지컬] <하트셉수트> 제이민·장보람, 함께 걷는 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7-f3fd3b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