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스플레쉬
삶은 죽음의 것이고, 죽음은 삶의 것이다. 삶과 죽음이 손을 맞붙잡고 데굴데굴 구른다. 죽은 것을 뜯어먹고 살아남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눈앞의 요리이자 뱃속으로 꺼진 에너지이다. 항상 같은 자리에 놓여있던 사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 윤곽을 드러내듯, 삶의 쾌적함 또한 죽은 자들이 간신히 완성한 보금자리다. 삶은 내내 쾌적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스산해지는 매순간 죽음을 빌려와 꼭꼭 덮는다. 그러니까 삶의 아름다움 역시 죽은 자들의 것이나 다름없다. 죽음의 아름다움이 산 사람들의 작위인 것을 생각해보라.
태어나는 순간에는 왜 나를 볼 수 없을까
미래 밖에서 우리는 공을 굴린다.
(중략)
모호한 시작 때문에 처음과 끝을 굴리는 우리는
―「둥글게 둥글게」부분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 꿈과 현실,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연속되는가. 시간이 직선 위를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선박에 오른 승객들일 뿐이라면, 왜 창밖 풍경은 매일 똑같은가. 어째서 어제와 오늘은 온통 닮은 구석뿐인가. 시간은 차라리 정지되어 있다고 믿을 만큼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이고, 원형 광장을 맴도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와 눕는다. 일상이 아름답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벗어나야 하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벗어나야 한다. 나는 나이기 위해 나의 바깥을 모색한다. 누군가 시를 왜 읽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시집을 선물하겠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꾹 눌러보기 위해 시를 읽는다는 대답도 덧붙이리라. 내가 알고 있는 한 시는, 손과 발이 부러지도록 존재 바깥으로 기어나가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
 |
『차가운 사탕들』은 시에 대한 은유가 풍성한 시집이다. 시인이 표4에 적어놓은 문장, “생활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구덩이// 나오려면 손과 발이 부러지도록 기어서/ 나와야 한다./ 씩씩하게.”라는 문장은 이 시집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시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활이라는 구덩이를 기어 나온다. 시는 삶의 시야로부터 걸어 나간 사라진 대상을 응시하기 위해, 모두 떠난 빈집에 남아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름답게 사라졌다고 여기는 다른 이들의 죽음 그 압력 손등에 도는 푸른 피를 보며 아무것도 폭발시키지 못하는 밥솥처럼 점점 코를 흘렸다
개의 똥구멍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굶었다 몸속에서 펌프질하는 이 뜨거운 손은 뭔가
그녀는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뼈 주변을 조심하며 뒹군다는 현실 그녀는 바닥에 친밀한 자세 어두운 모험에는 달콤한 잠의 취향이 있다
자기 안에 있을 때조차 밖으로 나갔다 심지어 늙기 위해 책을 읽었지 집을 구할 때는 무덤 생각을 해야 한
다 털 빠진 개들이 어슬렁거리는 마당
통과하는 것들은 잡지 마
그녀는 우리가 슬퍼하는 죽음의 압력을 높여갔다 유령이 되는 꿈을 꾸었지만 무사히 육체로 다시 만져졌다 밥물이 끓어넘치고
그녀는 왜 자꾸 그녀보다 많이 가진 자를 먹여주는지 그 개의 똥구멍에 붙어 있는 하얀 밥풀은 어떻게 할 거니 뒹굴 때마다 만져지는 옆구리 뼈
푸른 피는 바깥으로 나오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무것도 폭발시키지 못하고 일요일에 잠이 들었다 주인이 사라진 이 무덤을 지킬 수 있을까 고소한 밥물 냄새 고소한 피냄새
―「도우미」전문

이영주, 『차가운 사탕들』, 문학과지성사, 2014
시인의 삶과 풍류가 흐르는 낭만자적한 삶 사이에 아직 관성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집주인이 떠난 빈집에 남아 집주인의 빈자리를 쓸고 닦는 도우미의 모습이야말로 시의 모습 아닐까 싶다. 집주인이 떠났을 뿐이며 여전히 도우미가 남아있어도 사람들은 이 집을 빈집이라 부를 것이다. 텅 빈 무덤으로 알 것이다. 탁상시계가 오래 놓여있던 자리에 탁상시계가 사라지면 협탁 위로 탁상시계 모양의 빈자리가 남는 것처럼 시계가 만져지던 허공을 헛짚으며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 순간 분명해지는 사실은 탁상시계가 사라졌다는 사실 뿐이기 때문이다. 시는 존재가 벗어놓고 간 투명한 옷가지를 수거해 세탁하고, 뽀얀 먼지를 문질러 부재의 흔적을 지운다. 부재를 지움으로써 존재를 되살린다.
자기 자신의 뜨거운 압력을 견디며 아무것도 폭발시키지 못하고 오래 연명하면서.
차가운 사탕들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유계영(시인)
1985년 인천 출생.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하였으며, 시집 『온갖 것들의 낮』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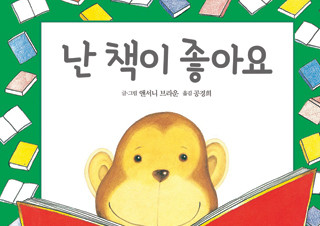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리뷰] 탐정 소설 읽기의 은유 『탐정 매뉴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5-0e2a9687.jpg)
![[에디터의 장바구니] 『나의 오타쿠 삶』 『우리는 내륙으로 질주한다』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a0d12f61.jpg)
![[리뷰] “세속적이다. 하지만 아름답구나”](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4-9e05911c.png)
![[송섬별 칼럼] 걔가 개를 데리고 다니기만 했더라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5-3397d7fe.png)



iuiu22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