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도 꽤 찍으니까 혼자서 3인분어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괜찮은 외주 작가예요”라고 자기소개를 하곤 했다. 3인분의 일을 한다면 3인분의 고료를 받아야 하는데, 1인분 고료를 받으면서 일을 세 배로 하겠다는 걸 마치 자랑인 듯 홍보했단 얘기다. ‘가성비 좋은 작가’, 이게 내 강점이라고 믿었다. 지금은 더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이고, ‘가성비’라는 표현이 싫어져서다.
다들 알겠지만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의 약자다. 영어로는 ‘cost-effectiveness’쯤 될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화의 양은 한정적이다. 아니, 항상 허덕인다고 하는 게 맞겠지. 한없이 부유하면서 한없이 여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니 같은 양의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 물질이든 경험이든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얻길 원한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다. 하지만 가성비가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아예 내 삶을 끌고 나가기 시작하면 곤란해진다. 사방에서 가성비 타령을 한다. 그놈의 가성비. 이 표현은 대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걸까? 처음엔 재미있고 센스 있다고 생각했다. 귀여운 줄임말이네. ‘Case by case’를 ‘케바케’라고 줄여 말하는 것 같아.
그 귀엽던 가성비가 이제는 한국을 지배한다.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순간,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뭘 원하며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지는 뒷전이고 일단 가격부터 묻는다.
‘이거 얼마지? 비싸네? 더 싼 건 없나?’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다. 혹시 비슷한 저렴이 상품은 없는지, 과연 이걸 사서 돈값 할 수 있을지, 뽕을 뽑을 수 있을지 예민하게 검색한다. 가성비가 최우선인 삶은 슬프다. 가성비가 최우선인 사회는 끔찍하다.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 그다지 재밌거나 신나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두루마리 휴지 36개 한 묶음을 사는 게, 생수 2리터짜리 12개 묶음을 사는 게, 생리대 중형과 대형을 한 아름 사는 게 뭐 그리 재미있겠는가. 그런 소비 안에 대체 무슨 즐거울 만한 건덕지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소비의 즐거움은 그거 없어도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는, 세상 쓰잘데기 없는 걸 살 때 비로소 솔솔 피어난다. 이거 너무 예쁘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뻐! 오, 냄새 되게 좋다, 안 사도 되지만 향이 너무 좋아! 자그마하든 큼직하든, 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고르는 요런 물건이 주는 기쁨이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소비를 한 날은 기분이 좋다. 두고두고 떠올리게 된다.
물건뿐인가, 경험도 마찬가지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팬미팅, 확 꽂혀버린 뮤지컬 공연 2회차, 기다렸던 영화, 새로 나온 소설, 전시회, 짧거나 긴 여행…. 모두 가성비로만 따지자면 꽝일지도 모른다. 그치만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 가성비를 따져야 할 땐 따지고, 열심히 계산해 가며 아껴 모은 돈으론 가성비를 싹 잊고 즐기는 것이다. 이게 사는 거지!
‘창작’은 돈이 든다. 돈이 수시로 들어가는 행위다. 금덩어리를 주무르고 깎아 다이아몬드를 콕콕 박는 작업을 해서가 아니라(해보고 싶습니다), 돈이 종종 창작의 연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성 들여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아… 하고 기분 좋게 한숨을 내쉬어야 한다. 낯선 여행지에서 설렘을 느껴야 하며, 새로운 잠자리에서 말똥말똥 눈을 뜨고 외로움도 느껴야 한다. 때론 누군가와, 때론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끊임없이 보고 누려야 한다. 우리 안의 우물을 촉촉하고 찰랑하게 채워야 한다. 그래야 취향도, 입맛도 더 예민해지고 새로운 창작 욕구가 피어오른다. 우리는 모두 창작자다. 좋은 문화를 누려야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선순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회가 제안하는 임금 수준이다. 꼭 필요한 것부터 합리적으로 소비한 후 남은 거로 인생을 즐기려는데, 잠깐만요, 어째 남는 게 없네? 그 결과, 입만 열면 ‘돈’이다. 그걸 빼고 다른 걸 논할 수 없다. 누구를 만나든 기승전돈, 때로는 돈승전돈, 심할 땐 처음부터 끝까지 돈돈돈돈.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두고도 가성비 이야기를 한다. 다른 나라에선 얼마를 썼는데 우리는 훨씬 싸게 했대, 그 돈으로 그 퀄리티를 뽑은 거래, 가성비 대박이지! 여보세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싼값에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며 과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느냔 말입니다.
빠듯한 일정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칭찬하되, 비상 상황을 헤쳐나간 후에는 그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며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다. ‘싼값에 잘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칭찬해야 할 부분은 ‘잘했다’지 ‘싼값에’가 아니다.
헝그리 정신요? 웃기고 있어. 나는 이 말을 싫어한다. 일은 시켜먹고 싶은데 돈은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쪽에서 주로 하는 소리다. 듣는 순간 경계해야 한다. 아끼고 또 아끼면, 최소한의 것만 자신에게 허용하면, 쪼들릴 대로 쪼들리면 숨은 쉴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뭐 하나 하는 데도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소한 소비 실패에 크게 좌절하게 된다. 좌절은 분노로 이어진다. 잔뜩 날이 서고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우리의 물가는 너무 높고, 평균 노동소득 수준은 한심하게 낮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그걸로 일상을 꾸리고 저축해야 하는데 말처럼 되지 않는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신용카드 회사에서 빼가는 걸 한숨 쉬며 멍하니 바라본다. 사실 멍하니 바라볼 시간도 없다. 순식간에 자동 인출되니까. 그리고 남은 얼마간의 돈을 한 달, 30일로 나누어 하루 생활비를 가늠해본다. 삶이 피곤하다.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겠고, 웃기는 걸 봐도 웃음이 나지 않는다. 시니컬하게 입꼬리 한쪽을 올리며 피식하고 만다.
이 상황에서 창작을 이야기하라고? 배고픔과 고통은 창작에 필요한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분’이어야 한다. 헝그리 정신을 들먹이며 창작자의 고통만이, 눈물의 짜고 쓴 맛만이 가치 있다 생각한다면 멸치 똥을 한 주먹 모아서 종일 씹어보길 권한다. 입에 잘 맞을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고 삶 전반을 돌보는 일은 창작자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끝없이 유지 보수해야 한다. 부디 가성비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 배변 후에는 질 좋은 휴지로 항문과 성기를 닦고, 유해물질 없는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싶다. 햅쌀로 밥을 지어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을 곁들여 식사하고 싶다. 여름엔 냉방을, 겨울엔 난방을 하고 싶다. 생활 물가와 최저임금 사이의 한없는 간극이 좁혀지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결코 임금 상한선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부디 선택 사항이 아니길 바란다.

신예희(작가)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프리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재미난 일, 궁금한 일만 골라서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그녀는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는 탓에 혼자서 시각과 후각의 기쁨을 찾아 주구장창 배낭여행만 하는 중이다. 큼직한 카메라와 편한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튼튼한 위장 하나 믿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40회에 가까운 외국여행을 했다. 여전히 구순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처음 보는 음식, 궁금한 음식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습성을 지녔다. ISO 9000 인증급의 방향치로서 동병상련자들을 모아 월방연(월드 방향치 연합회)을 설립하는 것이 소박한 꿈.
저서로는 『까칠한 여우들이 찾아낸 맛집 54』(조선일보 생활미디어), 『결혼 전에 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한 서른여섯 가지』(이가서), 『2만원으로 와인 즐기기』(조선일보 생활미디어), 『배고프면 화나는 그녀, 여행을 떠나다』(시그마북스), 『여행자의 밥』(이덴슬리벨)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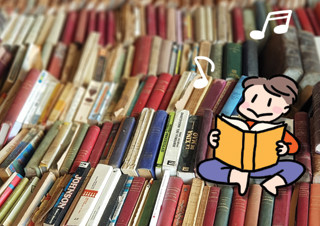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더뮤지컬] 김가람 작가, 세상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db5e43a3.jpg)


vase43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