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이맘 때, 난생처음 출간 기념회라는 걸 경험했다. 운이 좋게 쓴 소설이 문학상을 받은 덕이었다. 출간 기념회 당일 나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아, 이제 당분간 놀아도 되겠구나! 이 기대가 깨진 것은 직후였다. 기자들은 물었다. “차기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기작이라니. 나는 속으로 어지간히 당황했다. 책을 내자마자 다음 책을 벌써 생각해야 하는 건가? 본래 작가는 그런 건가? 그래서 나는 떠오르는대로 대답해버렸다. “아, 세계의 문이라고 그림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려고…….” 세계문학상을 줄여서 만들어본 제목이었다.
다음 날 신문에 내가 말한 게 실려버렸다. 그림을 소재로 한 소설, 차기작 제목은 ‘세계의 문’. 내가 무슨 밀란 쿤데라의 소설 『농담』 속 주인공도 아니고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큰일났구나 싶었다. 그래서 이 때부터 뒤늦게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전시회에 많이 가고, 도록도 공부하고, 화가들의 전기도 읽고, 아무튼 그림과 관련된 건 다 읽었지만 벼락치기로 시작한 공부가 그렇게 쉽게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리 없다. 여전히 문제의 ‘세계의 문’은 어림 반푼어치 없는 이야기다.
대신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그림을 구입하는 일.
2016년, 그림 공부를 위해 우연히 동화 쓰는 송미경 작가의 전시회에 갔다가 그의 작품 두 장을 구입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정한 소재가 마음에 들었다. 내 소설 제목은 『붉은 소파』 . 송미경 작가의 소재는 의자. 알고 보니 송미경 작가는 의자를 보면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다고 했다. 그렇게 송미경 작가의 그림을 구입한 후 내게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멋진 의자를 발견하면 작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다.
올해, 또 한 장의 그림을 구입했다.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아작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았다. 이 그림이 나를 사로잡았다.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는 듯한 깊은 눈동자. 나는 그 눈동자가 마음에 들었다. 무작정 전시회를 찾아갔다. 늦은 밤이었다. 다른 화가들과 함께 하는 전시회라 아작의 작품은 거의 다 팔린 상태였다. 나는 꼭 한 점 집에 들여놓고 싶어서 언제 또 전시회가 열리는지, 가격은 얼마쯤 하는지 물어봤다. 5월에 전시회가 열린다. 소품 한 점의 가격은 얼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작은 목표를 세웠다. 그 때까지 열심히 글을 쓰자. 계약을 해서 그 돈으로 아작의 그림을 구입하자.

5월 2일이 왔다. 아작 & 김원근 초대전 <순순한 상상. 純>이 그 때의 화랑에서 열린다는 이야기에 전시회 첫 날 바로 전시회장을 찾았다. 벌써 소품 몇 장 중 한 점이 팔린 상태였다. 나는 급한 마음에 소품만 훑은 후 바로 한 장을 골랐다. 최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 그런 나와 닮은꼴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 한 점이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꽃은 아프게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알까’였다.
그렇게 그림을 구입하고 나자 화백과 차 한 잔 하며 이야기할 여유가 생겼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좋아하는 책을 알고 싶어졌다. 화가는 시를 좋아한다고 했다. 여러 명의 시인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황인찬이란 시인의 이야기와 그가 쓴 시집 『희지의 세계』 이야기가 나왔다. 화백이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시인이라며, 팬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는 대답했다.
“꼭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그림이 왔다. 눈높이에 그림을 붙이고 그 앞에 서서 화백이 말한 시집 『희지의 세계』 를 들고 읽었다. 그리고 영감이 내게로 왔다. 이 날, 나는 마침내 그림을 소재로 한 소설의 한 틀을 정할 수 있었다. 시인과 화가.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 어쩐지 그런 이야기를 적고 싶어졌다.
-
희지의 세계황인찬 저 | 민음사
‘매뉴얼화’된 전통과의 다툼이며, 전통에 편입하려는 본인과의 사투이기도 하다. 주체가 퇴조한 동시대 젊은 시인의 움직임 중에서 황인찬의 시는 돋보이는 사유와 감각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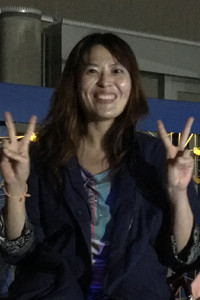
조영주(소설가)
별명은 성덕(성공한 덕후). 소설가보다 만화가 딸내미로 산 세월이 더 길다.












![[큐레이션] 꿈꾸고 싶고, 더 나아가 보고 싶은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3-2cd19e89.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몸과 몸뚱이와 몸짓](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5-17ec346e.jpg)
![[김해인의 만화 절경] 이거 읽고 그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1ad97d18.jpg)

![[젊은 작가 특집] 돌기민 "그때만큼 자유롭게 휘갈기듯 소설을 쓴 적은 없을 겁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3cc095a.png)






ne518
2019.06.09
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