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물건을 고르는 일은 늘 설레는 일이다. 시간을 들여 물건을 고르고,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그 물건에 더 깊은 애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월간 생활 도구』는 두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직접 사용한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온라인에서 ‘카탈로그’ 상점을 운영하는 저자는 생활용품을 직접 사용해보며 물건에 담긴 기록을 찾아 나선다.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전하고, 소소한 일상을 소재 삼으며 삶과 맞닿아 있는 사물을 소개한다. 물건은 만든 이와 사용하는 이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만큼 더욱 신중히 고르고 꼼꼼하게 살핀다. 그렇기에 제품에 담긴 이야기는 물론 특성과 장점을 잘 알고 있다.
두 작가님이 운영하는 상점 ‘카탈로그’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두 분이 ‘카탈로그’에서 각자 41호와 82호로 소개하는데요.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년 전에 함께 여행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재미있는 무언가를 궁리하던 때라 이런저런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요. 마침 둘 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물건을 새로 구입했었는데, 쓰다 보면 해지는 행주조차도 잘 고르고 싶어 품을 팔고 공을 들였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의 방도, 혼자 살던 집도 모두 나의 공간이긴 했지만 결혼 후에 생긴 집은 유독 특별해서 공간을 채우는 살림 하나하나에 애정을 쏟았던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좋은 물건을 안내하는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막상 카탈로그를 소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상점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또 얼마나 이 일을 계속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볍게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간을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민망해 서로 살고 있는 나라의 국가번호를 따서 41호, 82호라는 익명을 썼습니다.
김자영 작가님은 서울에서 그리고 이진주 작가님은 스위스 바젤에 사는데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책 작업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나요?
2014년 상점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멀리 떨어져서 일했어요. 원격 작업이 익숙해 이번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나는 대로 날 것을 적어두면 상대방이 수시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전개를 짜고, 초안을 쓰고, 탈고할 때까지 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수정과 덮어씌우기를 끝없이 반복했어요. 상대방의 모니터를 함께 보며 작업할 수 있는 툴 등 여러 가지 앱이 있어서 가능했죠. 주기적으로 전화 회의도 했는데, 시차를 맞추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회의가 가능한 시간대가 다른 사람의 수면과 꼬리를 물고 있어서요.

요즘은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발견하고 물건 자체에 흥미가 생겨 소비하기도 합니다. 『월간 생활 도구』에서 소개한 46가지의 물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나요?
취향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에 집중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꽁꽁 얼어 숟가락만 휘어진 경험이 있다면 손의 열을 이용하는 ‘제롤의 오리지널 아이스크림 스쿱’을 보고 이마를 탁 칠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눈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건 쉽지 않은 기다림이니까요. 서서 일하는 사람은 필기도 서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한 필기가 엉망이라 자신의 필체임에도 뭐라고 썼는지 한참을 해독해야 했던 사람은 ‘측량 수첩’에 녹아 있는 세심함에 공감할 테고요.
『월간 생활 도구』라는 책 제목 때문에 정기 간행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월간으로 테마를 정하고 물건을 소개하기 때문에 지어진 책 제목으로 알고 있어요. 테마를 정해서 물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나요?
카탈로그가 작은 상점이라, 하나의 용도를 위해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제안해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건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글과 사진에 최대한 담고자 하지만 사물 자체가 낯설다 보니 잘 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테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계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재질에 맞게 물건의 묶음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요. 이를 책에도 담았어요.
『월간 생활 도구』를 보면 조금 낯설고 생소한 물건도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보물 같은 물건들을 발견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물건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잘 들여다보려고 해요. 특히 만들어진 배경이나 만든 사람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요.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에게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는데 대부분 숨겨져 있죠. 그 과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월간 생활 도구』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두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왜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나요?
‘트러스코의 툴박스’예요. 트러스코는 1959년부터 산업용 제품을 만들어온 회사로 다양한 공구함을 선보이고 있어요. 무겁고 다칠 염려가 있는 송곳이나 드라이버, 나사 같은 도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필통처럼 책상 위의 물건을 담아두기에도 좋아요. 반짇고리, 구급상자 등 일상의 다양한 물건을 담아두는 용도로도 적합해 두루두루 사용하는데, 겹쳐 쌓는 방식이나 여닫는 느낌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험을 했을지 전해져요.
그리고 ‘풀젠틴 가구 관리 오일’과 ‘타피르 가죽 관리 제품’도 집에서 잘 쓰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풀젠틴은 빈티지 가구의 오염을 제거하면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타피르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나 지갑을 멋스럽게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끼는 물건을 오래도록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물건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죠. 그 외에도 전반적인 책의 흐름과 다른 도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책에는 담지 않은 물건이 참 많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좋은 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물건에 대한 기준은 시간이 흐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우선은 바르게 만들어진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값싸게 찍어내는 물건과의 경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도구의 역할에 따라 바른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마감하려면 소신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만든이의 뜻이 오롯이 전달되는 물건이 생활에 많이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 김자영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어느 겨울, 스위스에 사는 이진주와 생활 도구를 소개하는 상점 카탈로그를 시작했다. * 이진주 서울과 상해에서 자랐다. 건축과 입학 첫 날 설계실에서 김자영을 만났다. 대학 졸업 후 미국, 일본,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일했다. 지금은 바젤에 살며 상점 카탈로그와 건축 설계 사무소 Kohnle Lee Architekten를 운영한다. |
추천기사
월간 생활 도구
출판사 | 지콜론북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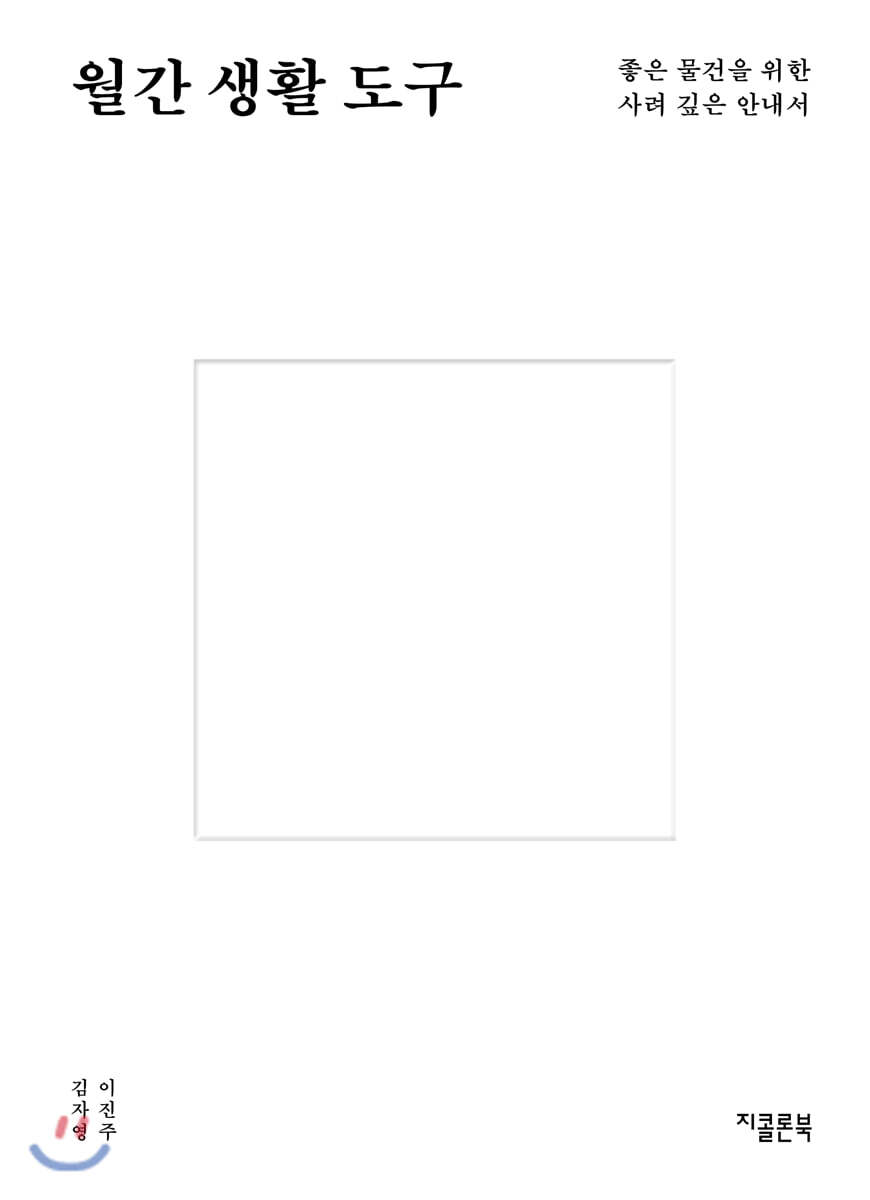




![[큐레이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읽어야 하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700ed945.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