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을 남기는 사람』은 201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유품」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한 유희란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독의 문제를 세상을 떠난 독거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섬세하면서 깊이 있게 처리”(권영민 문학평론가, 현기영 소설가)했다는 평을 받은 데뷔작 「유품」을 비롯하여 모두 8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반듯한 문장과 여러 겹으로 설계된 서사 구조,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섬세한 시선이 돋보인다. 유희란의 소설은 “찬찬히 읽기를 요구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공선옥 소설가의 말처럼 읽을 때마다 또다른 결을 드러내 보이는 작품들이다.
첫 소설집을 내고 난 후의 소감과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첫 소설집이 늦었습니다. 등단 후 수상소감 때문인 양 늘 그 순간을 돌아보고는 했습니다. ‘천천히, 오래 걷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나태한 말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동적으로 오래 걸어가야겠다.’ 첫 소설집을 내고 난 후의 마음입니다. 요즘도 평소와 다름없이 단조롭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소설 「밤하늘이 강처럼 흘렀다」에서는 장루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밖에도 유품 정리사로 일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유품」, 무당이 등장하는 「천장지비」, 옷을 만드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셔츠」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설의 모티브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모티브가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쓸 수 없고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쓸 자신이 없거나 쓰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에 관해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혹여라도 불손함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소설은 모티브 이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먼저인 듯합니다. 「사진을 남기는 사람」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바라본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드물고 제 가슴 한복판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설의 표제작 「사진을 남기는 사람」은 사진에 대한 다양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설의 출발점이 된 한 장의 사진 같은 순간이 있을까요?
지인인 어느 사진작가의 스튜디오에서 나무 사진을 보았습니다. 표지에 실린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묘하게 슬픈 구석이 있는데 앞선 나무의 모습이 내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주어지는 일들이 내게는 호사스러운 바람이라도 되는 듯 여겨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냥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와 같은. 어릴 적 제가 사는 집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지나가는 비에도 위태롭게 쓰러지고 마는 나무였는데 마음씨가 솔직하여 그 나무는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모든 불안을 내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나무가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무의 힘없음은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테지요. 불안이 일상이었고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라보니 저는 불안함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안은 감각하는 일을 도맡고 있는 듯했습니다. 때때로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글귀, 누군가의 다독이는 손길과 눈빛이 내 머리 위로 햇살처럼 비쳐 들곤 합니다. 의지가 있는 나무의 사진을 바라본 순간처럼.
데뷔작이기도 한 「유품」은 2013년 발표한 작품이면서도 점점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재를 이야기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소재로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 고독사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며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홀로 살다 떠난 그들의 자식들을 향해 패륜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뱉기 쉬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독사한 누군가에게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갈 길 알 수 없는 아픔과 슬픔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여하였기에 그러한 시선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독사한 누군가의 유품을 정리하는 화자. 그들이 눈물마저 삼키지 못하도록 스스로 목구멍에 담은 대상에 관해 그들의 속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소설에 가장 애정을 쏟았던 인물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가장 어린 ‘공이’(「천장지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환생을 기다리는 일이 아이에게는 감당의 문제였을지 아니면 바람이었을지. 아마도 후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불이 난 곳에서 꼼작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불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 말을 했을 때 그녀가 행복해할 모습마저 그리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책 속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떤 문장을 꼽고 싶으신지요?
“어긋나 있는 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그러져 보이는 사물에 대해 위험하지 않은 말로 내게 표현해주기를 쉼 없이 바랐다.”
_ 「밤하늘이 강처럼 흘렀다」 중에서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위험하지 않은 말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사진을 남기는 사람』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어떤 소설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음 둘 곳을 만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마음 공간일 때도 있고 세상 살아내는 사람이 들려주는 삶의 공간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현재진행형인 이야기가 있는 듯해요. 이따금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지는 날, 내게 묻곤 합니다. 아직도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독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그 시간만이라도 마음 둘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희란 201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유품」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대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소설집 『사진을 남기는 사람』을 써냈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사진을 남기는 사람
출판사 | 아시아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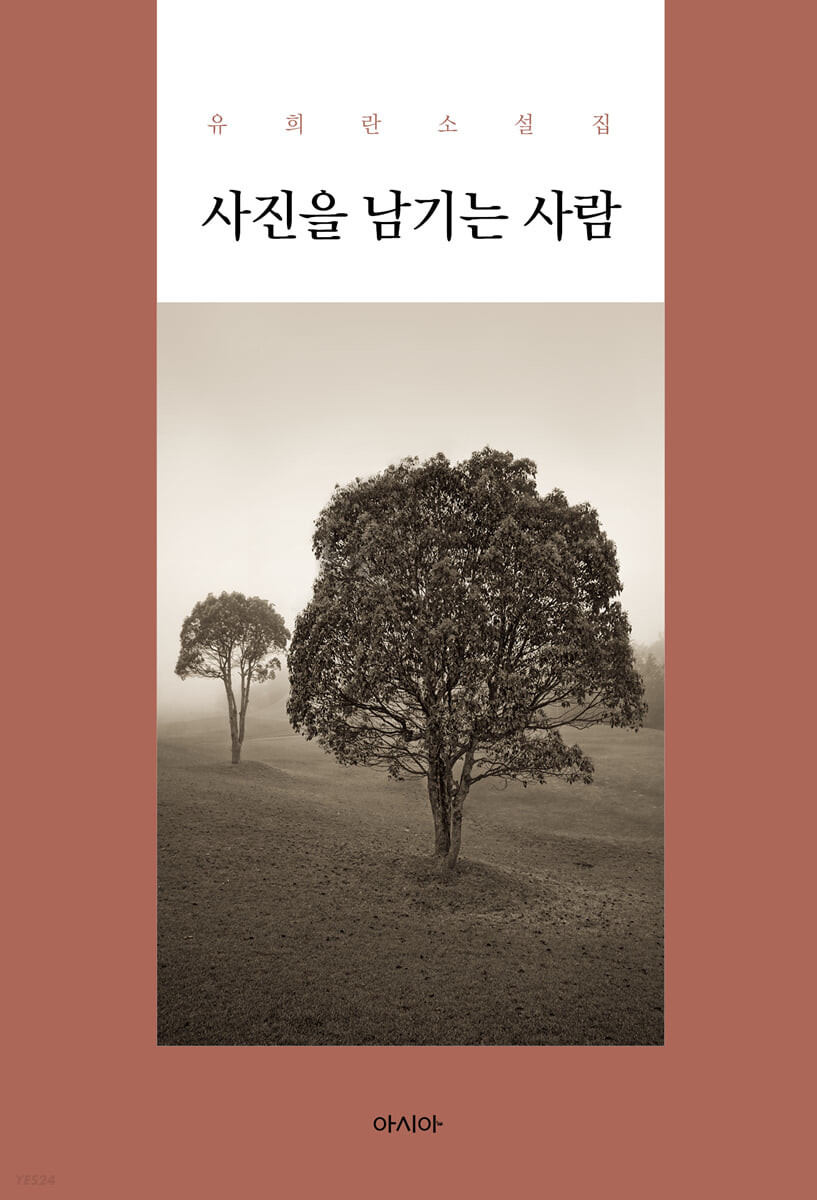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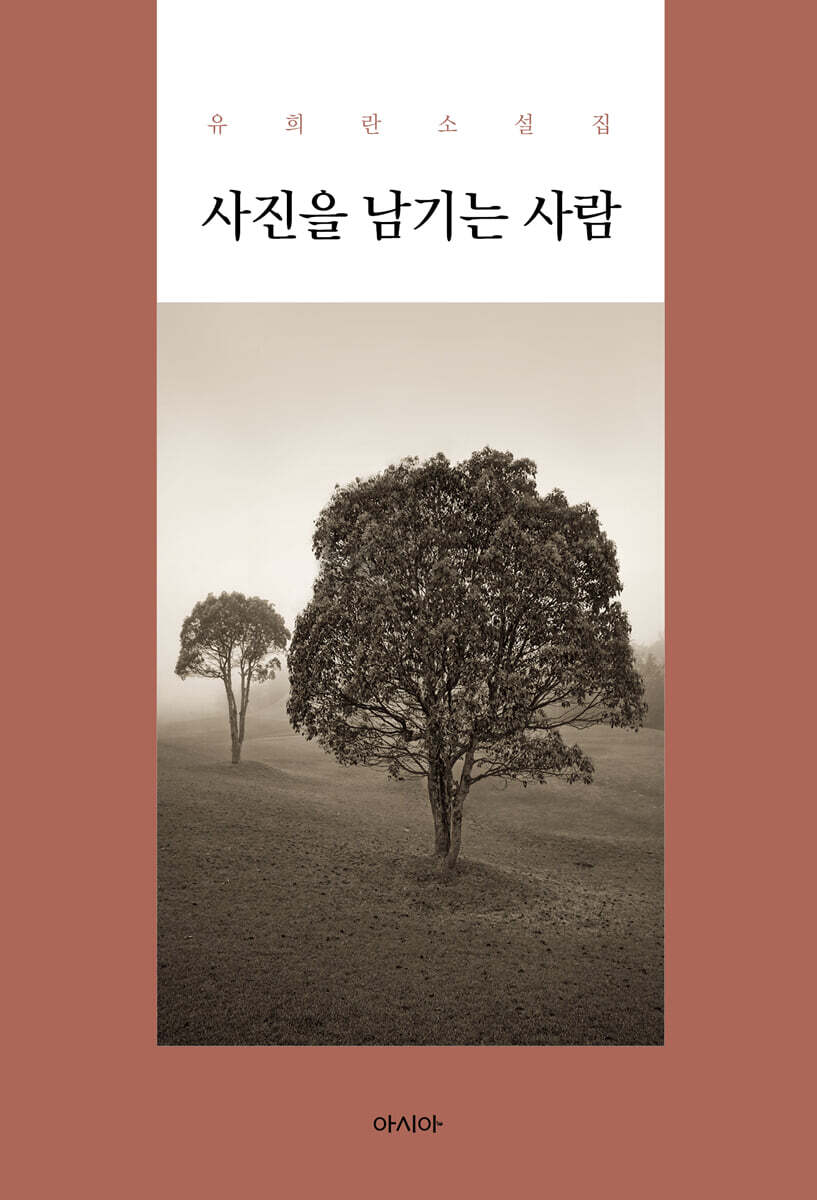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장진영 “글을 쓰면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3a5c6c82.jpg)
![[리뷰] 몸이 된 글, 몸부림으로써 글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8-8dea6b1e.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첫 번째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0-3c5449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