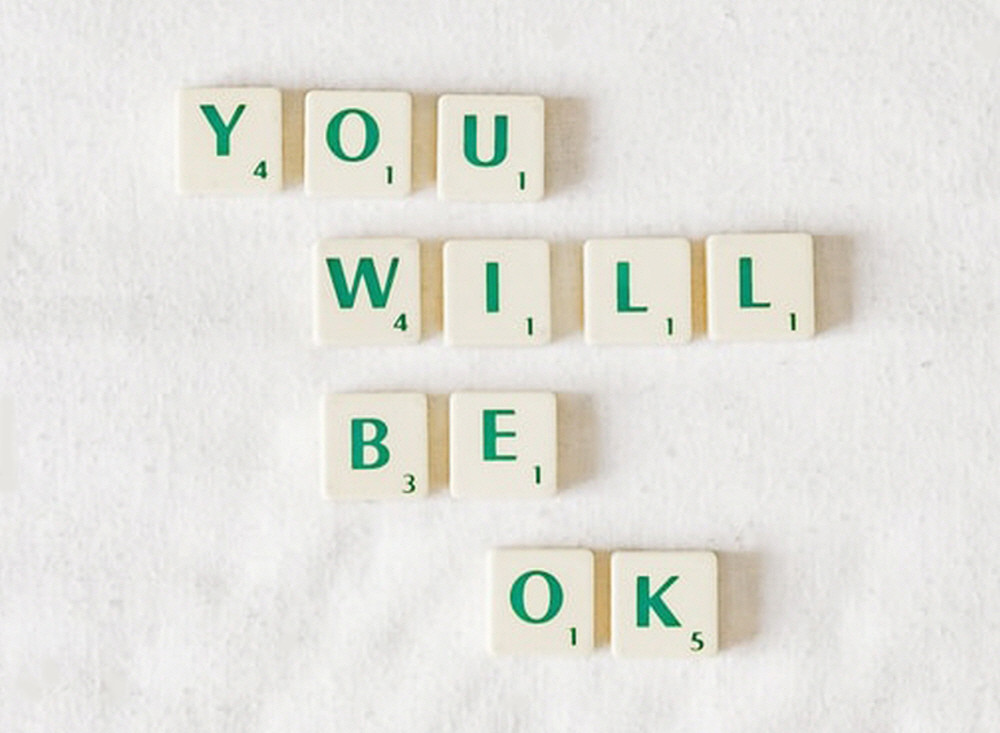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1학년 생활은 날마다 새롭기만 하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새로 만나고, 하루 중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생겼으니 당연하다. 하루하루가 특별한 일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일들을 아이들이 차분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1학년의 발달 단계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의 앞뒤 몇 분 정도 되는 맥락을 연결하여 말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들끼리 다툼이라도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저마다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무언가가 빠져 있다. 이때 교사가 이야기의 앞뒤를 계속 연결해줘야 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안하다”, “내가 심했다”, “잘못 알았다”는 말들이 나온다. 문제는, 교사가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같이 있어야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다툼만 그런 게 아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걸 봤거나 재미있는 일을 겪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고 열심히 설명해줄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처음부터 아이들 이야기를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여러 아이가 전해주는 말을 다 듣고 조합해보고 직접 그 자리에 가봐야 아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이해될 때가 많다.
이렇게 아이가 맥락 없이 내뱉는 듯한 말에 어른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반응을 해주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게 아닌 데다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이 벌써 몇 시간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더 알기가 어렵다. 늘 함께 지내는 교사조차도 아이들 말을 듣고 반응해주다가 오히려 잘못 알아듣고 실수하거나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사과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것만 봐도 아이가 전하는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어른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흘려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말로 전하는 것도 이러한데, 1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앞뒤 맥락에 맞게 글로 쓰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게다가 이미 부모님께 말해봤지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는 반응이어서 아이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내 이야기에 친구나 어른들이 크게 반응해주면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잘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전까지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무 일 없었다고 얼버무리게 된다.
1학년 아이들의 놀이는 대부분이 역할 놀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술래잡기를 해도 역할이 다 부여되어 있다. 흔히 인기 만화나 게임 속 캐릭터를 지정해서 술래잡기를 하는데, 그 역할에 빠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난 OO 할게!” 하고 말하는 순간 주문이 외워진 것처럼 아이는 그 역할로 행동이 달라진다.
역할이 정해지면 주변 공간도 달라진다. 교실이 성이 되기도 하고 그늘이 비밀 기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놀 줄 알아야 재미있다. 상상을 해야 콘크리트투성이에 늘 지루하고 똑같은 곳이 새롭게 변신하고 재미있는 곳이 된다.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놀이든 자신들의 상상을 함께 공유하고 그 역할에 푹 빠져든다.
이런 놀이를 까맣게 잊고 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놀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교사조차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렵다. 갑자기 아이의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캐릭터로 바뀌어 있고, 교실은 딴 세상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겠는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들려주는 놀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린다.
개미 식당
승민
오늘 개미 식당을 열었다. 메뉴는 꿀밥과 설탕 한 컵, 박하사탕이다.
근데 실망! 실망! 개미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박하사탕을 내가 다 먹어버렸다.
다음엔 개미 식당을 엄청 많이 열어볼 거다. 그때는 개미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하루는 승민이가 페트병을 작게 잘라서 설탕과 박하사탕을 넣어 교실 구석에 두었다. 그러고는 한참을 교실 바닥에 엎드려 그 병을 쳐다보았다. 멀찍이서 승민이가 사탕이랑 설탕을 넣어두는 것만 보고 내가 바닥에 그런 거 흘려두면 안 된다고 했더니, 개미 어쩌고 말하기에 개미 끌면 안 된다고 다시 주의를 줬다.
알고 보니 승민이는 ‘개미 식당’을 열었던 건데,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이만 나무랐다. 뭐든 진짜처럼 해보고 싶어 하는 승민이가 큰 식당(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은 열 수 없으니 작은 동물을 대상으로 식당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중에 승민이 말을 이해하고 나서 가까이 가보니 작은 종이에 ‘달콤 개미 식당’이라는 간판도 붙여놓았다. 아마도 개미들이 과자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줄지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해냈으리라. 갖다놓은 음식만 봐도 개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개미가 간판을 읽고 찾아오진 않겠지만 문득 나도 궁금해졌다. 사탕 냄새가 나면 개미가 줄지어 오지 않을까 싶었고, 그럼 맛집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싶어 내심 기대가 됐다.
아이들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혼을 낸다. 어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다.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를 드러내는 소리”이기도 하다. 설사 꾸며낸 이야기라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이야말로 오히려 아이들의 일상에서 훌륭한 글쓰기 소재들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오은경(초등학교 교사)
경북 울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글쓰기 공책에 쓴 이야기를 혼자만 보기 아까워 문집을 만들고 책으로 묶어주는데, 그럼 부모님들이 글을 쓴 아이들보다 책을 만들어준 나를 더 고맙게 생각해주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예스24 인문 MD 손민규 추천] 뇌과학으로 현명하게 살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3/3/7/63370d746e39741b23d489de50c71f4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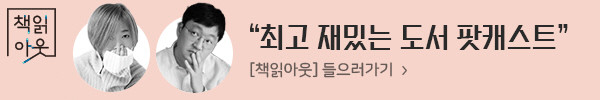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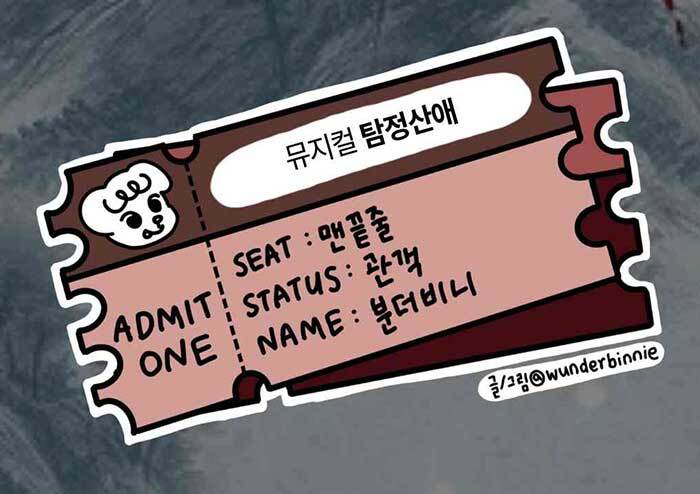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3e264992.jpg)
![[젊은 작가 특집] 장진영 “글을 쓰면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3a5c6c82.jpg)
![[젊은 작가 특집] 고선경 “인공지능과 연애하는 인물을 그려 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c4941e46.png)
![[Read with me] 김나영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f468d2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