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오랜만. 있잖아….. 나, 아이를 잃었어. 얼마 전에 넷째 임신했었다고 말했잖아. ‘넷째’라는 이유로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을 더 많이 들어온 아이.”
앞서서 두 번의 제왕절개를 했던 터라 이번만큼은 자연분만을 해보겠다며 멀리 서울까지 브이백 출산 전문이라는 병원을 찾았던 날, 여기라면 믿고 출산해도 좋겠다 했던 날, 아이의 심장이 멎어 있더라. 임신 11주 차에 막 접어든 날이었는데.
아이는 잔뜩 웅크린 모습으로 내 뱃속에 있더라. 쿵쿵 거리는 심장 소리 대신 스스스 거리는 기계 소음만 들리는데,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 너무 놀라기도 했고 미안함과 죄책감에 주체하지 못 할 정도로 눈물이 났는데, 그 와중에도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 아이들 하원 시간은 지켜야 하잖아.
하필 그 날이 셋째 생일이었다? 생일축하 노래 부르면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왜 우냐는 아이 질문에 ‘셋째가 건강하게 자라 준 게 고마워서’라고 답하고는 눈물을 목구멍으로 꾹꾹 집어 삼켰어. 게다가 다음 날은 세 아이들과 미리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 심장이 멈춘 아이를 배 속에 넣고도 소풍을 다녀왔어. 정말이지, 슬퍼할 겨를도 없더라.
소파술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이제 내 뱃속에 아기 없어요?”였어. 회복실로 침대를 옮기던 간호사는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그제야 나는 한참을 더 울었던 것 같아.
유산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슬프겠지만, 차라리 잘 된 일일지도 모른다’고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아이 가질 생각은 하지마’라고도 하더라. ‘있는 애들이나 잘 키울 생각하라’는 조언은 빼놓지 않더라.
근데 있잖아,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넷째 임신에 대해 비난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시궁창 같았어. 그냥 다, 모든 말과 상황이 거지 같더라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 오랜만에 네가 생각났고, 그래서.한참만에 찾아 놓고 이런 얘기라서 좀 미안하긴 하다.
“ ...... 이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상처에 소금뿌린 듯 아픈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할매 같은 말 하면서 스스로 일으키면서 살게 되겠지?”
나는 친구를 붙잡고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고 꺼윽꺼윽 울었으며 속사포처럼 쏟아냈다가 다시 소나기처럼 울었다. 와중에 셋째가 자다가 울면서 깼다. 나는 서둘러 일기장을 덮었다.
그러니까, 일기야말로 나의 특별한 친구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일상이 어떻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일기에 하소연할 때도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공도 없다는 듯 한동안 펼치지 않기도 하지만, 일기는 메모로, 편지로, 낙서로 분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글로 내놓을 때만을 기다리면서.
휴지 위에 쓰든, 찢어진 종이 귀퉁이에 쓰든 언제나 손 닿는 곳에 마음을 내려 놓으면 그 것은 일기장이 되었다. 난잡하게 풀어진 글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쏟아낸 그대로. 슬퍼할 때 어설픈 위로를 건네지 않았고 기쁘거나 행복해서 난리 부루스 칠 때 질투하거나 초치지 않았다. 천하제일 루저처럼 굴 때도,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을 때에도 ‘그러는 넌 남들과 다르냐?’며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주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었다. 한껏 취해 있을 때는 그런 모습대로, 깨어 있을 때는 그런 모습대로. 돌아보면 그런 내 모습이 스스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마치 거울처럼. 나는 안전함을 느꼈다.
일기를 쓰면서 어떤 마음은 자라나고 어떤 생각은 꽃을 피운다. 시인도 되고 소설가도 된다. 자유로움, 그 자체가 된다. 그러니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나.
외롭고 힘들다고? 좋은데 자랑할 데가 없다고? 일기장을 붙들어라. 친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펼치고 쓰기만 하면 된다. 일기를 대하는 마음이 솔직하면 좋겠지만, 솔직하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고 서투르더라도 얕보지 않는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줄 뿐이다. 그리고 차곡차곡 나의 이야기를 쌓아 기억해주고 때로는 잊거나 새겨지게 도와줄 것이다.
누구나 사귈 수 있지만 아무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편히 손 내밀어 보길.
그야말로 특별한 친구니까, 일기는.
나는 오늘도 일기를 쓴다.
* 나도, 에세이스트 공모전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주희(나도, 에세이스트)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나도, 에세이스트] 11월 우수상 - 내 사랑 묵향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7/9/a/879a7d00851c035185d14d81567d9044.jpg)
![[나도, 에세이스트] 10월 대상 - 그해 겨울, 짭짤했던 정직의 맛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7/6/c/a76c4e191a6babd7e930f8f740b53acd.jpg)
![[나도, 에세이스트] 10월 우수상 -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9/d/d/99ddf5835db232472ee062dbca704e5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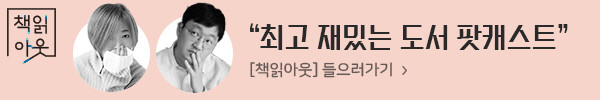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서울의 공원과 고스트 월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2-2c09f7ab.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잘 가 2024년, 어서 와 2025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7-077b2057.jpg)


봄봄봄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