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집 『글라스드 아이즈』로 독자를 만났던 이제재 시인이 네덜란드에서의 일상을 에세이로 전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시인은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며 ‘내’가 변화하는 순간들을 관찰합니다. 짧은 소설처럼 흘러가는 이 에세이는 격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

틸뷔르흐에 도착한 지 두 달이 지나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이제재의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그의 집에서 LocHal 도서관까지는 자전거로 7분 거리였고,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면 앞뒤로 달려오는 자전거들 사이에서 흐름을 따라가야 했기에, 그는 무엇을 찍는 일 없이 카메라 무게를 목으로 느끼며 거리를 지나쳐야 했다. 이제재의, 할부가 아직 21개월 남은 카메라에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내부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하고 그가 느낀 것은 방금 막 마감한 그의 시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였다. 마감을 했다는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이번 시에서 도서관이 등장했다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몇 주 전 마감한 시에도 도서관이 등장했다는 사실, 핸드폰 메모장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잔뜩 적혀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그였다면 이런 생활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도서관 근처에서만 살면 살 만하겠다고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열여덟 이후로 그는 진주, 광주, 서울에서 도서관 혹은 독서실을 거점으로 삼아 생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입고 다니는 외투도 달라지는 일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그를 유심히 보았다면 저 사람은 항상 같은 차림새를 하고 매일 같은 곳을 드나드네, 하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그는 지금 그가 입고 있는 회색 패딩을 몇 번이나 버리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리며 솔기가 뜯어진 소매께를 보았다. 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멀리 오면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가 오랫동안 시 앞에서 겪었던 그의 무기력을 떠올리고 있었을 때 도서관 직원이 다가와 곧 도서관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자연스레 이곳 사람들처럼 미소로 답했다. 그러고 보면 그는 늘 자리 잡았던 2층이 아니라 0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의 친구는 최근에 그가 쓴 글에서 힘이 빠진 것 같다는 코멘트를 달아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강박적인 면모가 줄어든 것 같아.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그의 가방 속에 있던 그의 시집을 꺼내어 가장 가까운 책장의, 잘 안 보이는 쪽에 꽂아두었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로맨스 소설 코너였다.

2022년 2월 20일
그의 시집이 도서관 책장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은 삼 일 뒤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와 있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 회색 코트의 차림새였다. 그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그가 벌써 이 도시에 익숙해져 감흥이 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돌이켜보기에 그는, 낯선 도시에서 그만의 규칙을 만들어 하루빨리 이곳을 일상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지난 두 달을 지냈던 듯했다. 도서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스스로의 몸과 몸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을 그제야 그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낯섦을 경험할 사이도 없이 너무 일찍 시간을 버려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그가 낯선 카메라를 눈에 대고 다시 낯선 시간을 벌어보려 한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오후 다섯 시의 해는 고개를 삼십 도 정도만 들어도 시야가 번질 만큼 낮게 떠 있었다. 산이 없어서 이곳의 해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림자가 진 곳과 아닌 곳의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사물의 윤곽선이 명료했다. 그가 거리를 걸어 다니며 영상을 찍는 시간 동안 그림자의 길이는 끝을 모르고 길어지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유럽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이분법적 사고가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그는 십초 남짓의 영상들을 찍고 있었다. 그의 집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만난 성당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국과는 다르게 전깃줄이 하늘을 가르지 않아 트여 있는 풍경을 보다 성당의 꼭대기를 마주 보는 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영상을 찍고 보니 그것은 장식처럼 누군가 매달아 놓은 두어 개의 CD였다. 몇 번이나 그것을 잘 담아보려고 구도를 바꾸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그쪽을 바라보니 캡 모자를 거꾸로 쓴 청년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자세를 잡고 자기를 찍으라는 듯 웃고 있었고 그는 그 청년을 찍고 나서 그가 찍은 것이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집과 집 사이 선명하게 짙은 그림자로 영역을 점거한 나무 그림자를 찍고, 마트의 카트가 뜬금 없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찍고,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시청과 시청 위에 자리한 세 개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찍었다. 깃발 셋 중 하나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국기였고, 다른 하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프라이드 깃발이었다. 그는 영상을 찍다 말고 문득 자신이 저 무지개색 프라이드 깃발에 무감할 만큼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할 만큼 자주 보인다는 것.
그는 이미 이 도시 중심가에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집과 집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프라이드 깃발로 장식해놓은 집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작년 여름, 이곳에 들렀을 때 시를 대표하는 축제 내내 상점 거리 위로 만국기처럼 무지개색 천들은 쭉 널려져 있었고 그 거리에서 그는 동성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가 거점으로 삼은 도서관에서도 동성 커플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종종 눈에 띄었고 0층 책장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LGBTQ 책 전시대가 프라이드 깃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코너는 어린이책 코너에서 멀지 않았다.
특별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되다니. 그는 시청 근처에 만개한 분홍 목련에 더 반가움을 느끼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끼며 중심가 쪽으로 걸어갔다. 빛과 어둠 사이에 걸쳐진 자전거를 찍고 어떤 집 벽면에 그려진 벽화를 찍었다. 시인처럼 보일 만큼 지쳐 보이는 동상을 찍었고 공원 속에서 이제는 십오 도만 고개를 들어도 될 만큼 가까워진 해를 찍었다. 그가 그의 집이 있는 건물로 돌아보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두 시간 반이 흘러 있었고 하늘이 푸르러지는 가운데서도 햇빛은 선명하게 긴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022년 2월 27일
오늘은 저 패딩을 버리자, 하고 그는 마음을 먹고 일어섰다. 패딩을 어깨에 멘 채 그의 집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건물 출입문을 열고 쓰레기통까지 걸어간 다음 패딩을 쓰레기통 안에 넣고 오는 일. 그에게 그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날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돌아올 때의 그는 패딩 무게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글라스드 아이즈
출판사 | 아침달

이제재(시인)
1993년 3월 4일생. 생년월일이 같은 아이를 두 번 만난 적 있다.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글라스드 아이즈』의 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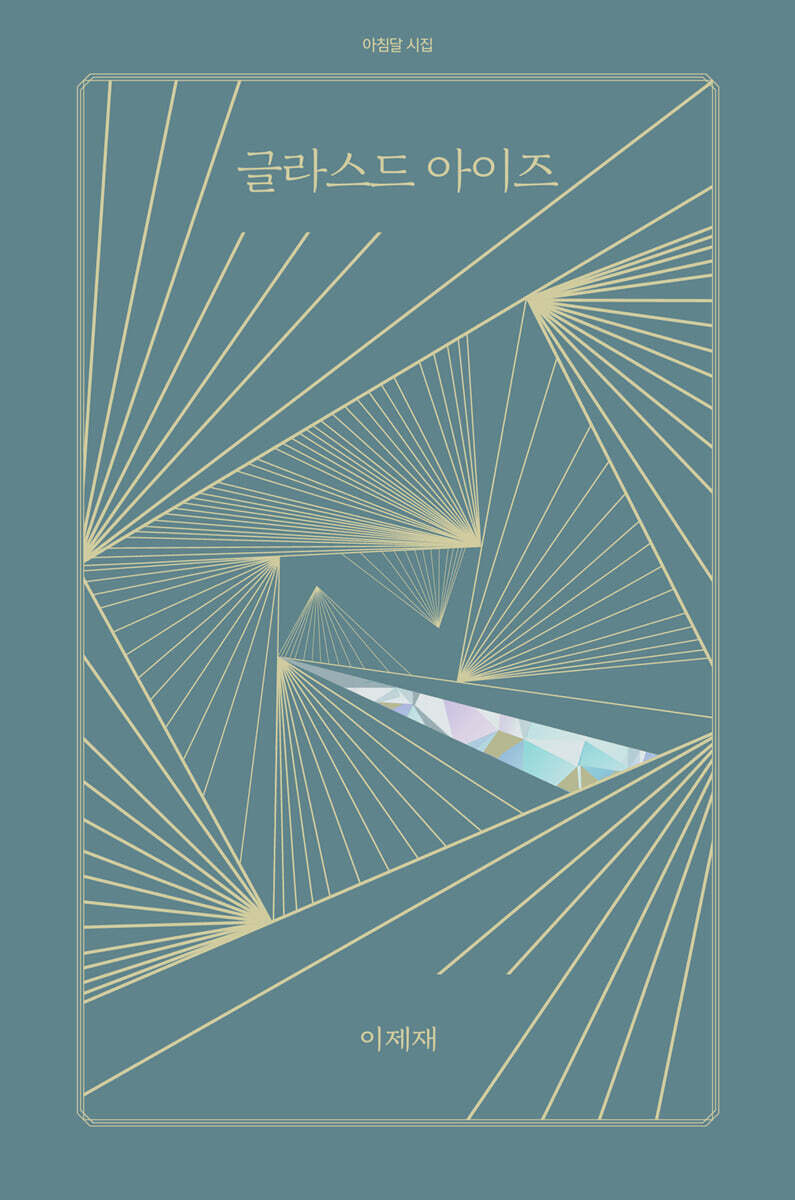
![[이제재의 네덜란드 일기] 시작하는 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1/d/f/e1df9a9a29c64890710a84f9ff8a1f47.jpg)
![[이제재의 네덜란드 일기] 여름의 거울로부터 겨울의 나무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3/4/9/d3494df50cd58c6056d047b7edfa9d57.jpg)
![[이제재의 네덜란드 일기] 어떤 각도의 선선함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0/a/4/90a464e0997149ad7877e6d8320d9357.jpg)

![[클래식] 제19회 쇼팽 콩쿠르, 젊은 거장들의 무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7-0a60ec3c.jpg)

![[김미래의 만화 절경] 더께 밑의 우리, 더께 너머의 우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30-d1bcfc3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