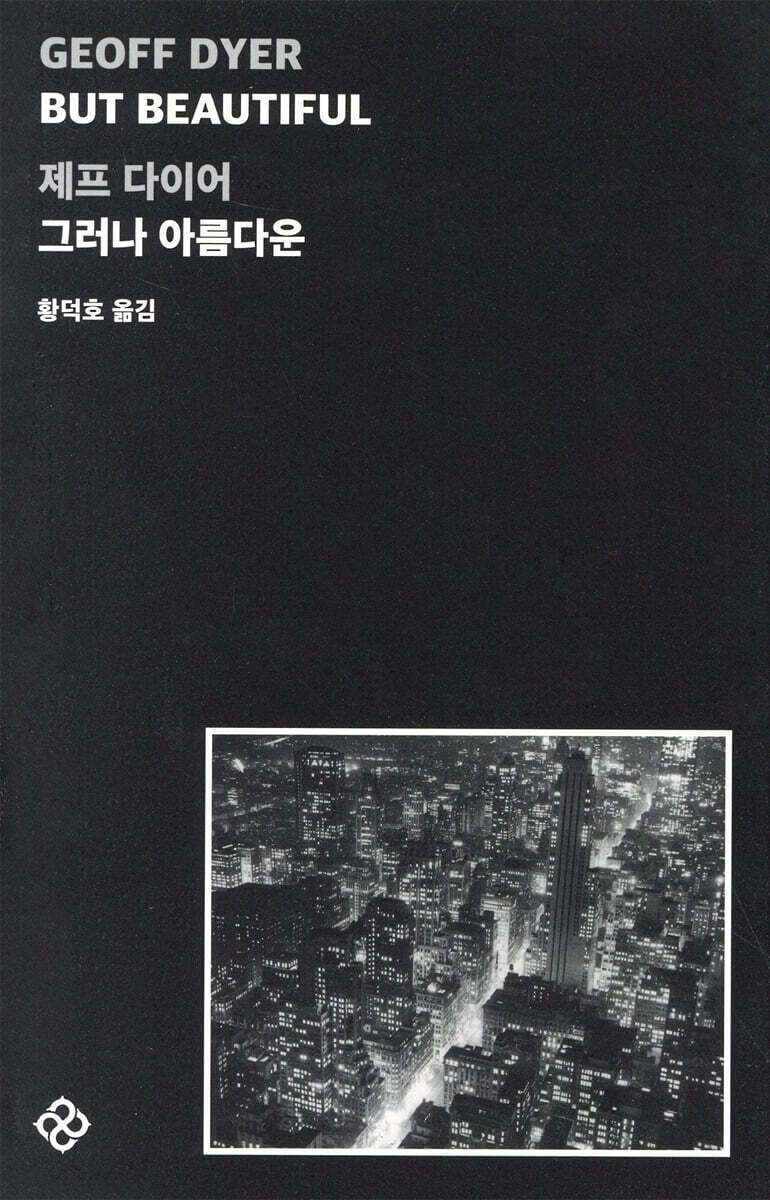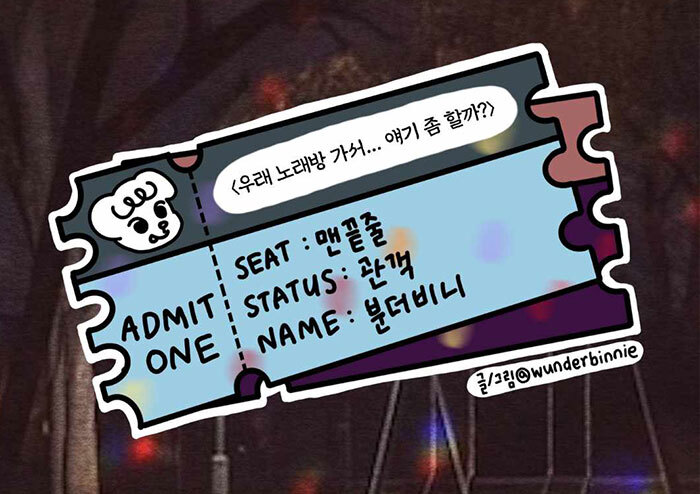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좋은 사진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리는 것마저 갖고 있다." _(14쪽)
논픽션 작가 제프 다이어는 『그러나 아름다운』의 도입부에서 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렇게 쓴다. 세 명의 재즈 음악가가 느긋하게 일상을 보내는 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 사진은 정지 상태일 뿐이지만, 작가는 그 속에서 이어지는 행동들, 소리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다음으로 이어질 재즈에 대한 그의 산문 『그러나 아름다운』에 걸맞은 말이 된다. "좋은 글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리는 것마저 갖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은 '재즈에 대한 글이지만, 그러나 재즈에 대한 글은 아닌' 글이다. 만일 이 책을 "재즈에 대한 논픽션이에요"라고 소개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재즈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요? 아니면 재즈 연주자에 대한 평전이요?" 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은 이 모든 기대를 배반하는 책이다. 제프 다이어는 마치 취미 생활을 하듯이 '재즈'라는 주제를 파고들었지만, 재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마치 좋은 재즈 연주가 그렇듯이, 그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길 원한다. 서문에서 아래와 같은 힌트를 남긴 채, 연주는 시작된다.
"오래전에 나 자신이 관습적인 비평 같은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았다. 내가 떠올린 것을 일깨웠던 은유와 직유는 음악 속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점점 부족함을 느꼈다. 더욱이, 가장 간단한 직유마저도 허구의 기미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은유는 한 편의 이야기와 장면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럼에도 동시에 이 장면들은 하나의 곡 혹은 음악가의 특별한 성격에 대한 기록이 되기를 의도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읽게 될 내용은 허구인 동시에 상상적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다." _(9쪽)
제프 다이어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무수한 비평들이 너무 지겨웠고, 글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를 지루하게 하는 그런 글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재즈가 기존의 래퍼토리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연주자의 독창적인 해석을 거쳐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듯이, 제프 다이어는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를 허문 글을 쓰기로 결심한다. 재즈 연주자들에 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작가의 상상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고 허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글.
본문 첫 페이지를 넘기면, 독자들은 군더더기 설명 없이 곧장 이런 문장을 마주한다.
"길 양쪽 들판은 밤하늘처럼 어두웠다." _(19쪽)
누구의 이야기인지, 여긴 어디인지 알 길 없이, 독자는 그저 어두운 길 위에 놓인다. 마침내 '그'라는 대명사가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그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재즈 연주자 듀크 엘링턴의 한 장면 속으로, 그의 의식 속으로 다가간다. 우리가 듀크 엘링턴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적어도 한 곡은 들어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영화의 장면들을 보듯이, 우리는 교차하는 장면들을 따라 그의 인생으로 들어간다.
그 뒤로 이어질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제프 다이어의 말을 빌리면 쓰는 사람, 읽는 사람 모두를 아주 지루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쓰고 싶다. 재즈를 잘 모르는 내가 인생에서 재즈가 들어온 순간 중 하나로 이 책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재즈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누가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재즈는 말이죠"하고 운을 뗀 뒤, 이 책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윤주
좋은 책, 좋은 사람과 만날 때 가장 즐겁습니다. diotima1016@ye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