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에서 격주 화요일 영화감독 박지완의 '다음으로 가는 마음'을 연재합니다. |
 일러스트_박은현
일러스트_박은현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불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른이 넘어 알았다.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여기 적는다는 것은 그것을 대하기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으나 어쩌겠나. 아무튼 그걸 인정하고 나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경향이 있었구나, 어떤 행동들은 그걸 달래려고 했던 이상한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았다.
아버지는 직업 상 해외 출장을 종종 가셨는데 어릴 때 트렁크가 꺼내어져 있으면 혹시 아빠가 탄 비행기가 잘못되지 않을까 무서워서 색종이를 접어서 매번 트렁크 앞주머니 구석에 몰래 넣어두곤 했다. 그러고 나면 아주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고등학교 때는 횡단보도를 몇 번의 보폭으로 건널 수 있다면 내가 알 수 없는 불운을 막을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좋아하던 애가 건너편에 있는 줄 모르고 우스꽝스럽게 뛰어 건넌 적이 있다. 그 애가 많이 놀라서 나를 바라보던 얼굴과 내 얼굴을 뒤덮은 땀이 아직 느껴진다. (미안해. 난 그냥 창피했는데 너는 무서웠을 거 같다)
불안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아주 나쁜 일들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왔고, 나는 나름의 행동을 하며 그 마음을 털어보려고 애썼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로 발버둥 쳐보는 일을 꽤 오래 해온 것이다. 좀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다. 나는 통제하고 싶어한다. 어떤 면에서 직업을 아주 찰떡같이 골랐다.
운이 좋게도 나는 첫 장편상업영화를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해외에서 1회차 촬영까지 잘 마쳤다. 편집을 하던 중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운이 나쁜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비슷한 시기에 편집했지만 아직 개봉 못한 영화들이 있다) 아무도 영화관에 오려 하지 않을 때 개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자 시사는 할 수 있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나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하하,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그렇다. 정말 몰랐다. 혹시 누가 미리 말해줬대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걸 그만둔다고 한들 이 시간 동안 길러지는 능력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고민해 봤다. 딱 하나를 찾았는데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장면이나 인물을 두고 일어나지 않은 앞뒤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는 훈련을 지겹도록 홀로 반복해 왔다. 이것 역시 혼잣말을 한다든지, 하염없이 걷는다든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 훈련은, 나의 불안을 자극하기에도 좋았다.
하루 정도의 여행을 간다고 치자. 그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작년의 그곳의 날씨를 검색한다. 날씨야말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떠올려본다. 그리하여 나의 가방과 배낭은 언제나 너무 무겁다. 비가 올 때의 나, 해가 좋을 때의 나, 조금 쌀쌀했을 때의 내가 그곳에서 잘 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다. 내 트렁크에는 여행지에서 건드려보지도 않고 가져오는 짐들이 있다.
아마 그때, 기자들은 궁금했을 것이다.
영화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십 년을 넘게 무언가가 되기 위해 준비만 할 수 있나.
나 역시 여러 번, 아니 일주일에 여덟 번쯤 해보는 질문이었다. 다행히 그만둘 결정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물론 내가 피한 것도 있지만 정말 어떤 일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새벽에 깨어 남은 돈이 얼마인지 이번 달은 잘 보낼 수 있는지 따져보는 밤도 있지만 어떤 낮에는 내가 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서울 게 없는 기분이기도 했다. 어떤 모욕적인 일을 겪어도 내가 만드는 세계 안의 누군가도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기도 하고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든 친구가 부러워서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른 적도 있다. 내 인생이 걱정되어 훌쩍이다가도 나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는 강아지가 산책 갈 시간이라 보채면 나는 또 불광천을 따라 오래 걸으며 계절이 바뀌고 각기 자기 목적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조금 전의 자기 연민이 유치하고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내 인생이 내 영화보다 크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안 되든 되든 계속 열심히 살아야지, 하며 결국 뭐가 되려고 버틴 것은 아니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자주 본다. 거기 종종 등장하는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좋아서 본다. 범인을 아는 제보자의 전화 목소리만 가지고 있던 형사가 3년이 넘게 경찰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결국 그 제보자의 존재를 찾은 이야기라던가 20년 전 자신이 놓친 범인을 찾기 위해 용의선상에 오른 15000명의 dna를 구하겠다고,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으니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하는 형사의 얼굴을 좋아한다.
내가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계속 쓰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
나는 주로 썼다.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오늘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적었다. 훌륭하고 완결된 글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냥 수첩을 하나 사서 생각나는 것들을 적고 일기장이라고 하나 마련해서는 오늘 뭐 먹었는지 누구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는지, 빌려온 어떤 책이 나를 놀라게 했는지를 적었다. 남이 보면 창피한, 쓸데없는 얘기가 대부분이라 만년필로 적었다. 여차하면 물에 담가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느끼는 불안과 무력함,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 그 사이사이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 먹어 치운 것, 누군가와 나눈 것들로 그 시간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이 또 그리 예전과 대단히 다른가 하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음 작품이 정해졌냐고 물으면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러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사실은 점점 더 확실해져가고 내가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래도 한번은 만들었으니까 또 더 잘 만들어볼 수 있겠지 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쓰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불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의 불안과 동반한 광기를 인정하게 되었다. 다만 그것을 받쳐줄 체력이 필요할 뿐.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내 이름을 걸고 나의 불안에 대한 글을 부끄러워하며 적고 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 나의 불안은 조금 작아지고, 이제는 수첩에 끄적인 메모가 아니라 조금은 다듬어진 글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계속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지완(영화감독)
단편 영화 <여고생이다>, 장편 영화 <내가 죽던 날>을 만들었다.

박은현(일러스트)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끔찍하게 행복한 라짜로, 아니 너와 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f/e/e/bfeef317a0adfe15d1f2862a49cdbef8.jpg)
![[손희정의 K열 19번]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 - <풀타임>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9/3/d/693d2ec50d7e078341b975449bb9be73.jpg)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기꺼이, 행복한 우리들의 붕괴의 시간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5/1/5/d515c40c412961ea1e516d84a59e4d9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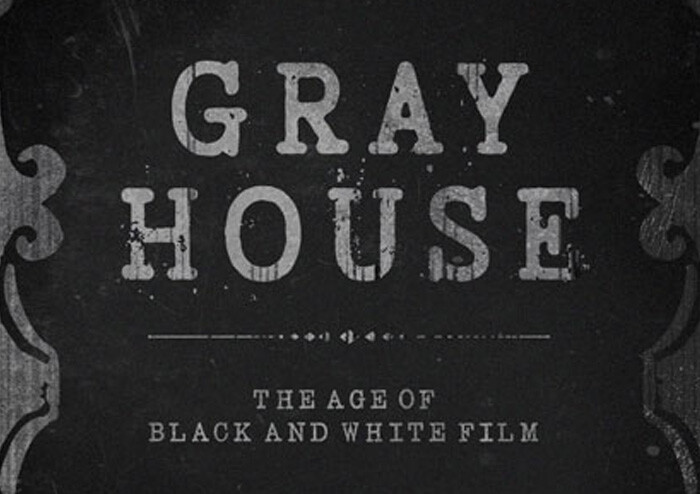





Aslan
2022.11.20
soulman80
2022.10.06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