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를 그리기>(2014), 캔버스에 유화, 73*91
내가 만난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보였고 공감 능력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두뇌가 만들어낸 외계인과 하느님의 계시적인 삶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와 만나서 나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기회가 생기니 공감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남자가 정신 병원의 복도를 지나가는 나를 다급하게 붙들었다. 나도 급하게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급해 보여 붙잡히고 말았다. 그 사람의 말투가 마치 지구가 끝나기 직전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뚝뚝 떨어지는 말투라 듣는 나도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 CIA가 밖에 와 있어?
나: 아니요. 왜요?
그: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이듯이) CIA가 쫓아오고 있어. 이 건물 바깥쯤 왔을 거야. 언제 들어닥칠지 몰라. 나를 죽이려고 해.
나: (헉, 하고 놀라며) 왜 아저씨를 죽이려고 해요?
그: 그건…… (말을 잠시 멈추고 내 눈을 또렷이 쳐다본다. 마치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하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나: (조심스럽게) 어떤 정보인데요?
그: 종이하고 펜 있지?
나: 네. 여기요.(팔에 끼고 있던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꺼낸다.)
그: (손으로 바닥에 앉으라는 제스처를 하며) 받아 적어. 그리고 CIA가 나를 죽이면, 이 정보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처리해야 해. 알았지?
나: 앗, 네.(복도 바닥에 앉아서 종이와 크레용을 차려놓는다.)
그: (옆에 구부리고 앉아서는 더 낮고 꾹꾹 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약속해야 해. 알았지?
나: 아, 네.
그: (한 마디 한 마디 꾹꾹 누르듯 말한다.)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나: …… (열심히 적다가 올려다본다. 혹시 이건 내가 아는 거?)
그: (숫자들을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보더니) 다음 줄. ABCDEF…… 아냐, 아냐. 더 크게 적어. 그렇지, 그렇게.
나: (불러주는 암호를 행여 잘못 받아 적을까봐 하나하나 따라 부르면서 쓰는데 갑자기 기침이 난다.) 콜록콜록 코올록 켁켁쿡쿡!
그: (그러자 그의 표정과 말투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너무나 정상적인 목소리로 묻는다.) 아가씨, 괜찮아? 기침 많이 하네. 감기 조심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 오늘 일찍 퇴근하고 들어가서 쉬지 그래?
이 상황의 심각성과 코믹성이 잘 전달될까 싶다. CIA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사회에서 격리하고, 심하면 약물 투여로 멍한 상태로 만들고, 그들과의 소통을 포기한다. 병원을 빠져나가려고 탈출을 시도하면 진정 주사를 놓거나 침대에 팔다리를 묶곤 한다. 사회가 소통하기를 포기한 이들이 그날 하루 종일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을 내게 건넸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사이코 호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을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가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아줌마는 너무 심했다. 꿈에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였다. 흐트러진 머리에 썩어서 까매진 이빨, 일그러진 표정, 계속 뜨고 있어서 핏줄마저 서 있는 눈. 그런데 그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에게 보인다는 환각과 환청의 내용이다. 나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앞에 누가 살해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피가 튄다, 저~기~ 봐라~(떨리는 목소리로 내 바로 옆 벽을 손가락질하며) 피가 튀어 있다 하는 호러 스토리 때문에 등골이 오싹오싹했다.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간신히 상담을 하다가 옆에 둔 뜨거운 커피를 내 손등에 쏟았다. 긴장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 너무 뜨겁고 놀라서 “악!”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 아줌마, 우리 사이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살인 장면에서 눈을 떼 데인 내 손등을 살짝 만지며 물었다. “아가씨, 괜찮아? 조심해야지. 뜨거웠겠네.” 내가 헛것을 들었나 하고 놀라서 얼굴 표정을 살피니 주름진 눈매와 핏줄 선 눈망울이 나를 부드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정신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불평은 자신의 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병이나 가난이나 살 집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했다. 치료를 더 잘 받았으면, 더 좋은 약물이나 더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하는 게 아니고, 애인이 있었으면, 가족이 있었으면, 친구가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또 그 한 명이 하루라도 문병을 왔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환자이기 전에, 정신병자이기 훨씬 전에 나와 같이 외로워하는 인간이다. 공감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공감에 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것이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이론과 입장에서 본 이 꼬인 이야기를 풀려고 하다 보니,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이란 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고 무척이나 귀한 것이구나 싶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주위 자폐 아동의 이야기이고, 우리 사회와 격리된 정신 병원의 환자들 이야기이기도 하다.
프랭크 벌토식Frank Vertosick이라는 암 전문 의사가 쓴 『우리는 왜 아픈가: 고통의 자연 역사Why we hurt: the National History of Pain』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고통의 역할과 필연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고통은 종족 유지와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는 것이다. 죽어가는 암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이 책의 저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매달리는 환자들을 보면서, 과연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신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지, 이러한 고통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아픈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즉 공감을 위해서 있는 장치가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 신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공감하기를 바라셨는지 모르는데,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우울증이 퍼지고 자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공감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돌아온 뒤 한동안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수업 시간에 한 학급씩 집단 미술 치료를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집단적인 공감 결여였다. 누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억울해서 우는데, 화가 나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아무 반응도 없는 것에 놀랐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 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거나 안으로 움츠러드는데, 그것이 당사자가 아니면 못 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시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곤 했다.
또 겉으로도 안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잔잔히 들어주다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공감이 결여된 사회에 사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증거가 있을까 싶다. 공감이 사라지는 세상을 생각하니 침울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공감 못하는 인간으로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공감으로, 친절함으로 만나준 자폐를 가진 아이들과 정신병을 가진 아줌마 아저씨 들을 생각하니 공감은 인간 본성이며, 없앨 수 없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추천 기사]
- 자폐증 아동은 정말 공감을 못 할까
-시카고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가 모이는 병원
- 프랑스의 문제적 소설가 마리 다리외세크 방한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완간

정은혜
미술 치료사이며 화가다. 캐나다에서 회화와 미술사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뉴미디어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의 기획자로 일하다, 자신이 바라던 삶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소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도울 때 기뻐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 치료 공부를 시작했다. 미국의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미술 치료 석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의 정신 병원과 청소년치료센터에서 미술 치료사로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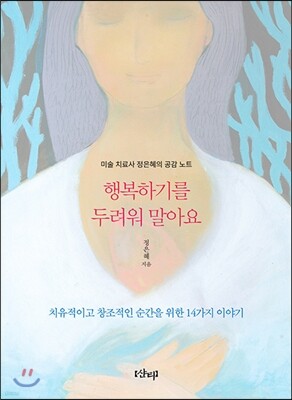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더뮤지컬] 홍성원,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 위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4121a0c0.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함께라서 더 행복한 봄의 한복판에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2a252fb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