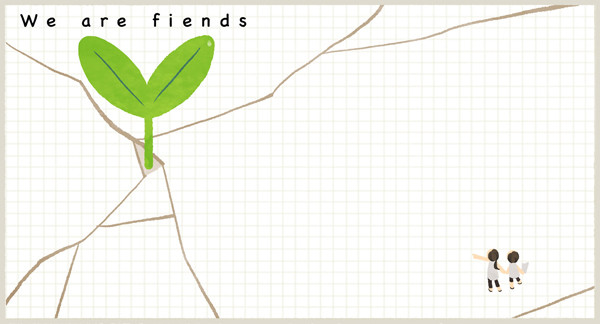
갈수록 학교 폭력이 심해집니다. 사회문제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왕따) 때문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건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연대’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벌이는 것일까요? 물론 누구나 마음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에게 폭력(여기서 말하는 폭력이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을 행사할 권리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라는 낱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나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필요’에 따라 그런 폭력에 가담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은 외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고 싶어집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아마도 집단 따돌림이 본격화되는 것은 학기 초가 아닐까 싶어요. 새롭게 반이 편성됩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런 힘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재빨리 학급의 친구들 가운데 힘이 약해 보이는 아이를 찾아냅니다. 흔히 ‘간 본다’고 하지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못할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찌검 등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
 |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내게 알아서 기어’ 뭐 이런 의도겠지요. 야비한 일입니다. 나와 비슷한 친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친구를 골라 못살게 굴어서 힘을 과시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나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지만 그건 속으로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나서서 힘없는 불쌍한 친구 편에서 싸우거나 못살게 구는 친구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 내가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굳이 내가 개입해서 일부러 힘든 일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요. 둘째,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불리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못된 친구를 비난합니다. 물론 속으로 말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는 주장에 따르면 누구나 악행을 보았을 때 분노하고 비판합니다. 그럼 마땅히 선의 입장에 서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 괴리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무엇보다 내가 판단하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갈등은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누구나 어떤 나쁜 일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속으로(속으로만!) 욕합니다. 그건 본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위안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속으로 뱉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분노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나는 저 나쁜 놈보다 아주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느껴요. 행동은 전혀 못 하면서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이나 자책감을 속으로 하는 분노와 비난으로 덮고 싶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교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방관자지요. 내 일은 아니니까 굳이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묘한 상태로 지속되고 그 긴장이 불편합니다.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요? 걸핏하면 매 맞고 욕 얻어먹는 약자인 친구 편에 설까요?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당하고 비참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힘센 친구 옆에 붙어서 “난 얘 편이야”라고 말하기는 좀 남세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보니 힘센 친구에게 맞는 약자인 친구가 뭔가 이상하거나 부족하다는 걸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체육 선생님이 벌로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했다고 칩시다. 그 친구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 여기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어쩌면 그 친구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기 초에 아직 체육복을 구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수업이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질문을 해서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 등 말입니다. 온갖 핑계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 친구에 대한 동정심이나 측은함을 거둬들이는 거지요.
자, 이제 상황 판단이 끝났습니다. 수모와 멸시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친구에게 나도 슬쩍 시비를 걸어 봅니다. 그 일을 당한 약자 친구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면 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어쨌거나 처음에는 다행히(?) 나의 시도가 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 자신을 정당화해야 할까요?
어떤 빌미건 내가 그 약자인 친구를 비난할 핑계를 찾아냅니다. 동작이 굼떠서 단체 행동할 때 불편을 끼친다거나, 농담을 알아듣지 못해서 썰렁하게 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군것질할 때 뺀다거나 등등 온갖 핑계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툭 치거나 욕했던 건 못된 짓이 아니라 응징 혹은 교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약자인 친구에게 물리적 혹은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힘센 아이가 그 친구를 못살게 굴 때 속으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창하게 말하자면 ‘자아의 분열’입니다. 동일한 사건 혹은 사태에 대해 비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가 진짜 나일까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약자인 친구에게 한 짓은 폭력이 아니라 응징 혹은 교도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내 편리에 따라 나를 정당화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그걸 바로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인지 부조화란 두 가지 모순되는 심리 인지 요소를 가질 때 나타나는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불일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생각을 바꿔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일관되지 않은 자신의 심리나 인지 상태를 유리한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리화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집단 따돌림에서 방관자였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러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마비됩니다. 왜 우리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나요?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항구조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작 심각한 문제는 중간을 차지하는 다수의 방관자들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하면서 자신들은 도덕적이라고 치장하고 나중에는 학대에 가세하면서 응징하거나 교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이중적 잣대는 ‘건강한 중간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청소년들은 곧 어른의 세대로 편입될 것인데 이렇게 인지 부조화에 빠진 이들이, 정의와 불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을 정당화하는 데에 익숙한 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학교 폭력 혹은 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마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김경집 저 | 샘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의의 문제부터 함께 짚어보고, 동서양의 시대별, 인물별 정의에 관한 생각과 이론을 살펴본 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연대의 마음가짐과 실행 방법 등을 고민해본다.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출판사 | 샘터

김경집(인문학자)
가톨릭대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과 영성 과정을 가르쳤다. 인문학을 대중과 나누는 일과 문화운동에 뜻을 두고 있으며, 거대담론보다는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 저서로 《책탐》《생각의 인프라에 투자하라》《고장난 저울》《완보완심》《인문학은 밥이다》《생각의 융합》《엄마 인문학》 등이 있다.









![[김해인의 만화절경] 절박한 사랑의 고백, 입시만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3-ae1a35af.jpg)
![[만리포X이희주] 우미의 아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5-fcd07cdc.png)
![[예스24 리뷰] 교도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맨얼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3-6cda3d37.jpg)
![[리뷰] “어린이, 안녕하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b5cf6e87.jpg)
![[리뷰]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림자 보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6-538b561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