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이 되면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조선시대에는 환경오염에서 기인한 오늘날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은 덜했을 테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특성상 장마가 끝나고 찾아오는 한여름 무더위의 화끈함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에어컨도, 선풍기나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단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하기만 하다.
먼저, 냉장고는 없어도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고 때로는 얼려주는 냉장고 구실을 해줄 것들은 있었다. 시원한 계곡물을 이용해 더위를 잊게 해줄 음식을 넣어두고 먹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이긴 해도 한여름에 얼음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지만 일부에겐 허락되었다. 바로‘빙고’라 불리던 얼음 창고덕분이었다. 조선시대 전국각지에 크고 작은 빙고가 있었다 하지만 한양에 있는 것과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조선시대에 한양 서쪽에 위치한 얼음 창고가 있던 곳을 서빙고[西氷庫]라 부르던 것이 그대로 전해지며 서빙고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주 석빙고 모습(좌)와 석빙고 내부(우)
서빙고는 얼음 창고를 일컬음과 동시에 얼음을 채취하고 보관하고 출납하는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자리에는 한강 동북쪽에 위치한 얼음 창고인 동빙고[東氷庫]가 있었고, 창덕궁 안에는 내빙고[內氷庫]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다.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이 얼음 창고들을 마련했는데 이중에서도 서빙고의 규모는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8개의 저장고를 갖추고 동빙고의 12배, 내빙고의 3배가 넘는 양을 저장할 수 있었으며 얼음 저장과 시설 관리에만 연간 쌀 1,000여 석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얼음은 한강이 4치 두께 이상으로 얼어붙는 음력 12월부터 저장을 시작해서 해를 넘겨 음력 3월 이후가 되면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에는 반빙[頒氷]이나 사빙[賜氷]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6월부터 가을이 시작되어 선선한 기운이 본격화되는 입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라에서 관청이나 벼슬아치들에게 얼음을 하사하는 것이었다. 이는 더위를 이기고 국가 업무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때로는 상을 당한 관리나 공로가 많은데 퇴임을 하게 된 관리에게 따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왕실에 행사가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중요한 외교적 인물이 방문하는 경우에 얼음으로 대접을 하기도 했다.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대비의 생일날 얼음을 깔아놓은 쟁반에 포도를 올려 시원하게 먹으며 그 맛에 감탄한 연산군이 시까지 지었던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더불어 연산군은 바로 이 생일잔치에서 얼음이 귀했던 당시로서는 사치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연회장 사방에 천 근이나 되는 거대한 구리 놋쇠 쟁반을 만들고 그 위에 얼음을 가득 올려 오늘날 에어컨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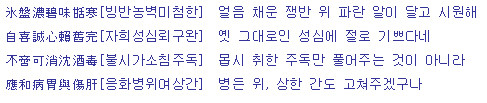
사치품을 넘어, 환자와 죄수를 위해 지급되었던 얼음
하지만 조선시대의 얼음은 단순한 사치품으로 권력가인 왕이나 사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약한 백성들을 위하는 위민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했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왕조의 근간을 이룬다고 평가받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보면 여름철 마지막 달(음력 6월)에 관리들 외에도 얼음을 지급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는데, 그들은 조선에서도 가장 어렵고 약한 환자와 죄수들이었다.
실제로 동빙고가 국가 차원의 제사에 주로 사용될 얼음을 저장한 곳이고, 내빙고가 궁에서 쓸 전용 얼음을 저장한 데 비해, 서빙고는 문무백관이나 환자나 죄수들에게 줄 얼음까지도 저장한 곳으로 용도에 따라 얼음 보관소에도 차이가 있었다. 성종실록에 보면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 있는데 ‘약’으로 구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이 날 것이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내 그 죄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약으로 구료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하라”고 명한 기록이 보인다.
빈민을 구제하고 치료를 맡아보는 ‘활인서’에서 맡아보는 병든 자들과 심지어 죄수를 관장하는 ‘전옥서’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에게도 경국대전이 정한 바에 따라 얼음이 지급된 것은 전근대사회라고 하면 복지와는 거리가 먼 시대라는 선입견부터 갖는 우리에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팥, 우유, 시럽 등을 함께 섞은 빙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을까? 문헌에 조선시대에 서빙고를 지키는 관원들에게 얼음을 주었더니 잘게 부수어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만 본격적으로 팥이 들어간 빙수가 만들어진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단팥을 얹어 먹는 일본의 음식들이 전해지면서 손수레에 얼음덩어리를 싣고 다니다가 고객이 돈을 내면 얼음을 깎아 담은 그릇에 설탕 한 숟가락과 빨갛고 노란 색깔의 단물을 뿌리거나 팥을 얹어 팔았다고 하니 조선시대 조상님들은 오늘날과 같은 팥빙수는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장미 화채 : 조선시대의 『진작의궤』등 조리서에는 화채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중 장미 화채를 “장미꽃송이를 따서 각각 흩어 물에 깨끗이 씻고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살짝 삶아 건져내고 냉수에 다시 씻어 오미자국에 꿀을 넣고 잘 흩어 쓰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위를 이겨내는 데 얼음만한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듯이 뜨끈한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여름철에 원기를 북돋는 지혜는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전매특허 같은 것이 아니던가! 이 뛰어난 지혜는 이어지는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반주원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했다. 외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국사 및 통합사회 강사로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비상에듀 등의 유명 대형 학원과 EBS 등에서 두루 강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전국 최고 사탐 강사 5인(입시타임즈 선정)에 뽑히는 등 수능 영역에서는 10년 이상 최고의 사회과 스타 강사로 입지를 굳혔다. 이후 공무원 한국사 영역으로 강의 영역을 확장했으며, 현재는 TV 프로그램 ‘황금알’에 한국사 전문가로 출연 중이다. 『반주원 한국사』 시리즈, 『반주원의 국사 교과서 새로보기』, 『유물유적 한국사 1』 외 다수의 저서를 편찬·집필하였다.









![[요즘 독서 생활 탐구] 푸더바, 마이너한 소재를 메이저하게 소개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4-111fa4d7.jpg)
![[더뮤지컬] 가면 쓰고 무도회 속으로…이머시브 공연으로 재탄생한 <오페라의 유령>](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8-604b52d3.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집 사랑꾼을 위한 여름 바캉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c9b8f183.jpg)
![[예스24 리뷰] ‘미친 매지’에서 연쇄살인마까지, 여성의 괴물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2-fe92630f.jpg)
![[클래식] 연말에는 이 음악 어떠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31-696de8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