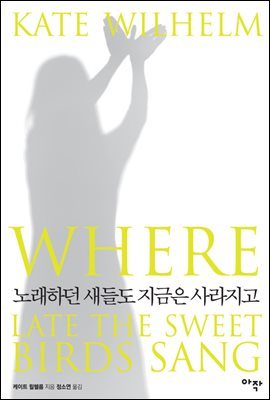 |
 |
케이트 윌헬름의 『노래하던 새들도 지금은 사라지고』를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한다. 벌써 십삼 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SF를 닥치는 대로 찾아 읽고 있었다.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던 중에 케이트 윌헬름의 이 책을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달리 추천을 받아 읽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케이트 윌헬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소설이 얼마나 고전인지 잘 몰랐다. 나에게 20세기에 쓰인 모든 소설은 이미 옛 이야기였다. 스무 살은, 어쩐지 그런 나이다.
이처럼 이 책을 만나 어떻게 첫 장을 펼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감상은 지금도 선명하다. 가슴을 에는 슬픔과 그 슬픔을 감싸는 아름다움. 어떤 다정함. 울었던가? 아마 울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슬픔이었고, 아름다움이었다. 좋은 소설은 독자를 변화시킨다. 독자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과 감정과 통찰을 보여준다.『노래하던 새들도 지금은 사라지고』는 그런 책이었고,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꼈다. 다른 작가를 굳이 끌어와 말하자면 어슐러 K. 르 귄 보다 조금 더 낭만적인, 낸시 크레스보다 조금 더 다정한, 조안나 러스보다 조금 더 조용한, 옥타비아 버틀러보다 조금 더 온화한 슬픔과 아름다움.
어슐러 르 귄보다 조금 더 낭만적인
이 새로운 감정을 다른 독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이 책을 옮겼다. 나는 이 책의 맨 처음 한국인 독자는 아마 아니겠지만, 내가 번역했으니 한국어판의 맨 처음 독자이긴 한 셈이다.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따 온 구절인 원제 한 줄을 가장 아름답게 번역하고 싶어 서점의 셰익스피어 번역본을 모두 뒤졌다. 한국어 사전을 읽고 또 읽었다(어디에서 좋은 단어가 나올지 모르니 여러 우리말 사전을 통째로 계속 읽었다). 아, 내가 이 책을 번역하느라 애썼다는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 책 한국어판의 맨 처음 독자인 번역자에게, 『노래하던 새들도 지금은 사라지고』는 그만큼 경건한 작품이었다는 말이다.
이 책은 한국에 소개된 케이트 윌헬름의 첫 작품이자 유일한 번역서이기도 하다. 케이트 윌헬름이 적지 않은 작품을 썼고 진작에 SF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상을 많이 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딴 상까지 있는 장르의 거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다. 많은 여성 작가들처럼 케이트 윌헬름도 활동을 늦게 시작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글자당 몇 센트의 푼돈을 받는 지면에 습작을 짬짬이 냈고, 겨우 글을 팔기 시작하고서도 수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작품 세계를 형성했다. 케이트 윌헬름은 첫 작품이 어스시 시리즈였던 어슐러 르 귄 같은 준비된 작가가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적성에 맞지 않는 전화교환원이나 판매원 일을 하던, 겨우 열아홉에 결혼하여 아들을 둘 낳고 일상에 분투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거의 읽히지 않는) 윌헬름의 1950년대 작품들을 보면 그런 ‘평범한 작가 지망생’이자 ‘전형적인 장르 문법을 따르는 신인 작가’의 설익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글을 계속 썼고, 아마도 계속 읽었다.

우주를 향해 흐르는 긴 강
그리고 1976년에 발표한 이 작품, 『노래하던 새들도 지금은 사라지고』는 더 말을 보탤 것 없는 케이트 윌헬름의 대표작이자 작가의 작품세계의 완성형이다. 케이트 윌헬름이 이 소설에서 인류 멸망이라는 흔한(게다가 당시 과학소설계의 유행이었던) 소재를 다룬 방식은 참으로 놀랍다. 긴 시간 선을 강물처럼 부드럽게 달리는 이야기, 강을 따라 흐르며 만나는 돌멩이며 수풀 앞에서 숨을 고르듯 각 세대를 들여다보는 시선. 이 소설은 우주를 향해 흐르는 긴 강처럼 느리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독자를 빈틈없이 감싼다. 강을 따라 생긴 숲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같은 인간들, 그 숲에서 들리는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 같은 대화, 햇살을 받아 작게 반짝이는 물결 같은 문장, 긴 강 같은 이야기. 이런 아름다움을 과학소설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랴. 케이트 윌헬름이 글을 쓰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만든 덕분에 생겨난 이 아름다움 앞에서 ‘맨 처음 독자’로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강바람 앞에서 옷을 여미듯 이 책 앞에 섰다. 독자들도 이 바람을 느낄 수 있기를, 강이 흐르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물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1976년부터 지금까지, 내일을 향해 흐르고 있는 이 소설이라는 강을 들여다보고 오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노래하던 새들도 지금은 사라지고케이트 윌헬름 저/정소연 역 | 아작(디자인콤마)
1976년에도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웠던 부분은 작가가 생태계의 붕괴를 그려내는 모습이었다. 4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작가가 그린 세계 종말 시나리오는 유효하며, 인류 최후의 생존 방식은 마치 [사이언스] 저널 최신호만큼이나 생생하게 다가온다

정소연(번역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2005년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에서 스토리를 맡은 만화 <우주류>로 가작을 수상하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소설 창작과 번역을 병행해왔다. 2015년 소설집 『옆집의 영희 씨』를 출간했고, 『허공에서 춤추다』와 많은 책을 옮겼으며 연구서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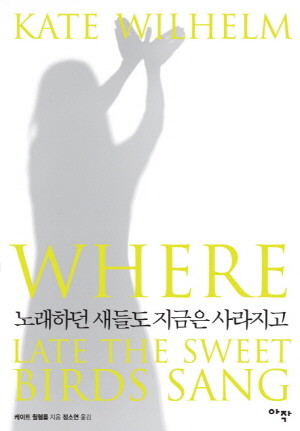



![[인터뷰] 김초엽 “인간의 쓸모 없음이 인간의 고유성 아닐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4-5ad1a15b.jpg)
![[구구X리타] 영원이라는 불가능에 도달하기 – 내가 글을 쓰는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8-27b9652d.jpg)
![[리뷰] 월요일 아침만큼이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셜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1-ff06f741.jpg)
![[리뷰] “세속적이다. 하지만 아름답구나”](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4-9e05911c.png)
![[큐레이션] 봄이 이끄는 방향으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1-144c5c7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