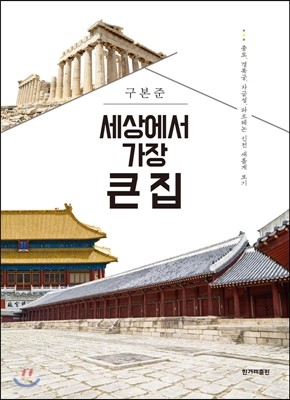 |
 |
구름에 닿을 듯이 높은 빌딩과 들판처럼 드넓은 건물 앞에서는 어김없이, 입이 쩍 벌어진다. 정교함과는 별개로 크기는 사람을 압도한다.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참을 올려 보고, 한참을 내다 보다가 감탄의 타이밍을 놓쳐 버리기 일쑤. 순식간에 오르는 전율 앞에서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주위를 따라 걸으면서, 그리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한 가운데 바로 서서 느꼈던 형용할 수 없는 벅참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좋은 건물이든 나쁜 건물이든 모든 건물은 짓고 나면 최소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특별한 건축물에는 동서고금을 떠나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크기’다. 각 시대의 중요 건축물 거의 대부분은 길게 지어졌는데, 높은 건축이 건물 활용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라 ‘길고 넓게’ 지으며 크기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길게 지으면 자연스럽게 ‘기둥’도 많아진다. 건물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늘어난 것뿐인데, 의도치 않게 줄지어 세워둔 기둥이 어떤 디자인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위대한 건축물 몇몇만 떠올려봐도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집트 핫셉수트 장제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한국 종묘 정전 등의 기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들이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종묘 ‘정전’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는데, 종묘는 원래부터 긴 건물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길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지금은 열아홉 칸이지만 태조가 처음 지었을 때는 일곱 칸짜리였고, 왕조가 길어지면서 같이 길어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국가 최고의 신성 건축을 증축한 경우는 조선이 유일하다고 한다.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종묘 때문에 한국을 재 방문할 정도로 종묘에 매혹되었는데, “이처럼 장엄한 공간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건축은 파르테논 신전 정도뿐일 것“이라고 종묘를 극찬했다.
이어서 한국의 종묘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중국의 종묘인 ‘태묘’를 소개하고, 일본의 가장 신성한 건물인 이세 신궁이 왜 20년마다 새로 지어지는지 그 흥미로운 이유를 들려준다. 더불어 신성한 건축에서 나아가 베르사유 궁전, 자금성, 경복궁 등 가장 세속적인 건축인 궁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땅콩집 열풍을 일으켰던 『두 남자의 집짓기』를 비롯해 건축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낸 고 구본준 기자의 글을 좋아했던 독자라면 역시나 좋아할 책이다. (저자의 2주기에 맞춰 출간되어 의미가 더 깊다) 책을 다 읽고 나니 큰 감흥 없이 종묘를 방문했던 지난 날이 부끄러워졌다. 날이 따뜻해지면 새로운 마음과 눈을 가지고 종묘를 가봐야겠다. 장식 없이 단순한 모양의 지붕과 넓게 펼쳐진 마당. 절대적인 고요함과 적막감, 그 속에 충만한 오묘한 기운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
세상에서 가장 큰 집구본준 저 | 한겨레출판
구본준 기자의 2주기를 기리며 출간된 건축 에세이다. 종묘, 경복궁, 자금성, 이세 신궁 등 한중일의 대표 건축을 꼼꼼히 돌아보고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를 아우르며 인류의 유산이 된 거대 건축물을 비교 분석한 이 책은 또 한번 독자들을 건축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

최지혜
좋은 건 좋다고 꼭 말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