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의 라이브 앨범 <7102>에는 지독한 자기모멸과 고독이 뚝뚝 흐른다. 말하자면 담담하게 풀어내는 비극의 도큐멘트랄까. 첫 곡부터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달아」)라고 노래하는 가수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단출한 어쿠스틱 기타 반주 위로 조곤조곤한 보컬이 송곳처럼 아픈 노랫말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속삭이며 내뱉는다. 심연을 그대로 열어젖히는 <7102>의 가사들은 그 무심함 때문에 더 잔인하다. 신곡 열 곡과 기존 곡 두 곡으로 이루어진 이 앨범의 나긋한 호흡에 가만히 숨을 맞추면, 너무 깊어서 오히려 멀어 보이던 어떤 고통이 어느새 마음 속 깊은 곳에 들어와 박힌다.
앨범을 관통하는 주된 감정은 구원을 바랄수록 절망에 빠지는 아이러니의 정서다. 포근한 멜로디 속에 쓸쓸함이 가득한 「너무 많은 연애」에서는 ‘원하는 건 사랑뿐이었는데/누군가를 목 조르게’ 하는 사랑을, 「어떤 호텔」에서는 밝은 코드 진행 안에서 풀어낼 곳 없는 외로움을 노래한다. 그런 점에서 <7102>는 잘 가공된 고통을 내세워 듣는 이에게 위안과 치유를 제공하는 식의 앨범이 아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 ‘어둠은 끝나지도 않아/즐거운 일은 내게 없어’(「전화」)라고 읊조리는 가수를 오히려 이쪽에서 보듬어주고 싶어지는, 내면의 치열한 고독을 마주하게 하는 앨범이다. 무책임한 힐링이 넘쳐나는 오늘날, 김사월의 황량한 언어가 주는 울림이 더욱 각별하다.
직관성보단 문학성에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가사들이 조금도 난해하게 다가오지 않는 건 김사월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 특히 귀에 잘 들리는 예쁜 선율과 군살 없는 구성 덕이다. 어느 곡에도 우스꽝스런 꾸밈이나 적나라한 노림수가 없다. 「꿈꿀 수 있다면 어디라도」의 반복되는 악절은 고요한 기타 반주와 어우러져 묘한 주술에 빠져드는 느낌을 준다. 옛 정통 포크를 닮은 「설원」의 처연한 선율은 도피의 욕망을 담은 노랫말에 짙은 호소력을 보태고, 「달아」의 조밀한 멜로디는 곡이 진행되는 내내 집중력을 흐트러트리지 않으며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 준다. 「짐「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코드 구성과 리듬감이 느껴지는 보컬 멜로디가 곡을 짜임새 있게 진행시킨다.
김사월을 묵묵히 받혀주는 조력자들의 역할도 톡톡하다. 박희진의 건반 연주는 「너무 많은 연애」의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이끌며 곡의 감정을 더욱 심화하고, 「악취」에선 그로테스크한 노랫말에 맞춰 무너지는 마음을 와르르 쏟아낸다. 벨로주와 재미공작소 등 앨범의 무대가 된 몇몇 공연장에서 각자 최선을 다했을 사운드 엔지니어들의 노고, 그리고 그 라이브를 스튜디오 앨범 못지않은 깔끔한 사운드로 뽑아낸 김해원의 믹싱도 빼놓을 수 없다. 라이브 공간을 타고 소리가 퍼지는 느낌, 김사월의 멘트, 곡이 끝난 뒤의 박수 소리 등도 그대로 담겨 있어 앨범은 눈앞에서 가수와 공연을 나누는 감각을 생생하게 전한다.
첫 정규앨범 <수잔>의 수록곡인 「꿈꿀 수 있다면 어디라도」와 「악취」를 제외해도 열 개나 되는 신곡들을 대담하게 라이브 실황으로 공개한 건, 아티스트 스스로가 ‘지금’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7102>가 특별한 앨범인 이유는 상상하기도 버거운 지독한 상흔을 바로 ‘지금-여기’의 영역에 데려오기 때문이다. 소박한 목소리에 감춘 김사월의 상처투성이 언어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의 그늘진 곳에서 미약한 따뜻함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추운 곳에 가서야만 쉴 수 있는 사람’의 쓸쓸한 독백이 한순간 ‘내 일’로 느껴질 때, 고독의 짙은 페이소스는 비로소 외로움을 넘어설 힘이 된다. 새삼 다시 깨닫는다. 좋은 음악은, 좋은 예술은 언제나 용감하게 결핍을 마주한다는 것을.
조해람(chrbbg@gmail.com)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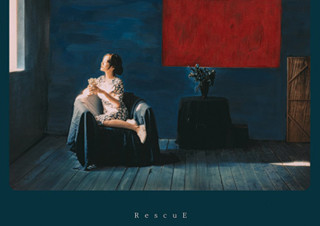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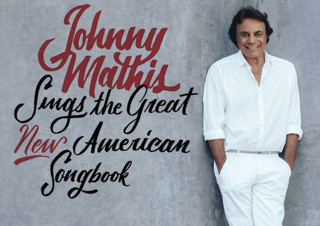

![[리뷰] 여성들의 로맨틱한 성장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26ddf5f5.jpg)

![[더뮤지컬] 뜨겁게, 섬세하게, 자유롭게…새롭게 돌아오는 <윤동주, 달을 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9-0b874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