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3월의 눈_공연사진_05_좌측부터 장오役(오현경), 이순役(손숙).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a/d/5/bad5b75be38ef51c5f298c91dc7d172f.jpg)
3월에 내리는 눈처럼
<3월의 눈> 이 다시 찾아왔다. 누군가는 눈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작품이 떠오른다고 했다. 다른 누군가는 진짜 3월은 이 작품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쉬이 잊히지 않아서 그렇다. 기약 없는 재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관객의 바람에 응답하듯, 국립극단은 <3월의 눈> 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2018년에 선보이는 첫 번째 작품으로 정성스레 준비했다.
손진책 연출가는 말했다. “ <3월의 눈> 은 내리는 순간 찬란하지만 땅에 닿으면 곧 녹아 버리는 우리의 인생살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뭇없이 사라짐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3월의 눈은 요란하지 않다. 가만가만 찾아든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린다. 이렇다 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빛나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 속에서 영원을 살기도 한다. 마치 ‘장오’와 ‘이순’처럼.
낡은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이순이 뜨개질을 하고 있다. 고운 붉은 색 실로 장오의 옷을 뜨고 있다. 이발소를 찾아 나섰던 장오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온다. 단골 이발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노부부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오래된 집과 낡은 건물들이 자리한 동네, 익숙한 것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장오와 이순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자신들과 함께 세월을 버텨온 이 집을, 이제는 손자를 위해 팔고 떠나야 한다. 조각조각 해체되고 와르르 헐리고 나면 번듯한 삼층 건물이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없을 테지만, 장오와 이순은 새로 문창호지를 바르며 일상을 이어간다.
![[국립극단]3월의 눈_공연사진_18_좌측부터 이순役(정영숙), 장오役(오영수).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b/4/b/bb4b715451d065619948f029ab5167c8.jpg)
이젠 집을 비워 줄 때가 된 거야
2011년 초연된 <3월의 눈> 은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을 기념하며 배삼식 작가가 헌정한 작품이다. 한국 연극사를 이끌어온 백성희, 장민호는 평생 국립극장과 극단을 지켰다. 두 배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공연으로 시작된 만큼, 연극 <3월의 눈> 은 연기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는 자극적인 요소도 날 선 대립도 없다. 그럼에도 순도 높고 진한 뭉클함을 안겨준다. 그것은 오롯이 배우들에게서 시작되어 완성된 것이다. 한 번의 눈길, 잠깐의 호흡에도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담겨있다. 조금의 과장도 거짓도 없이 담담하게, 깊이를 드러낸다.
故 장민호, 故 백성희, 박혜진, 박근형, 변희봉, 신구 등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존재감을 전하는 배우들이 <3월의 눈> 과 함께했다. 이번 무대에는 오현경과 손숙, 오영수와 정영숙이 오른다. 네 배우 역시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산증인이자 중추 역할을 해 온 인물들이다. ‘믿고 보는 배우’라는 찬사도 이들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장오는 말했다. “섭섭헐 것두 없구, 억울헐 것두 없어... 이젠 집을 비워 줄 때가 된 거야, 내주고 갈 때가 온 거지” 그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연출가 손진책은 말했다. “온 것은 언젠가는 가야하고 한 번 온 것은 다시 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성과 소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사라지는 것이 꼭 애잔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 엄숙한 순리를 <3월의 눈> 은 소리 없이 짚어준다. 하여, 역설적으로, 이 작품만은 사라짐 없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관객과 함께 세월을 켜켜이 쌓아가 주기를 기대한다. 볼 때마다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 될 거라 믿는다.
연극 <3월의 눈> 은 3월 11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임나리
그저 우리 사는 이야기면 족합니다.

기획사 제공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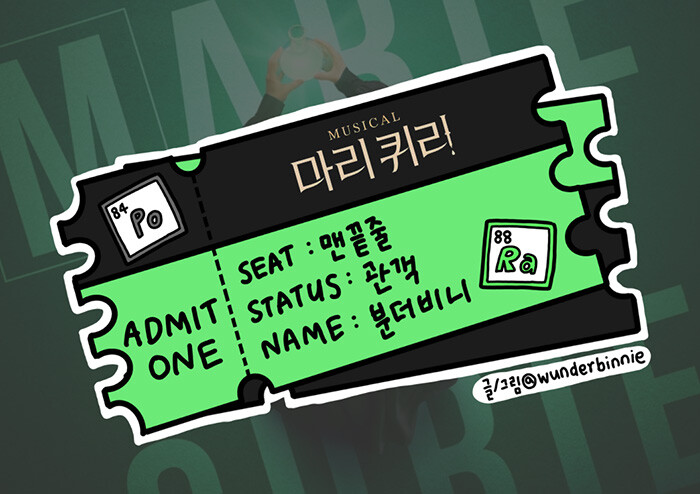
![[더뮤지컬] "미친듯이 연기·노래" 여성 배우 4인의 압도적 에너지…뮤지컬 <프리다>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4-d94f10de.jpg)
![[더뮤지컬] 강렬한 총성·나지막한 자장가…이혜영의 <헤다 가블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30-85a48382.jpg)

![[미술 전시] 동시대 미술의 반짝이는 ‘현재성’](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6-4137b8d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