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출간하는 책의 대부분을 내 기획으로 채우지만, 기획이라는 여건이 처음부터 주어지지는 않았다. 편집자 생활 초반에는 기획보다는 편집을 익히는 데 주력했다. 첫 사수에게 편집 기술이나 저자 응대, 사회생활 태도 등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안타깝게도 기획 노하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본격적으로 기획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즈음, 사장발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획이란 ‘해결하지 못한 난해한 숙제’ 같았다. 처음 ‘기획안을 작성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마냥 막막했다. 참고용으로 받은 기획안은 너무도 완벽해 보였다. ‘편집자 본인이 직접 써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난 저 정도의 지식이 없는데 어쩌나 싶었다. 온종일 참고도서를 찾아 인터넷 서점을 뒤적거렸더니 머릿속만 더 복잡해졌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미 다 책으로 출간된 것 같았다.
기획회의 날짜는 하루 이틀 다가왔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불호령을 듣고 싶지 않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제출해야 했다. 일단 가장 만만한 분야를 건드렸다. 평소에 정치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를 다루기로 했다. 분야가 분야인지라, 기획안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세상 모든 문제점이 해당 키워드에 응축된 것처럼 포장해놓았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이거 하나만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그런 건 없다)라고 외치는 듯한 기획안이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었다(못 바꾼다).
기획안을 제출한 날, 상사는 이런 코멘트를 주었다.
‘의미 있는 기획임은 알겠다. 세상에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분명하다. 그런데 이 책, 몇 권 팔릴 것 같으냐. 초판을 3,000부 찍으면 3,000명이 사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을 3,000명이 집어들 것 같으냐.’
혹독한 코멘트였다. 상사는 내게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돈부터 벌어와”라고 말했다. 내 기획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처음에는 불쾌했다. 책을 만드는데 ‘돈’부터 운운하는 그가 속물 같아 보였다. 판매 사이즈가 작은 분야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하대하나 싶어서 약간의 모멸감도 느꼈다. 출판의 기본은 다양성이지 않나. 100만 명이 읽는 책과 1,000명이 읽는 책이 공존해야 출판계가 풍부해지지. 그것이 출판업계에 100인 넘는 사업장과 일인출판이 공존하는 이유 아닌가 등등.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수많은 반박이 머릿속에 떠다녔다.
연차가 쌓이고 내가 그분 위치에 가까워지니 조금은 알겠다. 회사는 의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출판 생태계가 다양한 책으로 서로의 영역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판매 사이즈를 확보한 책이 아니라면 그 책에 담긴 모든 의미는 이내 매대 밖으로 사라지는 것도 현실이다.
당시 상사는 나와 다른 분야의 책을 주로 기획했다. 그와 나는 많은 점이 달랐지만 그분 밑에 있던 덕분에 책이라는 낭만을 제거하고 ‘팔리는 책’의 냄새를 맡는 법을 어렴풋이 배울 수 있었다.
일본에서 천재 편집자라 불리는 미노와 고스케는 『미치지 않고서야』 에서 “책 따위 팔리지 않아도 누구도 죽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움직이는가에 있다”라고 말한다. 마음을 담아 책을 기획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면 팔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편집자란 치기 어린 유형, 이른바 ‘낭만적인 편집자’”라고 치부한다. 좋아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못을 박는다. 그의 말은 앞뒤가 다르게 들린다. 그럼에도 두 문장을 한 책에서 연달아 이야기하는 까닭은, 책의 의미와 숫자 사이의 균형감을 잡아야 괜찮은 편집자로 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 언급된 그의 말과 태도에 거의 공감하지 못했지만(그를 겪은 적이 없어 조심스러우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소진시키다 못해 남까지 갈아 넣는 유형이 아닌가 싶다) ‘돈을 번 후에 낭만을 말하라’는 말만큼은 밑줄을 그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올 때, 초판을 약 2,000부 찍는다. 책을 2,000부 찍는다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2,000명이 책을 집어 들어야 비로소 2쇄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득 아찔해진다. 의미만 있고 독자에게 가닿지 않는 책들이 서가에 쌓이는 모습을 보면 새삼 나무에게 미안해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내 책이 그런 취급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
숫자는 내 터전을 넓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회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로 보여주어야 한다. 직접 기획해 출간되는 책들이 평타 이상 쳐주어야 이후에 ‘사이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책’을 들이밀 기회도 생긴다. 당시 상사가 내게 모질게 조언한 ‘돈부터 벌어와라’는 말은 이 뜻이 아니었나 싶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나의 바람과, 팔리는 책을 기획하라던 상사의 바람은 사실 같은 길을 가기 위한 다른 해석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내게 그 균형감을 심어주려 했던 것이리라.
언젠가 또 다른 상사가 기획에 대해 조언해준 적이 있다. 자신의 선배가 본인이 신입일 때 해주었던 말이라고 한다. 힘을 잔뜩 준 기획안을 들고 간 그에게 선배는 “기획할 때 자위自慰하지 말라”고, “자기만족에 그치려면 일기장에나 쓰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에 내가 만들었던 기획이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저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상사를 만났으니 새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새로운 시대의 편집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돈은 못 벌지만 의미를 찾는 편집자와, 독자가 원하는 책을 찾아내는 편집자 사이, 그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
미치지 않고서야미노와 고스케 저/구수영 역 | 21세기북스
‘아마존 재팬 종합 1위, 누계 판매 부수 12만 권’을 달성하며,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편집자’, ‘시대를 앞서는 히트 제조기’라 불리고 있다. 회사 안에서 빼어난 실적을 올리고 회사 밖에서 본업의 20배가 넘는 수익을 내기까지, 그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한 새로운 시대, 일하기 혁명을 고스란히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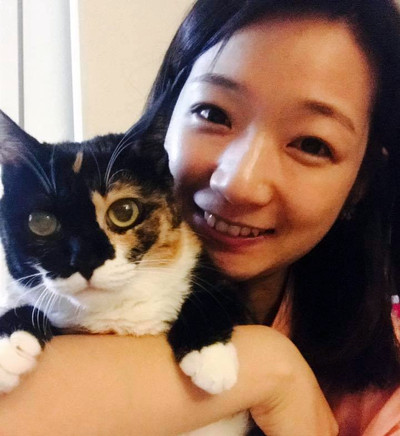
이지은(출판편집자)
12년차 출판노동자. 2009년부터 지금까지 6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인생은 재능이 아닌 노력’이라는 좌우명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분투했다. 덕분에 재능 없이 노력으로 쌓은 12년 출판경력은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공존한다. 한 권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 동료나 저자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 출판이 재미있어서 이 언저리에 계속 남고 싶다.











![[작지만 선명한] 이상한 방식의 안온함, 안온북스의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2-8f608cf7.jpg)
![[리뷰] 다른 대화는 가능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1-04afdf49.jpg)
![[더뮤지컬] <위키드> 글린다, 변화와 성장의 이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4-cd1dcc0b.jpg)

![[더뮤지컬] 전하영, 시선의 끝에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51d805af.jpg)





einmal4m
2020.03.25
- 넵!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