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크루에서 만드는 에세이 구독 서비스 <책장 위 고양이>에서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에세이를 격주 월요일, <채널예스>에서 소개합니다.
<책장 위 고양이>는 7명의 작가들이 돌아가며 1편의 에세이를
매일 배달하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2008년 여름 나는 의과대학 졸업반이었다. 학교를 다닐 만큼 다녔고 놀 만큼 놀았던 참이었다. 의대생 시절 나의 모토는 '의대생이 하지 않을 것은 모조리 다 해보자'였다. 이미 대륙 횡단을 세 번 다녀왔고 중국에 어학연수도 갔으며 국토대장정도 마쳤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나름대로 시까지 쓰고 있던 좌충우돌 졸업반이었다. 알다시피 이중 하나만 건드려도 이번 글은 훌쩍 지나간다. 다시 그 해로 돌아와서 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을 정리하는 또 다른 여행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어떻게 하면 더 최종적으로 재미있게 놀까 궁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마지막 4주간의 방학이 남았다. 개강하면 본격적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의사가 되는 길이었다. 나는 마지막 여행지를 궁리했다. 그곳은 무난하게, 동남아였다. 대신 이 원정은 그동안 모든 여행의 노하우를 모아 방랑을 정리하는 여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앞으로 5년간의 지옥 같은 수련을 받아야 했다. 긴 여행을 다시 꿈꾸기는 어려웠다. 위대한 마지막 여정이 눈앞에 있었다.
방콕 공항은 더웠다. 여름이라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다. 일단 카오산에서 가장 사람 많은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다. 그동안 여행계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으니, 게스트하우스 로비에만 나가도 선지자가 강림한 듯 환대받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었다. 덥기만 하고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적이는 곳에 나가 혼자 맥주나 홀짝이다 돌아왔다. 실상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고 크게 매력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나랑 놀아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사람 없는 곳만 다녀서, 막상 사람 많은 곳은 오히려 외롭기만 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휴가였고,(라고 그때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가야 했다. 못 노는 나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카오산의 한 가게가 눈에 띄었다. 카오산은 여행의 수도답게 여행자를 위한 가게가 많았다. 타투숍, 헌 가방이나 가이드북을 파는 숍, 10분이면 가짜 국제 학생증을 만들어주는 숍 따위가 줄지어 있었다. 그중 거리에서 머리를 볶아주는 가게가 있었다. 몇 만 원만 내면 허리까지 치렁거리는 레게 머리를 붙일 수도 있었다. 바로 저거였다. 내 떨어진 자존감과 외로움을 전복시킬 수 있는 기회다. 저거라면 나는 핵인싸가 된다. 나는 핵인싸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하여 나는 대낮 카오산 로드에 앉아 레게 머리를 붙이기 시작했다. 날씨는 더웠고 사람들은 흘깃거렸다. 그 시선이 벌써 주목받는 것 같았다. 미용사들은 내 머리의 구획을 나눈 다음, 가짜 머리를 놓고 송곳 같은 도구로 엉키게 만들어 붙였다. 결국 몇 시간이 걸려 허리까지 오는 검은 머리 서른 가닥과 하얀 머리 두 가닥을 붙이고 레게 전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찬찬히 거울을 보았다. 비열한 표정과 오래도록 면도를 안 한 더러운 인상과 현지인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피부결이 지금 봐도 밥상을 찰 정도로 삭은 모습이었다. 놀라웠다. 그를 필경 다른 존재로 불러야 했다. 그렇다. 그가 바로, 태국에서 태어난 낢쿵컄뿌빳뽕인 것이다.
이렇게 주제어가 훅 들어온다고? 나도 방금 써놓고 조금 놀랐다. 하여간 프로필 사진의 낢쿵컄뿌빳뽕은 참빗을 하나 사서 '날아라 슈퍼보드'의 손오공처럼 두피를 덕덕 긁으며 히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꼴로 치앙마이를 거쳐 히피의 도시 빠이에 도착해, 오토바이를 장기 렌트하고 온갖 인간들과 교류했다. 생활상이란 게 대낮부터 맥주병을 들고 100미터 정도 되는 시내를 하릴없이 십 회정도 왕복하면서,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쏘아보며 다니는 것이었다. 빠이 외곽의 한 방갈로에서 진짜 비렁뱅이처럼 기거하던 그 ssul은 또 풀어낼 날이 오리라.
한참 태국에서 잘 나가던 낢쿵컄뿌빳뽕은 학사 일정 문제로 해외 생활을 청산했다. 금의환향이었다. 아들을 키우며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었다고 느꼈던 어머니는 꼴을 보고 또 한 차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일단 나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았다. H.O.T 시절 문희준이 레게 머리 감았던 ssul 그대로 대야에 맹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거꾸로 첨벙첨벙 넣어 행군 다음, 다시 대야에 물을 받아 샴푸를 풀어놓고 머리를 거꾸로 첨벙첨벙 넣어 감고, 또다시 대야에 맹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거꾸로 첨벙첨벙 넣어 헹궜다. 그리고 한숨 잤다. 무심코 방문을 열어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셨다. "내가 에일리언 새끼를 낳았나 했어."
그는 이제 학교에 갔다. 개강 날 수업은 은퇴한 노교수님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학교에 늦었고, 언제나처럼 강의실에는 뒷자리부터 찼다. 수업 시작 5분 된 강의실은 앞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는 앞으로 들어갔다. 낢쿵컄뿌빳뽕의 꼬라지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친구들은 뒷자리부터 야구장 파도타기 응원하듯 큰 소리로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노교수님은 자기의 위트가 인상적인 줄 알고 "아 역시 이게 조금 재미있는 얘기죠." 라고 했다가, 자신의 역량으로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다 낢쿵컄뿌빳뽕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역시 파도타기의 일원이 되어 폭소를 터뜨렸다. 오랜 의대 교수 생활에서 처음 보는 학생이었을 것이다. 그는 노교수의 위엄과 아량을 간신히 되찾고서 말했다. "용기 있는 학생에게 박수를." 그 말에 다들 크게 박수를 쳤다. 당시 태어나서 가장 크게 받은 박수였다.
이후 그는 앨런 아이버슨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교내 농구 대회에 출전해 슛을 하나 쏘고 교체되었는데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대표로 우승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생전 안 가보던 클럽에 가서 “힙합하나 봐” 소리를 듣거나, 괜히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사인가 봐"라는 소리를 듣거나, 괜히 기타를 들고 다니며 "진짜 저 친구는 음악 제대로 하나 봐" 같은 소리를 들었다. 뭘 해도 예체능 계열 전문가로 보이는 유쾌한 꼴이었다. 하지만 졸업 사진 촬영날이 다가오자 그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그에겐 미래도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집에 앉아 머리를 뽑기 시작했다. 여기서 레게 머리는 뽑으면 바로 뽑힌다는 사실! 이렇게 그는 간단히 남궁인으로 돌아왔다. 그 흔적을 몽땅 버리고자 하셨던 어머니의 커다란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얀 머리칼은 아직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어디다 뒀더라.
그렇게 '나의 진정한 친구 뿌빳뽕커리'의 여정은 마무리된다. 사실 뿌빳뽕커리는 두 번밖에 안 먹어봤고, 심지어 태국에서는 맛본 적도 없다. 하지만 그가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만큼은 진실되다. 영원히 그는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으리.
<남궁인 작가의 말>

그동안 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왼쪽의 사진과 기괴한 주제어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될지 저도 참 몰랐습니다. 역시 글쓰기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연재로 제 글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낢쿵컄뿌빳뽕이라는 자가 오랜 방랑을 마치고 남궁인으로 돌아와 도대체 어떤 글을 써서 출판했는지 본다면, 아마 이 글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셸리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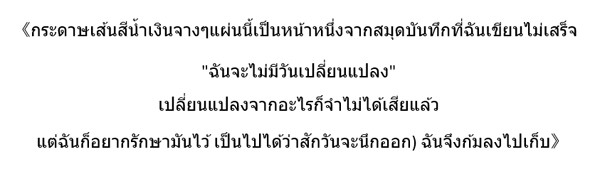
혹시 느닷없는 태국 문자의 쇄도에 당황하였소? 남궁인 작가의 《에세이》에 대한 나 셸리의 감상은 쁘랍다 윤이 쓴 작품 「괄호 속의 펜」의 종장 몇 줄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할까 하오. 금주의 주제는 《언젠가, 나의 진정한 친구 뿌팟퐁커리》이고, 이 주제를 정한 것은 남궁인 작가였소. 고로 남궁인 작가의 글로 월요일 아침을 여는 일이 나쁘지는 않을 듯싶소. 《뿌팟퐁커리》가 무려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글을 쓰는 일은 태국인인 쁘랍다 윤 작가에게조차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쓰는 일이란 작가라는 자들의 숙명에 속하는 일이 아니겠소? 남궁인 작가에 더불어 다른 여섯 작가들의 건투를 비오.
추천기사

남궁인(작가)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예스24 인문 MD 손민규 추천] 휴대폰을 보며 잃어버린 것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b/4/2/9b4205bc8f6f0fbe167dfab36b5bc968.jpg)
![[구병모의 추천사] 머릿속 상상의 도서관을 열람하고픈 작가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d/d/e/5dde5edc8848b03403b80cbe5d811f12.jpg)
![[요즘 독서 생활 탐구] 책과참치, 독서하는 모든 사람이 서평가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4-a682c01f.jpg)

![[송섬별 칼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04-2468aa04.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