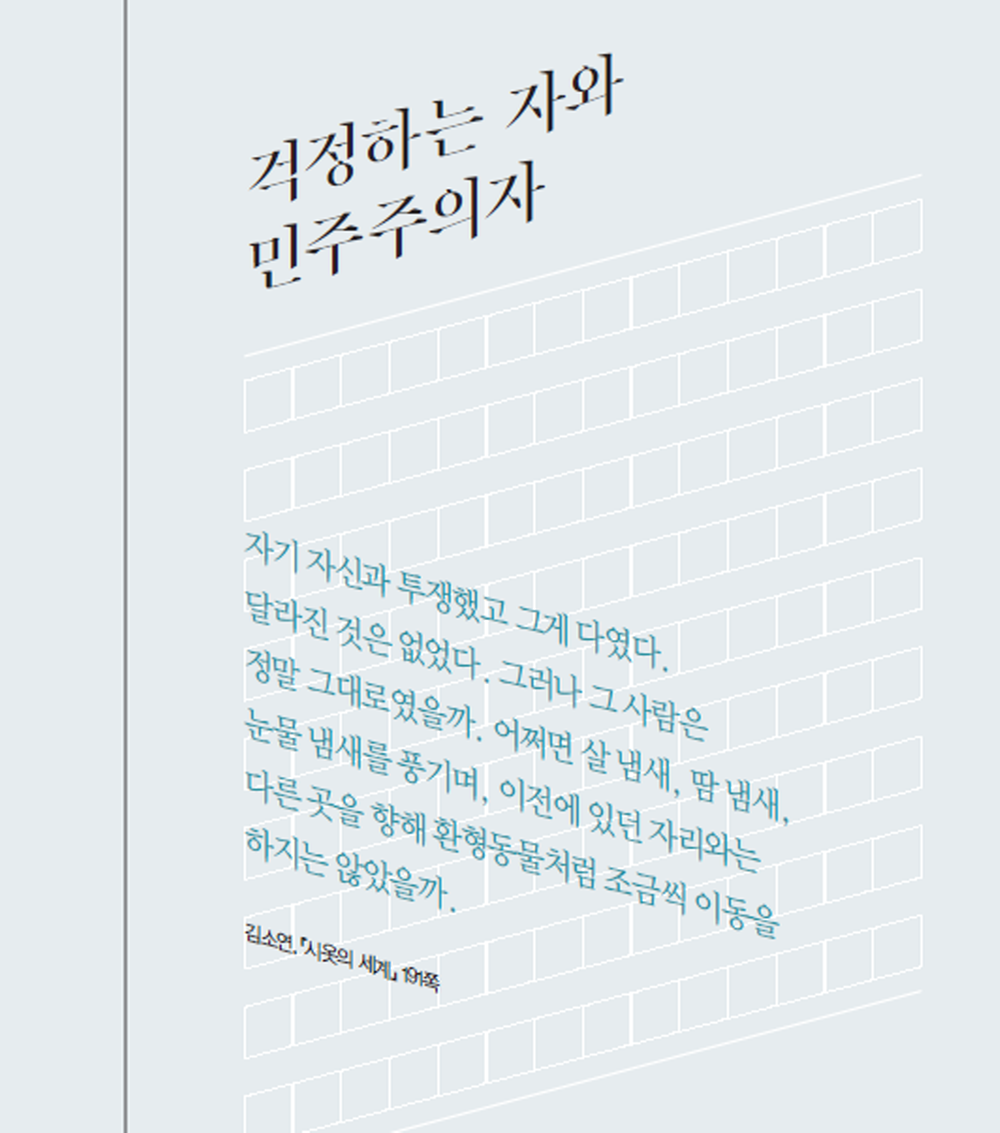
자기 자신과 투쟁했고 그게 다였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였을까. 어쩌면 살 냄새, 땀 냄새, 눈물 냄새를 풍기며, 이전에 있던 자리와는 다른 곳을 향해 환형동물처럼 조금씩 이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하는 광고라는 일은 특정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껏 일해오며 특이한 경력을 가진 동료들을 많이 만났다. 의대를 다녔던 아트디렉터도 있었고 건축을 전공한 카피라이터도 있었으며 신춘문예 당선자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광고쟁이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있었다.
최는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한 크리에이터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한 무용을 무려 17년이나 계속했고 그래서 현대무용을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미래로 여기며 살아오다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면 그게 어디 인생이겠나 싶게 지금은 광고회사에서 새내기의 풋풋함을 담당하고 있다.
최가 입사 인터뷰에서 밝힌 입사 후의 다짐은 이러했다.
“저는 예민한 사람의 다정함이 좋습니다. 날카롭고 까탈스럽기만 한 예민함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해서 더 상냥한 눈빛을 보내주며 더 섬세한 언어로 일을 의논하는 그런 다정함 말이죠. 저는 제가 그런 예민함과 다정함을 언제나 잃지 않은 채 일하고 싶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습니다.”
(* 이 부분은 칼럼을 싣고 나서야 원 출처를 알게 됐습니다. TBWA 박지우 카피라이터가 본인의 SNS에 쓴 글이 '예민한 사람의 다정함'의 출처임을 정확히 밝혀둡니다. )
나는 이 다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장래 희망을 묻는 일이 생기면 꼭 저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된다는 최의 허락까지 받아 두었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최를 보며 생각했다. 일의 모든 경우에 예민하면서도 다정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일을 시작하는 최는 할 수 있을까? 예민함과 다정함은 개인의 자질과 태도의 측면에선 둘 다 분명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냐 아니냐, 다정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실제 일의 맥락에서 중요한 건 지금이 예민해야 할 때인가 다정해야 할 때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다. 그렇다면 그것은 품성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이 된다. 다정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다정한 건 아닌가, 다정하게 대해서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는 사람들과 다정하기만 해서 정작 일이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랬듯 최 또한 그런 질문들과 앞으로 숱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친한 후배가 담당 클라이언트를 잃게 생겼다며 조언을 청했다. 여러 해 동안 그 후배가 일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광고회사를 새로 정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광고 안을 준비해달라는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쳤다는 것이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단다. 흔한 일이었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안전하다. 결정의 책임이 모두에게 분산되기에 결과의 책임 역시 특정인에게 귀착되지 않는다. 게다가 다수의 참여와 지지는 숫자로 남는다. 숫자는 객관과 공정의 상징이라, 숫자가 뒷받침된 해당 의사결정을 근사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용산공원이 상금까지 걸고 네이밍 공모를 통해 결정한 새로운 이름이 뭔지 아는가? 용산공원이다. 허무개그 아니냐 싶겠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실제 사례다. 아이디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현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판단이다.
나는 후배의 얘기를 찬찬히 듣고 불리한 구도라고 봤다. 새로운 클라이언트에게 첫 제안을 하듯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객관적인 설득력의 관점에서 전체 콘텐츠를 설계해서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관점에 후배도 동의하는 눈치였다.
나중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승전보였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시작했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해 주었다.
“준비해달라고 하신 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품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겸손하게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입맛에 맞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렸어도 승전보를 들을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함께 일을 도모해가다보면 민주주의자들만큼이나 꼭 만나게 되는 과정이 걱정하는 자들과의 회의다. 걱정하는 자는 겸손하다. “이 솔루션은 좋은데 판매에는 큰 플러스가 안 될 듯 싶어서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꼭 바꾸자는 건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이지.” 그렇게 겸손하다. “이 아이디어는 새롭다는 면에서 참 좋은데 이전까지 해왔던 커뮤니케이션과 연속성이 없다는 게 걱정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겸손하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그렇게 걱정 하나씩을 테이블에 올려 놓기 시작하면 나는 예민해진다. 다정함으로 이 모든 걱정을 다 껴안고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방도는 애당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걱정하는 선의는 이해하나 선한 의도라고 해서 다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높은 사람이 걱정을 겸손하게 말하는 순간, 아이디어의 현재 좌표는 순식간에 영안실 입구이거나 최소한 중환자실 수준이 되어 버리고 만다. 결정을 눈앞에 두고 걱정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정함은, 공 든 탑이 엎질러진 물이 되는 그 파탄을 무력하게 추인한다.
실은 나도 정말 매순간 모르겠다. 마케팅의 구루들이 멋지게 설파하는 수백 가지 법칙들을 아무리 읽어본들 현실의 비즈니스 순간에는 언제나 새롭게 모르겠다. 아이디어의 우열과 성패를 다수결이나 여론조사에 맡기려는 민주주의자들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려야 할까? 진심을 다해 다정하게 설득한다면 통할 수도 있을까? 걱정하는 자들과의 회의에서 그 걱정이 선의임을 예민하게 포착한 후, 그 걱정을 이해한다고 다정하게 화답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꼭 산으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을까?
그렇게 모를 때마다 생각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내 뒤에서 예민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보는 사람, 말하자면 최나 그 후배같은 사람에게 지금 내 판단이 어떻게 읽힐 것인가? 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결과적으로 나는 좋았다.
신입 최의 말을 새로운 장래희망으로 삼기 전까지 나의 이전 장래희망은, 권위가 아닌 품위의 인간이었다. 일하는 자의 품위란 게 무엇이겠는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낑낑대는 안간힘. 고귀하지 않은 진흙탕에서도 꿋꿋한 의지와 비겁하지 않은 땀 냄새. 일이란 결국 목표를 잊지 않고 진전시켜 나아가는 매순간의 분투이기 때문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원흥(작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를 쓴 카피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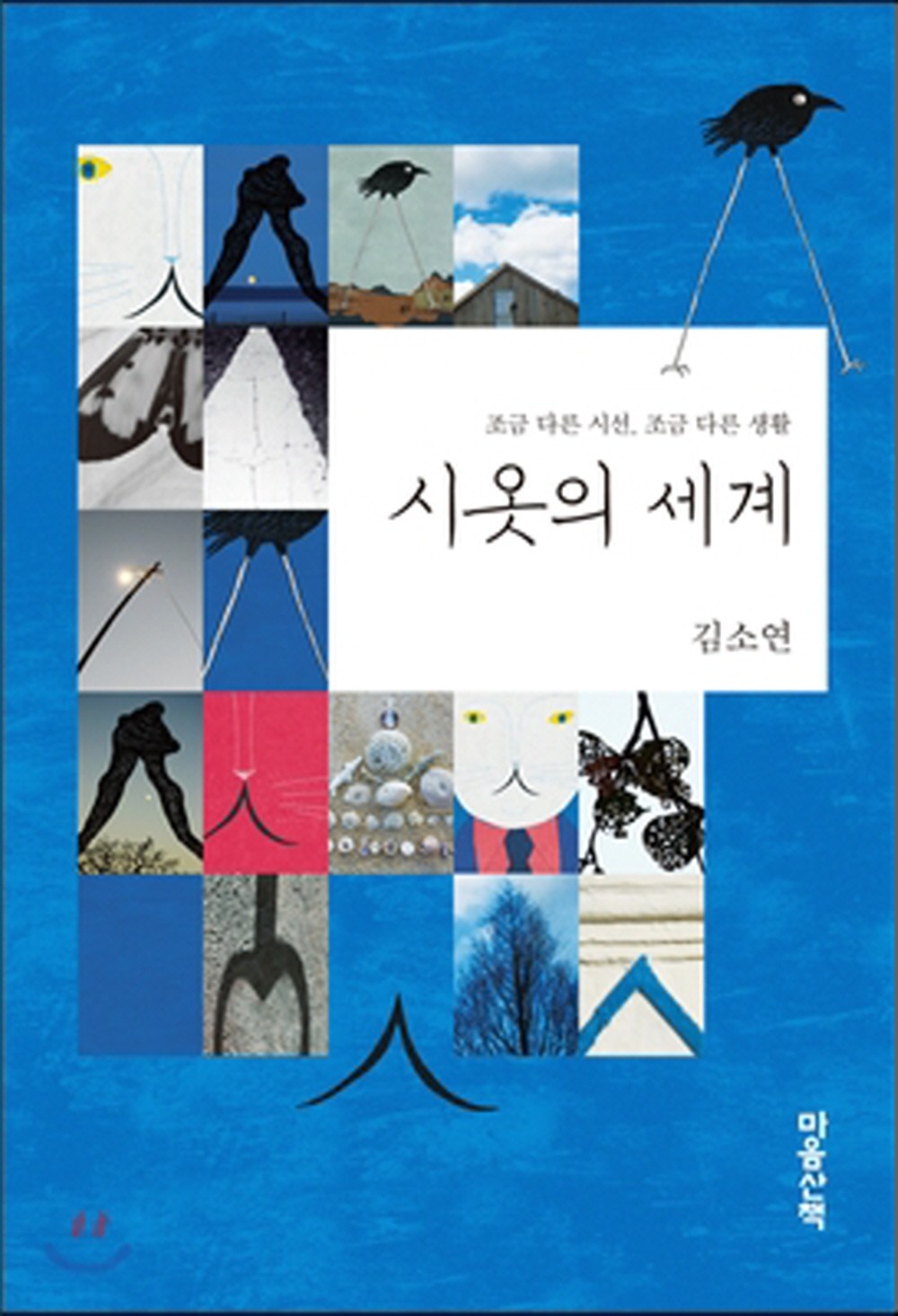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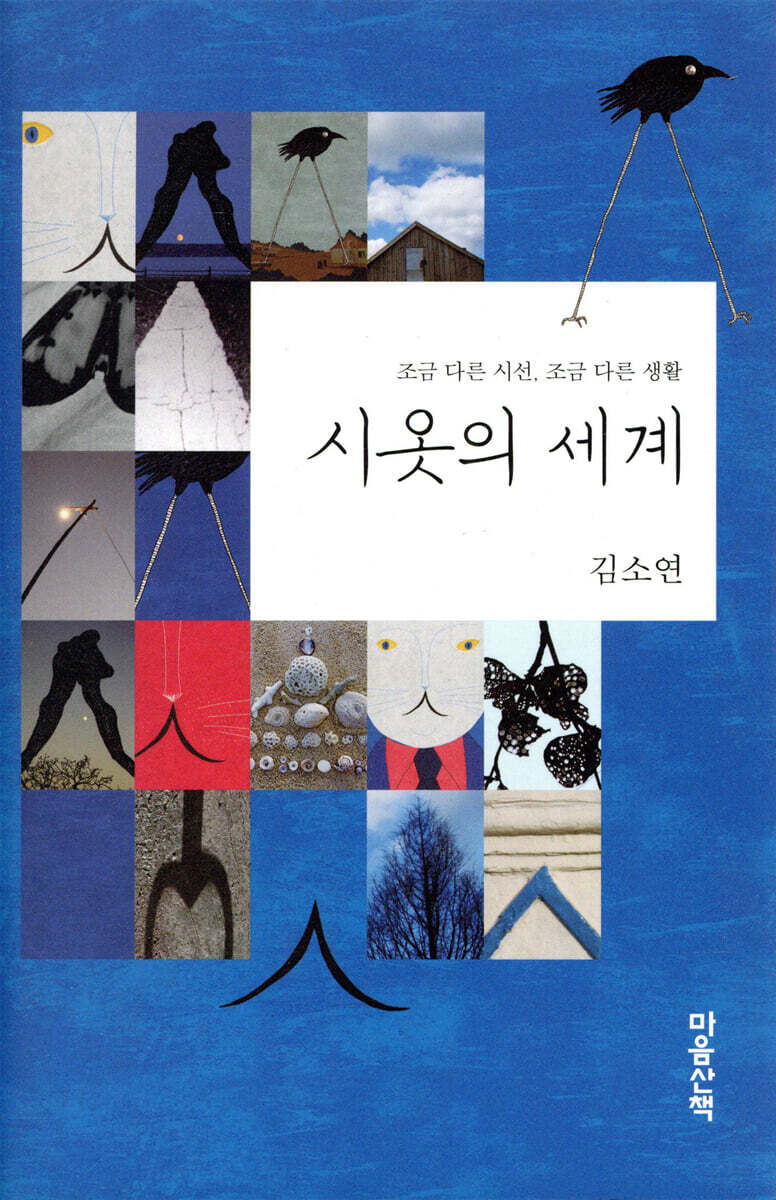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일인분과 사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d/0/6/0d06dbbdfa5e65702915de4196cf2366.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보이는 게 다일지 몰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d/2/8/1d287247c7ebe8b7e5c227179ede98a7.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농담에도 방향성이 있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d/b/8/fdb8c520783a76713a1bf5efe16f8b02.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서점 직원의 선택] 새해를 함께 시작할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6-a898fdd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