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이 들어간 산은 함부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들었건만, 여행이 고팠던 여자 셋에게는 그런 말 따위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서울 도심이 아니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7시에 시작하는 호텔 조식을 느긋하게, 그것도 든든하게 먹던 우리는 8시 30분이 되어서야 호텔을 나섰다. 모두가 산행을 괜히 꼭두새벽부터 하는 게 아닌데 단순히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로 신난 우리. 여름의 끝을 잡으며, 초록의 힘을 받으며 등반은 시작됐다.
오르막으로 악명이 높은 오색 코스를 오르는 동안 땀이 뚝뚝 떨어지고, 강렬한 햇볕에 썬크림을 몇 번이나 덧발라야 했지만 이 코스의 끝에는 대청봉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올랐다. 그간 열심히 운동해 온 덕분에 올라가는 일은 심박수도 들여다보며 갈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산행이라 하면 마음먹고 갔을 정도의 난이도로 느껴졌다. 중간마다 뒤따라오는 언니들을 북돋워 주기 위해 앞엔 무엇이 있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계단이다, 등의 안내를 해 주면서 나름의 길잡이 역할을 하려 했다.
누군가 많이 힘들어하면 기다려주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서로를 다독이는 셋의 합이 좋았다. 숲 언니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밍 언니의 격해진 숨을 조금씩 가다듬어주었고, 의지해가는 서로의 모습에 더 힘내서 올라갈 수 있었다. 어쩜 이렇게 아가씨 셋이서 이 힘든 산을 오려고 했을까, 하시며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무척 힘이 되었다. 서울에서는 누군가 말을 걸면 경계부터 하게 되는데, 이곳에선 따뜻한 격려로 들려와 짧은 대화를 하기도 했다. 초록은 사람을 이렇게 유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 같은 고지를 향해 오르고 있다는 연대감은 쉼터에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여유도 만들어준다. 평소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밝은 힘이 몸의 고됨에도 불구하고 이 산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일까.

그렇게 오른 대청봉에서는 어느 산에서보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산을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인지 해발 1700m가 넘는다는 게 어떤 높이인지 가늠을 하지 못했고, 이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바위산과 바다와 하늘이 저마다의 품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우리가 이 높은 곳에 두 발만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신기했다. 무엇이든 이렇게 한 발 한 발 딛으면 언젠가 고지에 닿긴 하는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하고 새삼 뻔한 사실을 되새기며. 혼자였으면 이까지 오르지도 못했을 거라며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돌 틈에 핀 들꽃도 예뻐 보이는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전투음식 같은 발열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뿌듯함은 지속되었고, 빠르게 먹고 어서 하산해야 할 시간인지도 모르고 느긋했던 우리. 한계령이 왜 ‘한계’령이라 불리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숲과 밍, 그리고 나는 분명 하산길인데 자꾸만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보내는 이 코스를 걸으며 절로 나오는 욕을 쓸어 담아야 했다. 영원히 산 정상으로 돌을 옮기는 형벌을 받아야 했던 시지프스가 된 것처럼 절망감과 기대감이 오가는 이 구간이 수차례 반복됐다. 해는 어두워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거리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완만할 거라 생각했던 한계령은 커다란 바위를 두 발과 두 손을 요령껏 이용해서 넘어야만 했고,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이 고행과 함께 어둠이 내린다는 두려움이 함께했다. 산에서의 어둠은 자꾸만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무력감을 주었고, 급기야 지치고 두려움에 싸인 우리는 조난구조대에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 앉아서 구조대를 기다리면 될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구조 과정 역시 두 발로 같이 하산하는 것뿐이니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찬찬히 한 발씩 플래시를 켜고 내려오라는 것. 기대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란 걸 몸으로 느꼈다.
두려워하던 우리는 상행 코스에서 만났던 부부를 만났다. 다행히도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은 불안을 가라앉혀줬고, 셋에서 다섯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배터리가 없는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이 플래시를 비춰주고, 두 분은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끝이라고 계속 우릴 토닥여주셨다. 하늘을 쳐다볼 생각도 못 하고 당장 발 앞의 길만 비추며 가고 있었던 내게, 아주머니와 숲 언니는 ‘하늘 좀 보세요, 별이 가득해요’라며 내 눈을 하늘로 돌려주었다. 그 날 밤의 하늘에는 정말 많은 별이 박혀있었다. 평소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별이 더 잘 보였던 걸까. 아니면 깜깜한 산에서 보니 더 빛나는 것처럼 보였던 걸까. 사진으로 담고 싶어도 담기지 않았던 청량하고 빛나는 그 밤의 하늘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시지프스의 형벌 같던 한계령도 결국은 끝이 났다. 두려움과 절망이 도사리던 우리의 발끝에도 저 멀리 우리를 기다리는 관리자들의 차가 보이는 순간 조금씩 힘이 실렸다. 내려오니 하늘을 더 보고 싶었다.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던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던 별들을, 함께 이 하늘 아래에 있어주어 고맙다는 동지애를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는 서로를 ‘설악생존자들’이라 부르기로 했다. 숙소로 돌아와 정말로 엉엉 우는 밍 언니를 달래며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나니 비로소 우리가 무사히 내려왔다는 것이 실감 났다.
미화된 것일지 모르지만, 그땐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이 고통이 며칠 지난 지금은 귀한 추억이고 다음 산행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산행에서 깨달은 것들을 다음 산행에서 꼭 주의하겠다고. 그리고 좀처럼 산행에선 보기 힘든 까만 밤하늘을 보게 해 준 산행이었다고.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했던 그 밤, 별 아래의 우리를 기억하자.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나영(도서 PD)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더뮤지컬] <위키드> 글린다, 변화와 성장의 이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4-cd1dcc0b.jpg)

![[서점 직원의 선택] 만우절 추천 도서 - 거짓이 당신을 속일지라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1-8d5a7a7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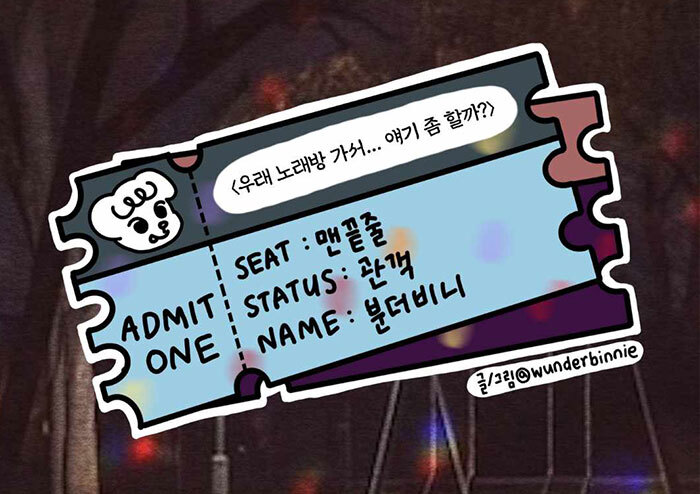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