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묵향이는 쩍벌녀다. 벌렁 누워서 가랑이를 쩍 벌리고 팔은 만세 자세를 하고 잔다. 가끔 미묘한 차이로 턱을 팔에 괴고 자기도 하는데 양다리를 벌린 채 팔을 괸 모습이 마치 아크로 바틱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드문드문 만나는 밉상 중 밉상인 쩍벌남과는 그 인상이 아주 다르다.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쩍벌자세로 누워있기에 보기만해도 웃음이 나온다. 가끔 나는 짓궂은 마음이 되어 일부러 묵향이 앞에서 인기척을 내 보기도 하고 헛기침도 해 보지만 묵향은 꿈쩍도 않는다. 가끔 귀찮은 듯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내 감아버릴 뿐이다. 누구라도 이 모습을 목격한다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낙관적인 모습에 한 번 반하고 심지어 도도한 눈빛에 귀여워 미칠 지경이 되어버릴 것이다. 세상천지 이만한 곳이 없다는 듯 최대의 안락함을 자랑하는 자태로 누워 자는 그녀를 볼 때면 나는 이상하게도 무척 안심이 된다.
온통 검은색 털옷을 입은 묵향은 하얀색 턱시도우를 하고 흰양말을 신은 코숏이다. 작년 11월 한파가 시작된 아침에 작은 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급한 마음에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생후 5주쯤 되었고 영양상태는 나쁘지 않으나 기생충 약을 먹이는게 좋다고 진단되었다. 그렇게 너무나 갑자기 집사가 된 나는 고양이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었다. 집에 데려와 보니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 급한 마음에 새벽배송의 도움을 받아 모래부터 캣타워, 스크래처 등을 속히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기고양이는 불안함에 덜덜 떨면서 맹수가 되지 못한 하찮은 이빨을 드러내며 잘근잘근 손을 깨물다가는 툭하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애를 태웠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발에 뭔가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아기 묵향이가 궁뎅이를 내 발에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서슴없이 궁뎅이를 밀어 넣은채 새근새근 잠든 묵향이는 털뭉치 같았다. 그 이후로 묵향이는 밤잠에 들 때면 당연하다는듯 궁뎅이를 내 발에 기대고 잔다. 그러다 아침이 오면 내 얼굴을 자기의 우람한 뱃살로 덮어버리거나(이때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으면 질식의 우려가 있다) 까끌까끌한 혓바닥으로 연신 핥아댄다. 아침밥을 내 놓기 전까지 뱃살로 덮치기, 골골골 노래 부르기, 얼얼해 질 만큼 혀로 핥기의 3단 세트를 반복하는게 특기다.
처음엔 묵향이를 집에 데려오는게 흔쾌하진 않았다. 5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요크셔테리어 밍키를 애도하고 있었고 밍키 이후에 더 이상 동물친구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6년을 같이 산 밍키는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였다. 밍키의 말년은 병원 출입이 잦았고 힘겨웠다. 자궁에 농이 차고 탈장이 되면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해야 했고, 나중에는 인지능력이 상쇄되면서 계속 배고픔을 호소했다. 식탐이 가중되면서 건조대에 걸어둔 빨래를 물어 뜯는 일도 있었는데 잠을 청할 때면 언제나 내 발등에 자신의 배를 덮고 눕는 행위만은 잊지 않았다. 냉기가 차오른 차가운 발을 보드라운 뱃살로 덮고 누워 가냘픈 하품을 하며 꿈벅꿈벅 졸았다. 요플레를 나눠 먹고 산책을 같이하고 내가 울적해 보이면 자기의 공과 껌을 물어다 주며 애정공세를 하던 밍키였다.
그런 밍키가 예고도 없이 봄날 창가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잠든채 작별을 고했다. 밍키를 보내고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집 속에 한 가득 들어 있는 짝짝이 양말들을 찾았다. 세탁만 하면 한 짝씩 사라져 버리던 내 양말이 밍키의 집 속에 숨겨져 있었다. 모두 외출하고 혼자 있을 때 내 체취를 찾아 양말을 숨겨뒀을 밍키를 생각하니 가슴이 시큰해졌다. 나의 삼십대를 온전히 다 아는 내 친구. 사십대 초반도 견딜만하다고 알려준 내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자 내 삶의 루틴은 확연히 달라져 버렸다. 더 이상 산책을 하지 않았고 발은 사계절 시려웠다. 시려운 발을 움츠릴때마다 포근했던 밍키의 뱃살이 생각났다. 그럴때면 밍키가 아플 때 마다 병원을 드나들며 통장잔고를 먼저 생각했던 내 자신의 이기심에 한없이 눈물이 났다. 나같은 사람은 동물을 돌봐선 안돼, 이런 자책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시 묵향이가 왔다. 이번엔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지만. 둘은 노는 방법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내 발을 가장 최애한다는 것. 묵향이는 가끔 냥펀치를 날리고 잠적을 밥먹듯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면 예의 그 쩍벌자세를 하고 눈키스를 해준다. 허공을 향해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잠을 자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무런 위험도, 위협도 없다는 확신같아서 나는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묵향이는 요플레도 싫어하고 산책은 엄두도 못 내지만 나와 또다른 중장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특별한 친구이자 가족이다. 가끔 사냥한 장난감 쥐를 내 앞에 떨어뜨리고 가는 묵향이를 보며 나는 크게 외친다.
사랑해 묵향아~ 이제 내 발은 더 이상 차갑지 않다.
*김성숙 간결하고 단순한 삶, 여행이 있는 삶, 마음 깊은 곳 글씨를 줍는 삶! 항상 고프다. |
* 나도, 에세이스트 공모전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성숙(나도, 에세이스트)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나도, 에세이스트] 10월 대상 - 그해 겨울, 짭짤했던 정직의 맛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7/6/c/a76c4e191a6babd7e930f8f740b53acd.jpg)
![[나도, 에세이스트] 10월 우수상 -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9/d/d/99ddf5835db232472ee062dbca704e57.jpg)
![[나도, 에세이스트] 10월호 우수상 ? 그의 별명은 미친개였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9/8/d/e98d481d0561705959afc6f4b977d23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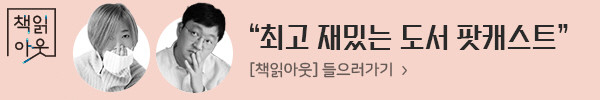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강보라 “못생긴 감정을 숨기고 사는 인물에게 관심이 있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08d14fb.png)
![[송섬별 칼럼] 걔가 개를 데리고 다니기만 했더라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5-3397d7fe.png)
![[송섬별 칼럼] 내 뼈를 보고 싶어 했을지가 궁금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2-56db4c82.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