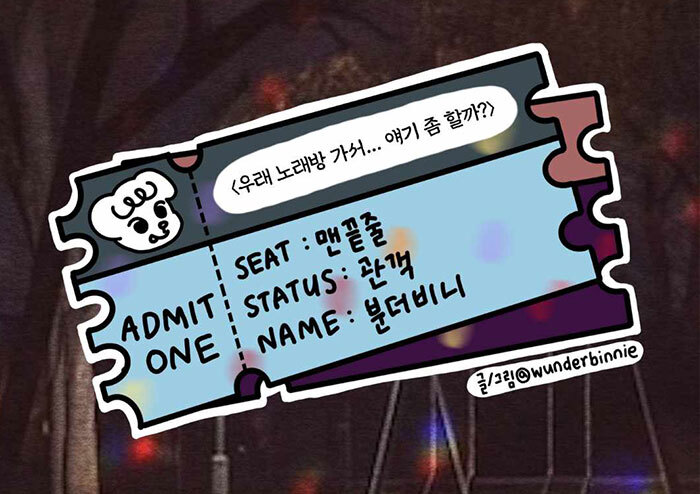상온에서라면 그냥 둬도 녹겠지만 ‘땡’을 할 수 있을 때는 ‘땡’을
상온에서라면 그냥 둬도 녹겠지만 ‘땡’을 할 수 있을 때는 ‘땡’을
나는 꼭 있어야 할 감정이 없는 게 아닐까, 종종 생각한다. 적어도 함량이 부족한 것만은 맞다는 생각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지금은 나도 훨씬 더 슬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상황인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사람은 다른 존재의 아픔에 얼마나 깊이 공명할 수 있는 걸까. 언젠가 ‘위로 잘 하는 사람’을 목표로 삼은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목표는 정말 깨끗하게 포기하긴 했나 보다. 다 부질없다고 여긴 것 같다. 위로를 잘 하는 일이 (사람마다 ‘잘’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중간이라도 가자는 결론을 내린 듯도 하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만 있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긴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일에 점점 더 자주 맞닥뜨린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을 수 있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고, 어떤 말도 행동도 나에게서 나가는 건 다 틀린 것 같고 오히려 화가 될 것만 같아서 무엇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여기에서 그런 고민으로 혼자 주춤하는 동안 거기서는 더 애가 타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니 더 답답한 일이다.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곧 누군가 땡 하고 외쳐줄 거라고. 얼음땡 놀이란 그런 거라고. 누군가 땡 하고 말해줘야 집에 갈 수 있는 거라고.
_윤성희, 『날마다 만우절』, 「어느 밤」 109쪽
물론 그럼에도 무슨 말이든지 해야만 할 때도 있다. 무용하고 무의미하고 뻔해 보여도 그저 내가 여기 있어, 같이 있어, 라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반전도 만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거기 닿아서 마지막의 마지막에 얇디얇은 한 겹의 방패라도 되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머지않아 또 다시 얼음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땡 하고 말하는 것이다. 천천히 녹도록 적당한 온도 아래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땡’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것.
얼마 전에는 고민을 거듭하다 머리를 쥐어뜯다 고요히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언어를 고르고 고르다 말해버렸다. 모르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너무 걱정된다고. 아플까 봐 다칠까 봐 무섭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인 거다. 모두가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게 조언 같은 조언을 건넬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역시 다른 이의 감정에 곧게 닿는 일은 너무 어렵고 가만히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괴롭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많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내가 지키고 싶은 보루.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방어선. 그 너머로 전진하는 날도 오기를. 아니 오지 않기를, 그런 게 필요한 날은 오지 않기를. 그래도 그런 때가 오면 한걸음은 더 갈 수 있기를. 휴... 여전히 혼란한 날들이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형욱(도서 PD)
책을 읽고 고르고 사고 팝니다. 아직은 ‘역시’ 보다는 ‘정말?’을 많이 듣고 싶은데 이번 생에는 글렀습니다. 그것대로의 좋은 점을 찾으며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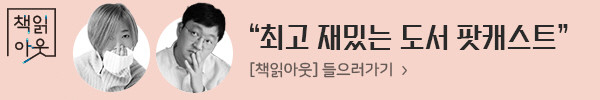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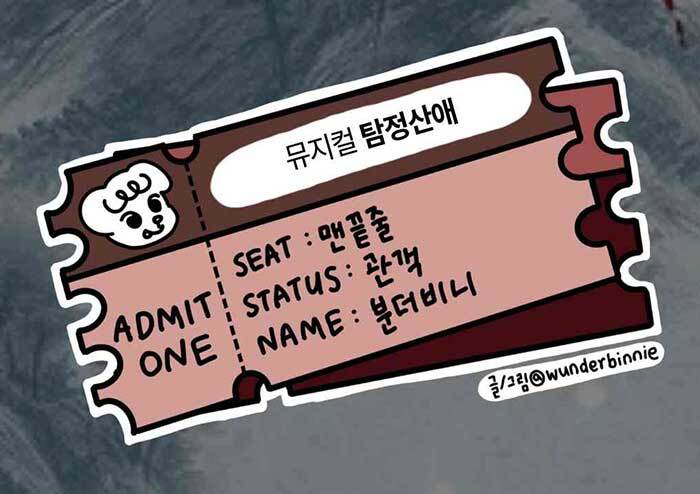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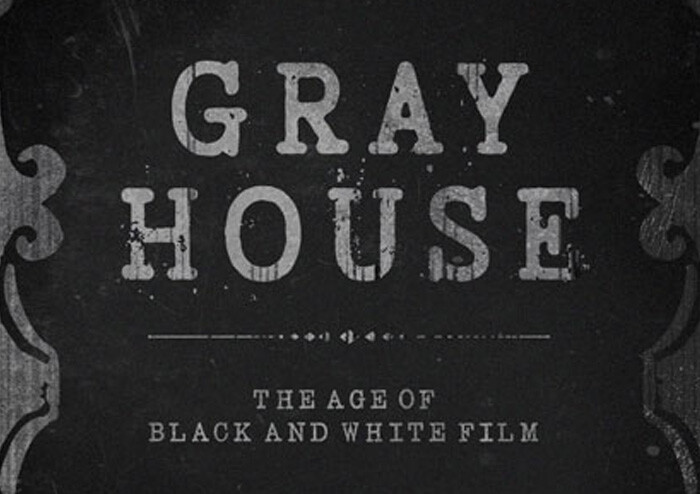
![[이상하고 아름다운 책] 우정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30-c0b54c6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