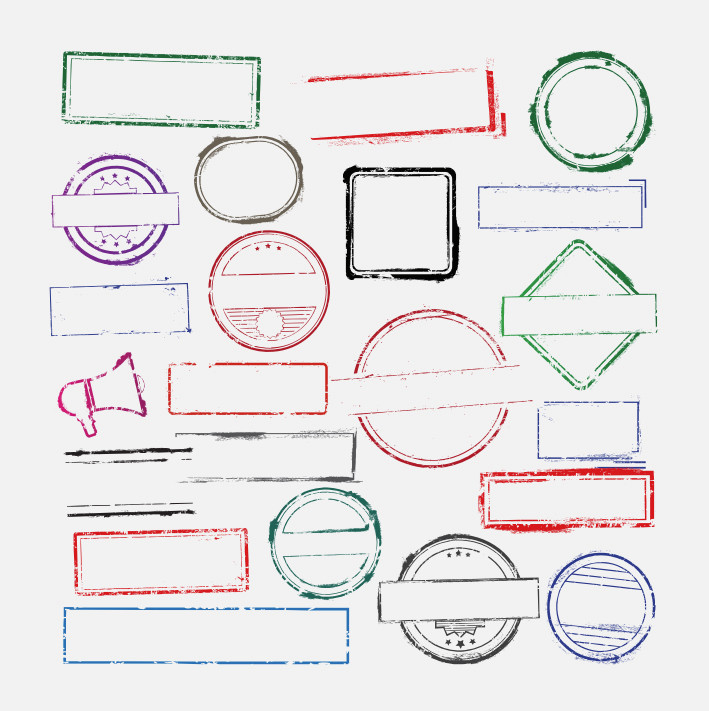
주란 씨.
어젯밤 편지를 쓰려고 앉았는데 쓰지 못했어요. 책상에 앉아 주란 씨의 책들을 몇 번 쓰다듬고, 다시 몇 편을 더 읽었지요. 그런 다음 냉장고에서 에일 맥주 한 캔을 꺼내 꼬깔콘 한 봉지를 먹으며, 유튜브로 ‘잠자는 모습으로 알아보는 고양이 심리 상태’를 시청했어요.
오늘 저는 용기를 내 다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려니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주란 씨 소설을 읽고 나면 할 말이,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져요. 누가 줄거리를 물으면 죽은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 싶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어찌어찌 말한다 해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고 진실보다 더 묵직한 거짓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종일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주란 씨, 중요한 건 뭘까요?
주란 씨 소설은 다 읽고 나면 ‘기분’이 남아요. 알겠는 기분이요. 상황이 아니라 기분을 알겠어서 내가 묽어지는 기분이죠. 저는 다만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주란 씨 소설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해 읽습니다.
우린 두 번 만났지요. 첫 만남은 칼국수 집에서였어요.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황현진 작가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인사를 나눴지요. 그쪽 자리가 파하고 가나 보다 했는데, 황현진 작가와 주란 씨가 나가다 말고 우리 테이블로 와 앉았지요. 모두 좀 취해 있었어요. 우리는 복분자주를 꽤 여러 병 마셨어요. 그랬죠? 당시 저는 주란 씨를 몰랐고, 아직 소설도 읽어보지 못한 때였어요. (미안해요.) 하여간 우린 많이 웃었고 주인아주머니가 와서 그만 떠들고 집에 좀 가라는 언질을 여러 번 준 걸로 기억해요. (우리 그날, 시끄러운 진상이었을까요?) 주란 씨가 놀랍게도 제 시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말해주었고 저는 빈말이려니 했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많이 기뻤답니다. 황현진 작가는 몇 년 전 제주에서 제가 ‘소처럼’ 울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했고, 저는 과연 그렇게 울었던 때가 떠올라 부끄러웠지만 좋았습니다. 소처럼 운다니,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뭐가 그토록 웃긴지 저는 그날 배가 찢어질 정도로 웃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한 시간 동안 소리 내서 엉엉 울다 잠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날 현진 언니(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와 주란 씨, 제 후배, 이렇게 넷이 술을 마셨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린 진짜 슬픈 사람들이야.
우리는 한 번 더 만났어요. 다시 보자고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저녁이었죠. 현진 언니와 주란 씨와 저, 이렇게 셋이 술집에서 만났고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두 분은 서로 친하지만 저는 두 분과 친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지금도 우리 많이 친하진 않지만, 저는 심적으로는 친밀함을 느낀답니다) 술집에서 나온 우리가 살랑살랑 바람을 맞으며 주란 씨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 생각나요. 참새처럼 총총 앞서가던 주란 씨,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골라 우르르 걷던 우리. 딱 주란 씨처럼 꾸며놓은 집. 참, 주란 씨 방은 보자마자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마음에 들어 사진으로 찍어두었죠. 그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많이 웃고 떠들고 마시던 기억만 남았어요. 제가 주란 씨 책상에 놓인 타원형의 탁상 거울이 예쁘다 하니 집에 갈 때 그걸 꼭 주고 싶다고 한 거 기억해요? 두 개를 샀다며 꼭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사양해야 한다고 머리가 말하는데, 가슴이 그걸 냉큼 받고 싶어 했어요. 거울이라니. 주란 씨가 주는 거울이라니! 하면서요. (이때 저는 이미 주란 씨 소설을 좋아하는 팬이 되어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화장대에 놓인 주란 씨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로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어요. 그날 거울 말고도 주란 씨가 ‘언니가 직접 만든’ 거라며, 미리 포장해둔 쿠키를 선물로 주었죠.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일이 좋아서 무척 행복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내내 그래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울지 않았어요.
선물 받은 거울을 화장대 위에 잘 놓아두고 양치를 한 뒤 푹 잤습니다.
주란 씨, 첫 소설집 『모두 다른 아버지』에서 마지막에 실린 단편 「참고인」 있잖아요. 그 소설을 참 좋아해요. 그 소설엔 제가 들어 있거든요. 여기저기 편편히, 하여간 들어 있어요. 끝부분에 주인공과 언니의 대화 장면을 기억해요. 울고 싶었으나 울지 못했는데, 꼭 눈물에 체한 기분이었어요.
주연아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무슨 힘이 나.
왜. 니 얼굴 보니까 이제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잘 살아.
지금의 나를 세 번째 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언니.
진짜 나는 어디선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언니 눈을 봤다.
아, 그리고 진짜 너도.
진짜 나는 어디선가 되게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 태어나면서부터 내내 중얼거린 말 같아요. 되게 심각하게는 아니고, ‘지금의 나’보다 더 ‘괜찮아야 마땅할 나’를 수없이 만들어보는 일이요. 그 마음이 뭔가를 쓰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평소에 거의 연락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어느 날 문득 또 만날까요? 현진 언니에게 복분자주를 사달라고 할까요? 별 얘기도 없이 속을 나눈 것 같은 사람들과 술을 마셔요. 저는 주란 씨 소설 속 인물들이 힘들고 슬픈 일을 겪은 뒤에 밥을 하고, 상을 차리고, 장을 보고, 일을(그렇죠, 일을!) 하러 가는 걸 보는 게 힘들면서 좋아요. 그게 딱 삶이잖아요.
주란 씨 소설은 극적인 장면 없이 고루 팽팽하고, 대단한 플롯 없이도 완벽하며, 시 없이 시로 가득하고, 청승 없이 슬픔의 끝점을 보여주죠. ‘도―’라는 음계만으로 이루어진 음악 같고, 연노랑으로 그린 핏물 같고, 발 없이 멀리 가는 구두 한 켤레 같고, 또…. 제가 잘 아는 세계, 잘 아는 사람, 오래 지켜온 비밀을 모아둔 화단 같아요. 다시 들여다보면 슬프고, 괴롭고, 안도하게 되는. 무엇보다 잘 쓰려는 의지 없이 제대로 말해버리는, 작가의 태도가 매력적이지요. 감정을 꾹꾹 눌러 ‘여백’이라는 큰 방을 만들어두면 저는 거기 들어가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글을 어떻게 쓰든, 저는 무조건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열렬히 쓰는 나머지 너무 지치지 말고, 쉬엄쉬엄 주란 씨가 쓰고 싶은 대로, 맘껏 써주세요. 주란 씨가 자유로운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끼는 소설가들(많아요!) 중 주란 씨는 제 마음속의 ‘책갈피’처럼 깊숙이 끼워놓고 싶은 작가예요. 뭐든 기억하고 싶어서요. (좀 간지러우면 긁으세요)
글을 써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빌게요.
덧)
그날 주란 씨 방에서요.
하모니카 불어준 거, 좋았어요.
당신의 팬, 박연준 드림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모두 다른 아버지
출판사 | 민음사

박연준
파주에 살며 시와 산문을 쓴다. 시, 사랑, 발레, 건강한 ‘여자 어른’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무언가를 사랑해서 까맣게 타는 것이 좋다. 『쓰는 기분』 등을 썼다.







![[당신의 책을 기다립니다] 식물성 상상력을 가진 이유리 소설가에게 - 박서련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c/c/e/acce72ca22abdbecf5714407cab0f8bc.jpg)
![[양지훈의 리걸 마인드] 학벌주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b/1/0/3b10bfd042b9ab3e8c94cb879aa58ad8.jpg)
![[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 북튜버로 3년 살아보니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1/c/6/f1c629c456b32169746cb3bdf435b5c1.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tnwl0733
2025.05.19
봄봄봄
2022.02.08
봄봄봄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