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곳곳
『나의 눈부신 친구』
올해 초에 『타워』를 번역 출간하기로 한 이탈리아 출판사(Add Editore)의 편집자가, 이탈리아에 방문해서 출간 기념행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누군가 내 책을 알리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나는 그러겠노라고 흔쾌히 승낙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의 3년 만의 해외 출장이었다.
내가 이탈리아 작가의 소설을 읽고 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자 친구가 말했다.
"청중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면 BTS나 블랙핑크의 노래를 공부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북토크 중간에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객석에서 묘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앗, 들켰다!'하는 웃음이다. 그러고 나면 객석의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진다. 열흘간 여섯 개 도시를 도는 전국 투어 일 정 내내 행사장의 객석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이런 관심이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덕인 게 분명 하지만,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케이팝 팬들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대개 한국 문학 아니면 국제 정치학(동아시아 지역 연구)이다. 나의 책 『SF 작가입니다』에서 누누이 말했듯 나는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SF 소설을 쓰게 된 작가이고, 이탈리아에서 내가 만난 독자의 상당수는 나와 거의 비슷한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물론, 이탈리아 문화를 존중하는 내 가방에는 이탈리아 작가의 소설이 들어 있었다. 엘레나 페란 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는 '나폴리 4부작'의 첫 권인데, 소설 속에 담긴 나폴리의 일상은 나폴리에 대한 한국 관광객들의 선입견보다도 험악해 보이는 삶이었다. 아니, 어떻게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초등학생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직항편이 없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우회하느라 처음 비행기 표를 샀을 때보다 비행시간이 두 시간이나 더 늘어난 기나긴 항로에서, 나는 투어의 두 번째 도시인 나폴리의 치안 상황에 대해 오래오래 생각했다.
다행히 나를 집어 던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실은 관광객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와 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첫 행선지인 베네치아에서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북 페스티벌(Incroci di Civilta, 문명의 교차로)'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수상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보통은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쓸쓸히 돌아서고 만다는 바로 그 수상 택시다.
문제의 나폴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무서울 만큼 운전이 험한 도시인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이탈리아인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그거 알지, 알지' 하는 웃음이다.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요리를 따로 고를 필요도 없이 뭘 먹어도 다 맛있는 음식 때문이다. 현지에 사는 한국인이 아무 식당에나 가서 먹어보라고 권한 감자 파스타(pasta e patate)는, 그래서 길을 안 건너도 되는 호텔 바로 뒷골목 식당에서 먹은 그 파스타는, 감히 말하건대 평생 먹어본 모든 파스타 중 최고다.
피자를 정말로 한 사람당 한 판씩 게 눈 감추듯 해치우는 용맹한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깨작깨작 겨우 절반만 먹고 나머지 반은 포장을 부탁하는 나약한 한국인은, 대화 중에 언급되는 표준어와 사투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엘레나 페란테 소설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이탈리아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표준화된 언어다. 『나의 눈부신 친구』의 공부 잘하는 어린이는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친구들과 싸울 때는(돌로 머리를 칠 정도다) 나폴리 사투리로 욕을 해댄다. 바로 그 '표준어'가 현대의 이탈리아어고,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사투리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다른 지역 출신 이탈리아인은 공교롭게도 나폴리 폭력 조직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예로 든다.(이걸 들은 곳은 나폴리가 아니었다) 정말 절묘한 독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여섯 번의 북토크에서 대담 파트너들과 같은 대목을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각각 낭독하면서, 나는 이탈리아어로 바뀐 내 문장이 훨씬 더 음악적이고 격정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했다. 표준 한국어는 억양을 다 죽여버린 말인데다, 문장이 전부 '-다'로 끝나서 격정을 담을 공간이 없다. 평소에 낭독을 벌칙으로 여기는 SF 작가임에도, 다음에 쓸 내 소설에는 격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을 반드시 넣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 내 소설을 그 멋들어진 언어로 바꾸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놀랍도록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관해. 경험에 미루어보건대 보통 이런 건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 의아하지만, 그게 내 편집자나 번역자, 대담 파트너 그리고 통역자의 선택과 노력을 가볍게 여길 이유는 못 된다. 몇 번 생각해도 매우 달가운 행운이므로, 나는 이탈리아에서 책 몇 권을 더 내고, 기회가 생기면 다시 이탈리아에 갈 마음을 먹는다. 나폴리에도, 베네치아에도, 볼로냐와 밀라노와 토리노와 이브레아(Ivrea)에도.
한국에서도 안 해 본 전국 투어의 여파로 귀국 후 한동안 몸살을 앓고 코피를 흘리면서, 마침내 나는 이 출장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냥 책 한 권이 낯선 언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내가 이탈리아에서 새로 데뷔를 했구나라고.
제목의 『La Torre』는 '타워'의 이탈리아어 표기입니다. |
*배명훈 2010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연작 소설 『타워』는 그의 첫 소설집이다. 소설집 『안녕, 인공존재!』, 『총통각하』, 『예술과 중력가속도』, 장편 소설 『신의 궤도』, 『은닉』, 『맛집 폭격』, 『첫숨』, 『고고심령학자』, 『빙글빙글 우주군』, SF 동화 『끼익끼익의 아주 중대한 임무』, 중편 소설 『가마틀 스타일』, 『청혼』, 단편 단행본 『춤추는 사신』, 『푸른파 피망』, 에세이 『SF 작가입니다』 등을 썼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배명훈(소설가)
2005년 11월에 SF 작가로 데뷔했다. 2009년 첫 책인 『타워』를 시작으로 『첫숨』, 『예술과 중력가속도』, 『고고심령학자』 등 열네 권의 SF 단행본을 출간했다.







![[특별 인터뷰] 왕가위의 세계 30주년, 정태진 대표가 전하는 뒷이야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9/f/1/b9f108ba42f7ba862e591a97474b4ebe.jpg)
![[여행 특집] 별점 5개의 책 - 임수연 <씨네21> 기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6/4/a/364a6c14edc9006f195350ae498e7dd5.jpg)
![[여행 특집] 물고기를 잃고 바다를 얻은 이야기 - 콘텐츠 기획자 김나영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6/4/2/76425d362782b5ce78d445230b813617.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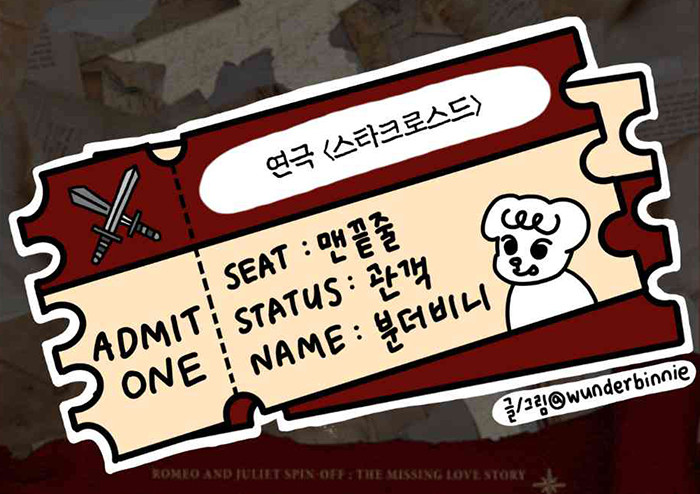
![[미술 전시] 동시대 미술의 반짝이는 ‘현재성’](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6-4137b8d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