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teen)이 신보를 발표했습니다. 음악비평지로 유명한 < 롤링스톤 >은 이 앨범에 만점을 평하며 “브루스가 만든 앨범 가운데 음악적으로 가장 소용돌이치는 앨범”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우리를 매혹시키는지 소개합니다. 더불어 못(Mot)이라는 2인조로 활동하던 이이언의 솔로 앨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장필순의 ‘스파이더맨’ 작곡자로 유명한 윤영배의 신보도 소개해드립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 Wrecking Ball >
새 천년에도 지속적인 음반과 공연 활동으로 언제나 돌아왔지만 이번은 제대로 ‘돌아온 보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성기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브랜드는 말할 필요 없이 포효하는 미국적 로큰롤이다. 「Born To Run」, 「Hungry heart」, 「Born in the USA」가 말해주는 그의 에너지 넘치는 업 템포 로큰롤은 그의 매니저인 존 랜도로 하여금 평론가 시절 ‘로큰롤의 미래를 봤다!’는 고성(高聲)을 토하게 했다.
움츠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진 그의 록은 누군가의 표현대로 ‘부활의 음악’이다. 부활의 원천은 사운드만이 아니라 한사코 ‘노동계급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면서 미국 정부와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좌파적 메시지에 있다. ‘블루 컬러의 대변인’이란 위상에서 보스란 별명이 나왔다.
 |
 |
신보는 그간의 차분한 기조에서 벗어나 전성기 시절의 강성 사운드와 메시지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컴백’이다. 롤링스톤 지의 베테랑 평론가 데이비드 프릭은 “브루스가 만든 앨범 가운데 음악적으로 가장 소용돌이치는 앨범”이란 리뷰를 썼다. 이 잡지는 앨범에 만점인 별 다섯 개를 줬다.
앨범과 동명의 「Wrecking ball」을 비롯해 「We take care of our own」, 「Shackled and drawn」 등 대놓고 지른 곡 말고 「Jack of all trades」와 「You've got it」과 같은 어쿠스틱 질감의 노래들도 클라이맥스 대목에서는 끝내 목청과 연주의 볼륨을 높이고 만다. 숨을 쉬지 않고 힘을 연결해 터뜨리는 파워 보컬의 「Death to my hometown」은 노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다. (1949년생인 그는 우리 나이로 64세다)
사운드의 이음새를 만들어내려는 루프(loop) 사용의 극대화와 첫 싱글 「We take care of our own」이 보여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스트링 섹션 강화 역시 백업 밴드 이 스트리트(E Street) 밴드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덩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과거 ‘월 오브 사운드(Wall of sound)’와 작법이 기본적으로 같다.
편곡은 다채롭다. 「Rocky ground」는 조심스럽게 여성 미셀 무어의 느린 래핑을 시도했고 마지막 곡 「We are alive」는 아일랜드 포크의 냄새가 물씬하다. 앨범에서 돋보이는 「Land of hope and dreams」는 가스펠 풍으로 전개를 시작하며 후반부에는 지난해 사망한 이 스트리트 밴드의 골든 멤버 클레어렌스 클레몽스(Clarence Clemons)의 색소폰 연주를 들을 수 있다. 「Jack of all trades」의 트럼펫 간주가 전해주듯 여러 곡에서 국가의례의 행진곡 스타일을 취한다. 미국적, 백인적인 느낌은 피할 수 없다.
메시지를 빼놓고 앨범의 진정성을 다룰 수 없다. 노동자계급에 천착해온 그는 근래 월가(Wall street) 점령 시위에 충격 받아 이력 최초로 ‘넥타이를 착용한 사람’ 즉 ‘화이트 컬러민중’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Easy money」, 「Shackled and drawn」, 「This depression」, 「Rocky ground」 등 노래 제목에 이미 뚜렷하듯 재정위기, 분배 불평등과 같은 처참한 경제현실을 통타한다.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지극히 브루스 스프링스틴다운 면모는 도탄에 빠진 민중의 눈을 가리고 마냥 희망을 설파하는 긍정심리학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꿈을 지키라는 후반 수록곡의 결론에서 읽을 수 있다. 아무리 고달파도 미국은 여전히 희망과 꿈의 땅이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쇠락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이 끝나는 법은 없다. 음악적 창의와 새로움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앨범의 감동이 있다. Land of hope and dreams! We are alive!!
이이언(eAeon) < Guilt-Free >
수년 동안 음악에 투신한 아티스트의 고집은 독특한 형태감으로 다가온다. 초현실주의로 다가왔던 못(MOT)과 달리 솔로 앨범은 의미와 주석을 달지 않은, 사실과 초근접한 정물화와 비슷하다. (그것이 비록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도) 오랜 시간 정물화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옛이야기 속 프랑켄슈타인이 지나간다.
과학자는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
 |
 |
못 시절부터 그는 왜곡이나 굴절에 천착했다. 신작은 관습적인 악기를 의도적으로 변주시킨다. 「너는 자고」는 기타와 현악기의 기본 주법에서 어긋나있다. 이런 관성은 리메이크를 통해서도 분명히 등장한다. 현진영의 1집 수록곡 「슬픈 마네킹」과 인디록밴드 짜르(Czars)의 「Drug」을 철저하게 변종시켰다. 축축한 바리톤의 존 그랜트(John Grant)의 음성은 희미하게 산화되고, 깊게 떨어지는 어쿠스틱 기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잿빛으로 바랜다.
무(無)의 상태에서 소리를 축조하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성대라는 악기를 적합하게 연주한다. (확실히 스펙트럼은 한정되어 있다.) 감정을 잘라낸 창백한 목소리(SCLC), 앓는 자의 무기력한 탄식(5 In 4), 중성적인 발설(세상이 끝나려고해), 기묘하게 끈적거리며 새어나오는(창문, 자동차, 사과, 모자) 보컬은 기계음과 도킹(Docking)하며 기괴함과 신비로움으로 반짝인다.
여기에 리듬은 매혹적인 촉매가 된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리듬은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못에서 시도했던 「11 Over 8」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5 in 4」, 초시계처럼 바쁜 「SCLC」가 이를 담보한다. 박자의 분절과 변칙을 통해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은 접점을 발견한다.
이 영민한 아티스트는 음악의 매력이 멜로디라는 것쯤은 간파하고 있다. 「Bulletproof」는 귀에 잘 박히는 리프로 대중적인 감수성을 놓지 않고, 「세상이 끝나려고해」는 무기를 연상시키는 금속음과 현악을 대비시켜 세기말적인 정서와 퇴폐미를 드러낸다. 더욱이 보컬에서 조금만 빗겨 들으면 전혀 새로운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온통 모노톤이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덕에 들을 때마다 질감이 다르다. 이를 친절하게 새겨놓은 작업이 인스트루멘탈 버전이다.
디지털로 재단한 사운드 디자인은 한계를 잊는다. 문학과의 콜라보레이션도 파격적이다. 못에서 선보였던 한 편의 추리음악 「다섯 개의 자루」가 더욱 진화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는 소설가 김영하의 목소리와 텍스트로 음악의 고루한 울타리와 즐거움을 확장시킨다. 음악은 구체적인 발현물이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속성을 문학과 결합시켜 새로운 흥미와 신선함을 관철한다. 그는 이다지 집요하게 빅뱅을 실험하고 카오스를 감행한다. 머지않아 궁극의 음계(音界)가 임박했음을 전한다.
윤영배 < 좀 웃긴 >
40대 후반의 남자는 17년 만에 자기의 목소리로 세상에게 말을 건다. 그저 평범한 이는 아니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의 입상자로, 하나음악과 푸른곰팡이의 일원으로 걸출한 능력을 뽐내는 뮤지션이다. 그는 앨범의 의미를 자신의 상태와 생각을 남기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간 그는 ‘좀 웃긴’ 모드가 되어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정말 ‘웃기다’는 이야기인지 ‘우습다’는 뜻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
 |
친절하게도 보도자료는 그가 음악을 만들던 당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친한 형의 집(조동익)에서 노래를 녹음하기 시작했다는 평범한 일과는, 여행을 온 친구(이상순)와 또 다른 이웃(장필순)의 즉석 연주로 완성된다. 알고 보면 범상치 않은 작업비화처럼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걸어왔다. 갑작스러운 네덜란드 유학에서 제주도까지, 그리고 두리반과 두물머리 같은 논쟁 속으로 몸을 아끼지 않는다.
음악의 주식(主食)은 여전히 ‘삶’이다. 고적한 산 속에서 울리는 작은 메아리. 생의 밭을 일구는 고단한 농부의 소사(小事)가 담겨있다. 맑은 톤의 어쿠스틱 기타는 가볍게 질주하고, 「소나기」와 「소나무 숲」은 투명하고 거짓이 없다. 이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국적이거나 근사한 풍경은 아니다. 차라리 낯익고 한적한 시골의 경치다. 그러므로 고백컨대, 어떤 이의 귀에는 극히 밋밋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총 10곡이지만 실상 5곡이다. 반쪽은 마스터링을 달리한 수록곡들이다. 한 버전은 최대한 손이 타지 않은 녹음 현장 그대로의 상태이고, 다른 버전은 기계로 매끈하게 다듬질했다. 다른 뮤지션의 경우는 망설임 없이 리마스터링 버전을 택했겠지만, 선택보다는 포용을 좋아하는 그는 두가지 버전 모두 품었다. 앨범은 흥미롭게도 이런 뮤지션의 성격과 성품도 그대로 투영한다. 삐뚤삐뚤하지만 가감 없이 써내려간 속 깊은 독백이다.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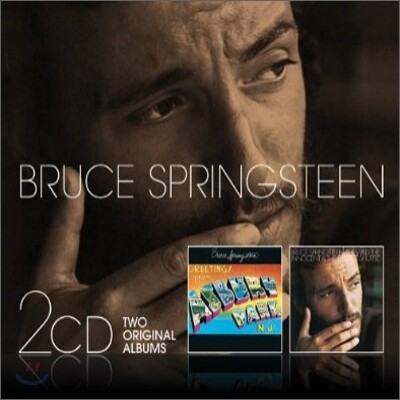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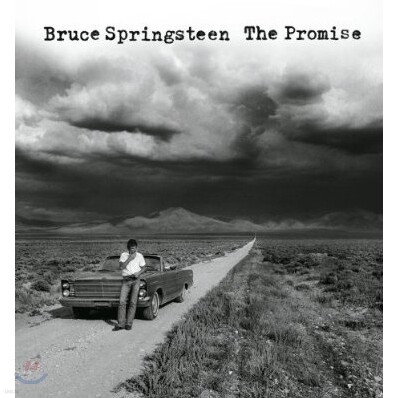



![[더뮤지컬] <생계형 연출가 이기쁨의 생존기> 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ed15443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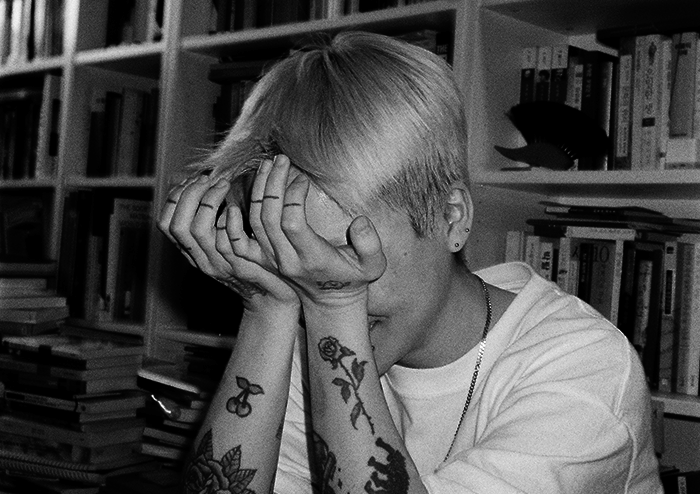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천사
2012.03.15
rkem
2012.03.15
앙ㅋ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