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가장 위대한 무명의 기타리스트 - 로이 부캐넌
복잡다단한 자신의 내면을 기타 한대에 담아내는 연주는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로 칭송받는다. 기타 연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인으로 통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그가 추구해온 음악과는 상반된 연주를 강요했던 음반사에 대한 강한 반감은 음악 인생의 괴리감을 불렀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취한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등의 기타리스트들과는 달리 대중들로부터는 소외당했던 상황 역시 심각한 고독으로 다가왔다.
2013.02.22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술가는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잔인한 명제로 들리지만, ‘가장 위대한 무명의 기타리스트’라 불리는 로이 부캐넌의 사례를 보면 아주 틀린 명제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명반은 불세출의 기타리스트였으나 사후에야 이름을 남긴 로이 부캐넌의 데뷔앨범입니다.
로이 부캐넌(Roy Buchanan) < Roy Buchanan > (1972)
“가장 위대한 무명의 기타리스트(The World's Greatest Unknown Guitarist)”는 로이 부캐넌의 지칭이다. 위대함과 무명, 어찌 보면 명예와 불명예가 뒤섞인 아이러니한 칭호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블루스 기타리스트 중 1인자로 인정받는 그였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발사를 겸업하기도 한다. 죽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론을 바탕으로 했다.) ‘세상은 도대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에 대한 강박은 마약과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졌고, 술주정으로 아내를 구타해 입건된 구치소에서 셔츠에 목을 매 자살한다. 너무도 위대한,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연주자 로이 부캐넌은 스스로 비극을 택했다. 이후 가려졌던 이름은 대중에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죽음으로 말미암은 유명세를 타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비운의 기타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기타 연주에 대한 상념에 잠겨봤다거나 블루스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록 기타에 열광하는 이라면 부캐넌만의 ‘기타 경련’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미학은 펜더 텔레케스터의 까랑거리는 본연의 사운드가 밑바탕이다. 별다른 이펙터 없이 순전히 손맛으로만 소리를 주조해낸다. 블루스 기반의 컨트리와 로커빌리의 서민적인 음악을 기조로하지만 그 안락함 속에서 화염처럼 터지는 광기의 오버 톤은 자신을 대변한다. 늦깎이 데뷔작 < Roy Buchanan >에는 기타의 대가 반열에 올려놓는 ‘일렉기타의 황홀경’으로 가득하다.
머리곡 「Sweet dreams」는 출렁이는 오르간 소리의 딕 하인츠(Dick Heinze)와 절정의 호흡을 맞춘다. 목가적 기운의 방랑가(歌) 「I am a lonesome fugitive」의 중반부 기타 솔로와 로커빌리 풍의 연주곡 「Cajun」에서 들려오는 앙칼진 소리는 확연한 독자성으로 빛난다. 로이의 감성이 철저히 전이되는 「John's blues」는 심금을 울리는 애절함이 있다. 조니 퓰러(Johnny Fuller)의 로커빌리 넘버 「Haunted house」는 원곡의 강렬함과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기타 연주로 살려냈다.
7분여의 향연이 전개되는 「Pete's blues」는 아메리칸 블루스 록의 수호자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작품이다. 컨템포러리 컨트리의 아버지 행크 윌리엄스(Hank Williams)의 원곡을 재즈풍으로 재해석한 「Hey, good looking」의 마무리는 앨범의 다양한 색채를 가미한다. ‘오로지 블루스!’라는 식이 아니다. 블루스, 재즈, 컨트리 어느 영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같은 범위에 둔다.
Roy Buchanan-The messiah will come again(LIVE 1976)
고해성사와 같은 독백으로 시작하는 「The messiah will come again」은 그의 이름을 드높이는 마스터피스다. 슬픔이 베어져 있는 바이올린 톤은 곡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핑거링으로 피킹감을 살려내 탁탁 튀기는 듯 들려오는 톤 매이킹, 피킹 하모닉스로 과도한 오버 톤을 구사함은 ‘기타가 울고 있다’는 진한 감성의 수식어를 낳았다. 볼륨 주법과 볼륨 트레몰로 주법 또한 그의 장기이다. 독자적인 연주법에서도 쉽고 친근하게 들려오는 멜로디 라인을 뽑아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전한다.
곡의 마력은 수많은 기타리스트를 울렸다. 연주에 감동한 제프 벡이 < Blow By Blow >(1975)의 대표곡 「Cause we've ended as lovers」를 통해 헌정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며, 이에 부캐넌은 자신의 작품 < A Street Called Straight >(1976)에서 「My friend Jeff」라는 곡으로 화답하기도 한다. 그를 정신적 지주로 여겨왔던 개리 무어 또한 < After the War >(1989) 앨범에 「The messiah will come again」을 수록하며 원곡의 섬세함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준다. 더 밴드(The Band)의 기타리스트 로비 로버트슨(Robbie Robertson)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기타 연주 중 가장 위대하다.”라며 절대 명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복잡다단한 자신의 내면을 기타 한대에 담아내는 연주는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로 칭송받는다. 기타 연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인으로 통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그가 추구해온 음악과는 상반된 연주를 강요했던 음반사에 대한 강한 반감은 음악 인생의 괴리감을 불렀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취한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등의 기타리스트들과는 달리 대중들로부터는 소외당했던 상황 역시 심각한 고독으로 다가왔다.
로이 부캐넌(Roy Buchanan) < Roy Buchanan > (1972)
“가장 위대한 무명의 기타리스트(The World's Greatest Unknown Guitarist)”는 로이 부캐넌의 지칭이다. 위대함과 무명, 어찌 보면 명예와 불명예가 뒤섞인 아이러니한 칭호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블루스 기타리스트 중 1인자로 인정받는 그였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발사를 겸업하기도 한다. 죽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론을 바탕으로 했다.) ‘세상은 도대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에 대한 강박은 마약과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졌고, 술주정으로 아내를 구타해 입건된 구치소에서 셔츠에 목을 매 자살한다. 너무도 위대한,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연주자 로이 부캐넌은 스스로 비극을 택했다. 이후 가려졌던 이름은 대중에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죽음으로 말미암은 유명세를 타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비운의 기타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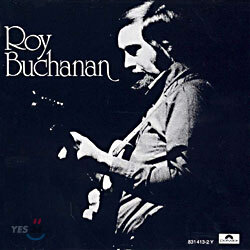 |
머리곡 「Sweet dreams」는 출렁이는 오르간 소리의 딕 하인츠(Dick Heinze)와 절정의 호흡을 맞춘다. 목가적 기운의 방랑가(歌) 「I am a lonesome fugitive」의 중반부 기타 솔로와 로커빌리 풍의 연주곡 「Cajun」에서 들려오는 앙칼진 소리는 확연한 독자성으로 빛난다. 로이의 감성이 철저히 전이되는 「John's blues」는 심금을 울리는 애절함이 있다. 조니 퓰러(Johnny Fuller)의 로커빌리 넘버 「Haunted house」는 원곡의 강렬함과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기타 연주로 살려냈다.
7분여의 향연이 전개되는 「Pete's blues」는 아메리칸 블루스 록의 수호자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작품이다. 컨템포러리 컨트리의 아버지 행크 윌리엄스(Hank Williams)의 원곡을 재즈풍으로 재해석한 「Hey, good looking」의 마무리는 앨범의 다양한 색채를 가미한다. ‘오로지 블루스!’라는 식이 아니다. 블루스, 재즈, 컨트리 어느 영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같은 범위에 둔다.
Roy Buchanan-The messiah will come again(LIVE 1976)
고해성사와 같은 독백으로 시작하는 「The messiah will come again」은 그의 이름을 드높이는 마스터피스다. 슬픔이 베어져 있는 바이올린 톤은 곡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핑거링으로 피킹감을 살려내 탁탁 튀기는 듯 들려오는 톤 매이킹, 피킹 하모닉스로 과도한 오버 톤을 구사함은 ‘기타가 울고 있다’는 진한 감성의 수식어를 낳았다. 볼륨 주법과 볼륨 트레몰로 주법 또한 그의 장기이다. 독자적인 연주법에서도 쉽고 친근하게 들려오는 멜로디 라인을 뽑아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전한다.
곡의 마력은 수많은 기타리스트를 울렸다. 연주에 감동한 제프 벡이 < Blow By Blow >(1975)의 대표곡 「Cause we've ended as lovers」를 통해 헌정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며, 이에 부캐넌은 자신의 작품 < A Street Called Straight >(1976)에서 「My friend Jeff」라는 곡으로 화답하기도 한다. 그를 정신적 지주로 여겨왔던 개리 무어 또한 < After the War >(1989) 앨범에 「The messiah will come again」을 수록하며 원곡의 섬세함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준다. 더 밴드(The Band)의 기타리스트 로비 로버트슨(Robbie Robertson)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기타 연주 중 가장 위대하다.”라며 절대 명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복잡다단한 자신의 내면을 기타 한대에 담아내는 연주는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로 칭송받는다. 기타 연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인으로 통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그가 추구해온 음악과는 상반된 연주를 강요했던 음반사에 대한 강한 반감은 음악 인생의 괴리감을 불렀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취한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등의 기타리스트들과는 달리 대중들로부터는 소외당했던 상황 역시 심각한 고독으로 다가왔다.
|
“기타는 마음이고 성격이다. 내가 슬프면 기타가 울고, 기쁘면 웃어준다. 나를 반영할 줄 아는 연주인이 결국 끝까지 남는 법이다.”-로이 부캐넌 | ||
글/ 신현태 (rockershin@gmail.com)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1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10월 2주 채널예스 선정 신간 [인문/과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7/b/5/a7b5957ac358c62916c8d2ec5d541cba.jpg)
![[칼럼]<킹키부츠> 있는 그대로의 로렌](https://image.yes24.com/themusical/upFiles/StageTalkV2/Magazine/20240927/2024092729878083c28bb7183786a31816aef4259a245854.jpg)







가비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