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Y의 부모는 누가 봐도 다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으로 은퇴했다. 적잖은 액수의 연금을 다달이 수령했고, 잔병 없이 건강했으며, 무엇보다 두 분의 사이가 좋았다. 물론 Y의 어머니는 그것이 평생에 걸친 자신의 무던한 인내로 이루어진 평화라고 주장하시곤 했다. “내가 다 맞추며 사니 이만한 거지. 저 양반 불쌍해서 참고 사는 거야.” 그것이 그녀의 주장이라고 했다. 간혹 한숨도 곁들이신다고 했다.
맏딸인 Y는 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사실 그 말씀은 이 땅의 아버지들과 같이 사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하소연이 아니던가. 그리고 어머니의 한숨 섞인 푸념에 열심히 귀 기울인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도 없어보였다. 어쩌면 Y가 염려하는 건 달라지는 건지도 몰랐다. 무언가가 변하는 것. 그건 부모님의 삶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을 의미할 터였다.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혹여 자신의 삶 또한 흔들리게 될까봐 그녀는 어머니의 푸념을 그저 웃어넘기곤 했는지도 몰랐다. 자식들이란 대개 그 모양이니까.
Y의 어머니가 급작스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일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다. 내게 부고가 전해진 건 그로부터 한 계절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머니를 여읜 슬픔에 푹 빠진 Y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맞닥뜨려야 했다. “아빠가 큰일이야.” “왜? 아버님도 어디 편찮으셔?” “아니. 그건 아닌데.” Y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밥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Y의 아버지에게 닥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그거였다. 세끼 식사. 한창 손 많이 가는 쌍둥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딸도, 외국에 사는 며느리도 돕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Y는 말끝을 흐렸다. “계속 바뀌어.” “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네.” Y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간이 짜거나 싱겁거나 그렇다고 하셔. 다들 넘치거나 모자란다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의 입맛은 수십 년에 걸쳐 아내의 간에 길들여져 왔으니. 한 사람의 혀의 감각을 ‘딱 맞추는’ 손의 감각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줌파 라히리의 『그저 좋은 사람』에 수록되어 있는 중편소설 「길들지 않은 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이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이면서, 인도계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한 늙은 남자가,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딸인 루마와, 아버지인 ‘그’의 시점을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사는 루마는 멀리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존재가 늘 부담스럽다.
‘루마의 아버지는 이제 밥을 손수 해 먹으며 혼자 지냈다.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 그 주변이 어떨지 루마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아버지는 펜실베니아에서 루마가 잘 모르는 동네에 있는 원베드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버지를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루마는 아버지를 책임져야 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술은 전혀 다르다.
‘요즘은 얼마나 홀가분한지, 혼자 여행을 하니 가방은 하나만 부쳐도 되었다. (중략)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이 구름을 가리는 게 없듯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오랜만에 딸의 집을 방문한 아버지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부녀는 크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어쩐지 버석거리고 서걱거리는 느낌이다. 루마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게 의존적이 되는 것은 도리어 딸이다. 아버지는 어쩐지 예전 가족이 모여 살 때와 미묘하게 달라진 것도 같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늘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버지’인 줄로만 알았었다. 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불안해진다. 손자를 담담하고 자상하게 돌보는 아버지에게 여기서 함께 사시자고 제안하는 루마의 속내는 아마 그 새로운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대답한다. “여긴 좋은 곳이다, 루마야. 하지만 이건 네 집이지. 내 집은 아니야.”
아버지는 이미 혼자 하는 생활, 누구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단출하고 자유로운 삶에 올라탄 상태다. 딸의 상상 속에서처럼 궁상맞고 고독한 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정인도 그리워하는 또 다른 삶이다. 딸의 합가 제안을 받은 그의 속마음은 이렇다.
‘자신의 일부는 언제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그 제안을 뿌리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건 달랐다. 그는 다시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복잡함과 불화, 서로에게 가하는 요구, 그 에너지 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딸 인생의 주변에서 그 애 결혼생활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Y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느새 5년여가 훌쩍 지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사신다. Y의 말에 따르면 퍽 바쁘게 지내신다고 했다. “산악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사이클도 타시고 아무튼 당신 건강에 엄청 신경 쓰시는지 몰라.” “얼마나 다행이니?” “그럼. 다행이지.” Y가 중얼거렸다. 자식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가까이 지내는 여자분도 생기신 눈치라고 했다. 집에서 하는 식사는 대부분 직접 차려 드신단다. “내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글쎄 그러시네.” Y가 덧붙였다. “예전엔 우리 아빠 보온밥솥도 못 여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Y의 콧잔등이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보기에 복잡 미묘했다. 어쩌면 우리는 꽤 자주 아버지라는 이름의 남자를 오해하고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날 내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
그저 좋은 사람 줌파 라히리 저/박상미 역 | 마음산책
가족, 연인, 친구 등 밀착된 관계를 다루면서도 그 속에 담긴 복잡함과 불화 등을 묘파한다. 『그저 좋은 사람』에 수록된 여덟 편의 단편은 케임브리지에서 시애틀로, 인도에서 타이로 오가면서 형제자매, 어머니와 아버지, 딸과 아들, 친구와 애인 들의 삶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그 세계 속의 관계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끊임없이 열망하면서도 끊임없이 소원해지는 관계이다. 이런 고민은 줌파 특유의 쉬운 문체로 녹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써 내려간 듯한 글 속에는 저마다 가시가 들어 있다.
- 평범한 누군가를 변하게 만드는 신념, <밀크>
-그의 눈에서 느낀, 모멸감 그리고 고골의 <외투>
- 72014 음악 페스티벌 가이드, 골라가는 재미
-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부터 <하이힐>까지
- 박철순, 그는 나의 첫 영웅이었다
그저 좋은 사람
출판사 | 마음산책

정이현(소설가)
1972년 서울 출생으로 단편 「낭만적 사랑과 사회」로 2002년 제1회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다. 이후 단편 「타인의 고독」으로 제5회 이효석문학상(2004)을, 단편 「삼풍백화점」으로 제51회 현대문학상(2006)을 수상했다. 작품집으로 『낭만적 사랑과 사회』『타인의 고독』(수상작품집) 『삼풍백화점』(수상작품집) 『달콤한 나의 도시』『오늘의 거짓말』『풍선』『작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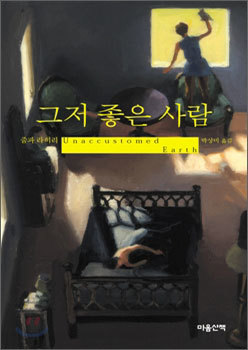


![[리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원히 떠올리는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5-1762a6bd.jpg)







샨티샨티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