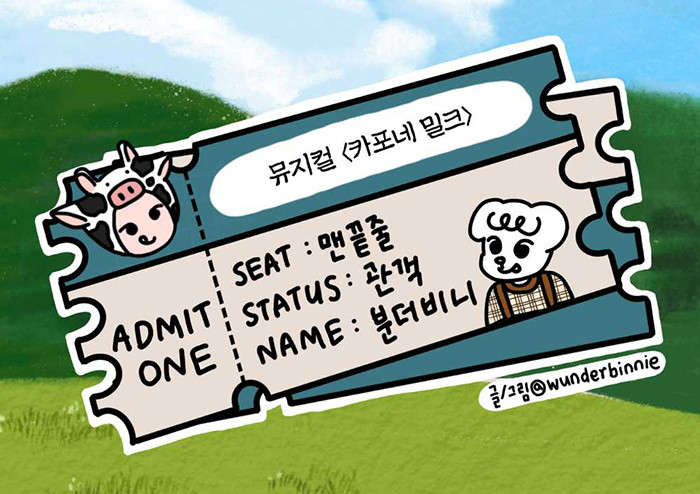세상은 보통 둘로 나눌 수 있다.
너와 나, 남과 여, 낮과 밤. 감정도 그렇다.
사랑과 증오, 관심과 무관심.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짜장과 짬뽕, 물냉면과 비빔냉면, 그리고 카르보나라와 토마토 소스 파스타. 물론 이런 구분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오일 파스타는 왜 빼놓는단 말이요?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과 미식가들은 섬세한 오일 파스타가 더 나은 것으로 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먹는 것에 목숨 거는 뜨거운 분들의 외침이 안 들리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짜장과 짬뽕과 백짬뽕으로 중식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파스타라는 장르를 카르보나라와 토마토 소스 파스타로 양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외식 메뉴의 양대 산맥인 이 둘에 대해 나는 할 말이 많다. 게다가 지금은 외식 잦은 연말 연시 아닌가? 발음도 힘든 서양 음식, 여성을 위해 기꺼이 먹어줘야 하는 데이트 음식, 이번 기회에 도대체 이 음식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자. 오늘은 카르보나라 차례다.
우선 카르보나라의 어원이다. 흔히 ‘carbonara’는 ‘carbonar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숯가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광부들이 먹던 음식이다, 까만 후추는 석탄 가루의 오마주다, 베이컨은 우리가 황사 돌면 삼겹살 먹듯이 돼지기름으로 먼지를 빼내려고 한 것이다, 라는 그럴 듯한 해석이 떠돈다.
하지만 억측은 그만. 카르보나라는 사실 산촌이 아닌 대도시, 로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카르보나라를 둘러 싼 논란은 유래뿐만 아니다. 만드는 방법도 이 편 저 편으로 나눠 싸운다. 그러고 보니 문득 내가 영국 살 때 동거인이었던 ‘알베르토’가 떠오른다.
몇 달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안 알베르토는 딱 두 종류의 파스타만 주구장창 먹었다. 토마토소스 파스타와 달걀 파스타. 가느다란 스파게티 면으로는 달걀 파스타를 만들었고 보통은 속이 빈 원통형의 펜네penne를 썼다. 파스타에 달걀만? 맞다. 이 녀석은 한국 사람들이 간장밥에 달걀 풀어 먹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파스타를 달걀에 비벼 먹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멈추지 않는 호기심에 나도 한 젓가락, 아니 한 포크질 해봤더 랬다. 입 안에 넣으니 촉촉히 퍼지는 달걀의 온기, 국수가 아닌 파스타 면발, 어딘지 비슷한 이 맛에 나는 묘한 상념에 빠졌다.
알고 보면 알베르토가 먹던 달걀 파스타는 카르보나라의 원형이다. 파스타 면이 뜨거울 때 달걀 노른자, 파르메산 치즈, 바삭하게 구운 판체타(pancetta, 훈제를 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베이컨)를 섞으면 그게 곧 정통(이라고 불리는) 카르보나라다.
그런데도 맛보다 족보부터 따지는 인간들이 있다. “카르보나라에는 달걀이랑 치즈만 쓰는 거라니까” “크림과 우유를 쓰는 건 영국식이야”라며 핏대를 세운다. 아하, 그런가? 그래서 어쩌라구.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목청을 높이는 원리주의자는 주방에도 흔하다. 그들 앞에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가 있다. 영국의 전설적인 셰프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다.

그는 1994년, 33살에 미슐랭 3 스타(당시 최연소 기록)를 받으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가 1999년 홀연히 은퇴했다. 현재는 레스토랑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한편으로는 마스터 셰프가 독재자처럼 날뛰는 TV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방송에서 그는 곱슬머리 장발에 소나무 껍질 같은 주름살 사이로 실눈을 뜨고는 풋내기 요리사들을 잡아먹을 듯 노려본다. 그 서슬에 요리사들이 벌벌 떨다가 냄비까지 태워먹고 뭐 그런다. 그만큼 아우라가 범상치 않다. 마르코는 자신이 영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이탈리아인이라며 그 혈통을 늘 강조한다. 정통 이탈리아 카르보나라를 만들 자격이 있다는 걸 제 입으로 밝히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그가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에게 직접 배웠냐고? 죄송한 말씀,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 자, 그래도 괜히 축구경기에 해설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친절한 설명 들어간다.
먼저 그가 파스타를 삶는 방식부터 범상치 않다. 소금물이 아니라 닭 육수에 삶는다. 이러면 감칠맛이 배가 된다. 닭 육수에 천연 MSG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 힘, 거부하지 못할 걸?
“베이컨, 치즈, 달걀노른자, 크림, 닭 육수.”
마르코가 긴 칼을 들고 재료들을 가리킨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명명백백한 놈들이다.
“베이컨과 치즈로도 충분하니까 파스타 삶는 물에 간은 하지 않는 거야.”
하긴 카르보나라는 좀 짜다. 그리고 짜게 먹어야 맞는 음식이다. 베이컨 하고 치즈가 들어가는데 싱겁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 되지 않는 현상이다. 어려운 말인가? 비키니를 입는데 섹시해 보이고 싶지 않다, 라는 심리 상태와 같다면 이해가 되려냐?
“베이컨은 따로 볶아 놓고, 파르메산 치즈도 갈아놔. 달걀 노른자와 크림은 큰 볼에 따로 섞고.”
시키는 건 빨리 빨리 해야 한다. 저러다 폭발할지 모른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 마르코는 분노 조절장애로 유명한 셰프다.
“봉지마다 설명이 다른데 나는 그걸 따르지 않아. 봉지에 적힌 것보다 1분 30초 정도 면을 덜 삶아. 왠지 알아?”
“파스타를 끓는 물에서 건져내도 잔열 때문에 계속 익거든. 봉지에 적힌 대로 삶으면 알 덴테(Al Dente. 씹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난다는 뜻)와는 이별이지. 꼬들꼬들해지는 게 아니라 푹 익어서 흐물흐물해진다고.”
마르코의 설명은 명쾌하고 확실하다. ‘전 푹 익은 게 좋던데요.’라는 말은 쏙 들어간다. 그가 카메라가 뚫어져라 검정색 눈동자로 노려보니, 아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입 안에서 옹알거린다. 그래도 저 이가 모니터 화면 속에 있는 것이 다행이다. 내 앞이었다면 나는 쫄아 버렸을까나?
“이제 면이 다 익은 것 같군. 아까 크림이랑 달걀 노른자 섞어둔 그릇에 면을 넣고 잘 비벼. 파스타의 잔열로 익히는 거야. 팬 위에서 가스 불로 익히면 달걀이 스크램블이 돼.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 나는 파스타에 치즈를 섞지 않아. 소스가 너무 걸쭉해지거든. 잊지마! 우리 엄마 이탈리아 사람이야.”
마르코는 잊을 만하면 또 엄마 타령을 했다. 앞으로 만들든 뒤로 만들든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은은히 노란 기가 도는 카르보나라다. 맛은 어떨까 하니 평소 먹든 것과 비슷하다. 크림 때문이다. 부드럽고 녹진한 맛, 혀를 가진 지구인이라면 거부하기 힘든 맛이다. 느끼한 것 싫어하는 당신도 분명 그랬을 것이다. 꽤 괜찮은데? 라고.
그럼 내 동거인 알베르토가 만든 카르보나라는 어떨까? 크림 대신 달걀 노른자로만 맛을 낸 것 말이다. 그것도 맛있다. 덜 느끼하고 뻑뻑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의 맛이 있다.
나름의 맛, 나름의 멋, 나는 이렇게 나름이 앞에 붙을 때 괜히 자유롭다. 당신의 취향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지라도 상대적으로 옳다. 옆에 선 그녀의 취향도 당신의 취향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옳고 우리 둘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맛도 그렇다.
그러니 괜히 크림을 쓴 카르보나라 앞에서 정통 아니라며 까탈 부리진 말자. 그보다는 “나는 크림 쓴 것도 좋더라. 특히 당신과 먹을 땐 이 부드럽고 진한 것도 좋아.”라고 하면서 상큼한 윙크 한 번 던지는 것은 어떤가? 추운 날 몸이 떨릴 때, 열량이 더 필요한 우리 몸은 요 크림을 더 원한다.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혹시 아는가? 그녀의 취향이 느끼한 당신일지?

-
셰프의 빨간 노트정동현 저 | 엑스오북스(XOBOOKS)
다큐멘터리의 카메라처럼 유럽과 호주 레스토랑의 주방 풍경과 셰프들의 뜨거운 전투를 현장감 있게 속속들이 비춰준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눈과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셰프들의 벌거벗은 조리 과정을 비롯해 음식에 얽혀 있는 역사와 영화, 예술, 여행 이야기, 나아가 러브 스토리까지 버무려 놓기 때문이다. 군침 넘어가는 레시피와 음식에 관한 깨알 같은 상식과 에티켓까지 음미하고 나면 서양 음식 앞에서 생기는 괜한 주눅도 말끔하게 사라진다.

정동현(셰프)
<셰프의 빨간 노트>의 저자. 신세계그룹 F&B팀에서 ‘먹고(FOOD) 마시는(BEVERAGE)’일에 몰두하고 있는 셰프. 오늘도 지구촌 핫한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혀를 단련 중이다. <조선일보> 주말 매거진과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맛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김미래의 만화절경] 울퉁불퉁 과자세트 같은 단편만화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8-49b98b62.jpg)

![[문화 나들이] 활기 가득한 초여름을 즐기는 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9-35da15b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