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과 대작, 명작은 정말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각양의 작품들이 올 한 해를 빛냈다. 그중에서 추린 열 장의 음반을 이즘이 소개한다.

< 2015 올해의 팝 앨범 >
회의를 거쳐 결론에 다다른 열 장의 음반을 늘어놓고 보니 결과가 제법 다양하다. 이력으로 따져보면 간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장, 훌륭히 커리어를 이어가는 다년 차, 멋지게 첫 정규 음반을 내놓은 신인이 있고, 장르와 스타일로 구분해보면 록, 포크, 신스팝, 힙합 등이 포진돼있으며, 출신지로 나눠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퍼져 있다. 수작과 대작, 명작은 정말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각양의 작품들이 올 한 해를 빛냈다. 그중에서 추린 열 장의 음반을 이즘이 소개한다. 글의 순서는 순위와 무관하다.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 - < To Pimp A Butterfly >
정말 진부한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다. 다른 곳에서 이미 이 음반이 지닌 가치에 대해 지겹게 들었을 테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올해의 앨범. 이미 전작에서 검증된 바 있는, 내러티브와 서사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노래로 담아내는 켄드릭 라마의 비범한 능력과 역량이 십분 발휘되고, 정점에 오른 랩 스킬과 펑크, 재즈, 블루스 등 다채로운 장르들을 아우르는 프로듀싱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 무자비하다. 켄드릭 라마는 < good kid m.A.A.d city >와 < To Pimp A Butterfly >, 두 장의 클래식으로 다른 래퍼들을 전부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이변이 없는 한, 한동안 '누가 가장 랩을 잘하나?'의 정답은 켄드릭 라마가 될 것이고, '누가 가장 앨범을 잘 만드나?'의 정답 또한 켄드릭 라마가 될 것이다. (이택용)
테임 임팔라(Tame Impala) - < Currents >
서슬 퍼런 만년설에 용솟음으로 분출된 용암이 끼얹혔을 때 파동과 급류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까. 이미 2장의 앨범만으로 6~70년대 사이키델리아 현재화의 방점을 찍었지만, 신작으로 원시와 현대가 공존하던 80년대의 여러 장르를 아우른다. 시대를 흐르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다방면으로 시각화한 사운드를 기저에 놓아 신스팝, 디스코, 소울, 펑크(Funk), 리듬 앤 블루스 등 자칫 고루해지는 소재는 시의성마저 획득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의 색채는 망각의 도시를 한가로이 배회하듯 분주하지 않게 부유하며 짜릿한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그들이 방출한 급변하는 난류에 몸을 맡기기에 5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이기찬)
제이미 엑스엑스(Jamie XX) - < In Colour >
한 분야에 미친 듯이 열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타쿠'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이 단어를 비꼬는 어조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어릴 적부터 전자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제이미 엑스엑스는 그동안 축적해놓았던 모든 지식을 < In Colour >에 방출시킨다. 이 훌륭한 오타쿠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의 여러 성분을 재배치시켰음에도 전혀 난해하지 않은 뛰어난 접근성의 앨범을 창조했다.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트랙들은 단순한 청음 행위가 체험이 될 만큼 매우 시각적이고 공간감 있는 감상을 제공하고,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최루성 앰비언트 사운드는 한동안 주를 이루었던 요란한 EDM이 한껏 발기시켜 놓은 신경들을 완화시킨다. 귀를 안마한다면 분명 이런 느낌일 것. (이택용)
뉴 오더(New Order) - < Music Complete >
전작 < Lost Sirens >가 < Waiting For The Sirens' Call >에서 누락된 미수록곡 모음집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온전한 신보로는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번뜩이는 창작력이 절정에 달했던 80년대 후반의 팀을 생각하면 < Music Complete >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복고풍이 가미된 첨단 신스팝이 각광받는 작금에서는 오히려 신선했다.
뉴웨이브와 포스트 펑크, 신스팝 등 밴드의 에센스를 빈틈없이 완벽한 구성에 채웠다. 완성도로만 보면 < Low-Life>, < Brotherhood> 등 그 시절 명반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수준이다. 수록곡 대다수의 러닝타임이 5분이 넘는 긴 호흡에도 정돈된 톤의 고밀도 사운드와 유기적 흐름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혁신이 배제된 전설의 귀환은 자칫 미지근한 재탕이 될 위험이 크지만, 밴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선보이며 또 하나의 역작을 만들었다. (정민재)
처치스(CHVRCHES) - < Every Open Eye >
첫 곡을 재생시킴과 동시에 「Never ending circles」의 공격적인 루프가 온몸의 신경세포를 깨운다. 2년 전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스팝 신예의 소포모어 작은, 자신들의 장점을 대중의 기호에 맞게 제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최적의 결과물이다. 간단명료해진 신스 사운드, 한결 쉬워진 멜로디를 통한 직관적인 매력이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긴박한 16비트 리듬과 캐치한 선율이 맞물려 팝으로서의 진화를 엿보게 하는 「Make them gold」, 「Back to the 80's」의 기조 아래 자신들의 색깔을 이질감 없이 조화시킨 「High enough to carry you over」, 훅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탄생시킨 앤섬 「Bury it」 등.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 데뷔작이었다면, 처치스 음악의 완성이 이 음반에 담겨있다. 성공적인 레트로 사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신스 팝의 수작. (황선업)
제스 글린(Jess Glynne) - < I Cry When I Laugh >
2015년에도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유효하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아델에 이어 올해 첫 정규 앨범과 함께 등장한 제스 글린의 이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국발 소울 폭격에 강력한 한 방을 보탠다. 신인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깊고 넓은 장르 소화력과 특유의 보컬 센스, 게다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송라이팅 능력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나타난 이 순간 그의 음악에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서유럽의 회색 하늘이 라디오헤드를 만들었다면, 그 하늘 틈 사이로 흘러나온 한 줄기 햇살로서 제스 글린은 자라났다. 그가 선사하는 금빛 희망은 찢긴 심장을 품고 정상에 오른다. 여기, 판도라의 리듬을 보라. (홍은솔)
Father John Misty(파더 존 미스티) - < I love you honeybear >
조쉬 틸먼은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 듣기 좋은 멜로디를 계속해 주조해낼 줄도 알고, 다채로운 컬러를 뽑아낼 줄도 알며 음악 곳곳에 실험을 통해 기발함을 더할 줄도 안다. 이러한 각양의 역량이 열 번째 정규 음반이자 파더 존 미스티라는 이름을 통해 낸 두 번째 음반에 하나의 모자람 없이 들어 있다. 팝 멜로디를 품은 포크, 컨트리, 블루스 사운드와 풍성한 편곡이 만드는 사이키델릭 컬러, 자전적인 텍스트가 뒤섞여 음반에 비장함과 우아함과 익살스러움을 선사한다. 아득하게 울리는 「I love you, honeybear」서부터 푸근한 「Chateau lobby #4 (in C for two virgins)」, 일렉트로니카를 섞은 「True affection」, 한껏 들뜬 「The ideal husband」, 조소로 무장한 「Bored in the USA」에 이르기까지 앨범에는 아쉬울 순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수호)
인터넷(The Internet) - < Ego Death >
레이블 오드 퓨쳐(Odd Future)의 퓨전 네오 소울 / R&B 밴드 인터넷이 또 다른 재능을 뽐냈다. 1990년대 자미로콰이를 연상케 하는 재즈적 접근에 소울을 섞어낸 이들은 몽환적인 사운드 스케이핑 속의 아기자기한 구성과 깊은 멜로디라인으로 마법 같은 소리의 향연을 펼쳐낸다. 가녀리면서도 깊어진 보컬 시드 다 키드(Syd tha kid)의 보컬과 일관된 앨범의 색채는 50분 내내 짙은 여운을 안긴다. 간결함 속의 깊은 울림을 원한다면 놓칠 수 없다. (김도헌)
커트니 바넷(Courtney Barnett) - < Sometimes I Sit And Think, And Sometimes I Just Sit >
대충 읊조리기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느긋하게 노래를 풀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쫓아가듯 사운드를 쏟아내기도 하고. 기타 줄들을 나른하게 쓸어내리기도 하고 파워 코드를 잡아 맹렬하게 내려치기도 하고. 발랄하게 톡톡 튀어 다니기도 하고 음울에 젖어 한없이 가라앉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서 생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냥 앉아 있기도 한다'는 작품의 제목처럼 커트니 바넷의 음반에는 이렇다 할 계산도 엄청난 설계도 없어 보인다. 그저 본능에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새인데, 아, 그 움직임이 정말 매력적이다. 정제 과정을 크게 거치지 않은 로 파이 사운드서부터 그런지 스타일의 리프, 한순간도 귀를 뗄 수 없게 하는 캐치한 멜로디, 슬그머니 웃음을 자극하는 가사까지 다 멋지다. 음반에 담긴 온갖 요소들이 흡입력을 강하게 발휘한다. (이수호)
수프얀 스티븐스(Sufjan Stevens) - < Carrie & Lowell >
구구절절 늘어놓아 부유하는 언어의 조각들이 과연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가끔은 개인적 심미성 혹은 탐미성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존재한다. 장르를 넘나들며 천재성을 뽐내고 있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수프얀 스티븐스는 아버지 캐리(Carrie)와 어머니 로웰(Lowell)로 대표되는 일가 서사에 엮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플루트, 브라스로 대표되는 그가 가진 무기들을 덜어내는 작법을 선택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자기를 떠나있었지만 몇 해 전 세상을 영영 등져버린 조현병 환자 어머니를 보낸 씁쓸함과 상념이 앨범의 중심축이다. 존엄사를 뜻하는 아련함 가득한 첫 곡 「Death with dignity」로부터 존 레논의 명곡 「Mother」처럼 어머니를 갈구하지만 결국 용서하는 가사를 담아낸다. 이후 반조, 기타, 피아노 최소한의 반주로 울림을 선사하는 「Should have known better」,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 모티프를 전달하는 「Fourth of July」로 자아 성찰이라는 해묵은 주제를 과감히 풀어냈다. 진심은 전달되기 마련이다. (이기찬)

< 2015 올해의 팝 싱글 >
싱글 포맷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업이 이루어지는 요즘이다. 수많은 곡들이 번갈아가며 MP3와 핸드폰 화면에, 음원사이트와 차트의 메인 페이지에,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한 칸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그 때마다 노래들은 찰나의 승부를 벌인다. 그렇기에 싱글은 순간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이 날에 등장했던 곡', '이 때에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곡', '이 즈음에 좋은 인상을 남겼던 곡'으로 사람들은 싱글들을 기억한다. 2015년 팝 신에서도 역시나 많은 노래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올해를 대표할 곡들을 이즘이 꼽았다. 글의 순서는 순위와 무관하다.
엘리 골딩(Ellie Goulding) - 「Love me like you do」
섹스와 페티시즘에 관한 적나라한 묘사로 유명세를 얻은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영화화는 개봉 전 공개된 고품격 사운드트랙들로 더욱 기대를 모았다. 환상적인 신시사이저와 강한 타격감의 퍼커션은 영화에 어울리는 오묘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탁월한 강약조절로 매력적 음색을 극대화한 엘리 골딩의 보컬은 화룡점정이었다. 매끈한 만듦새와 단순하면서도 유려한 멜로디는 히트메이커 맥스 마틴의 공이었다. 영화의 참패와 무관하게 세계 각 국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애청된 노래는 많은 영화 시상식에서 최고의 주제가 후보에 오르며 그 가치를 증명했다. 2015년을 가장 근사하게 빛낸 웰메이드 팝송. (정민재)
위켄드(The Weeknd) - 「Can't feel my face」
빌보드 차트에서의 거물 작곡가 맥스 마틴을 초청해 팝적인 접근을 더하더니 성적이 끝없이 치솟았다. 어지럽고 몽롱하며 다소 난해하기까지 했던 기존 PBR&B 스타일의 성질을 사운드 전반에 녹아있는 공간감 정도에만 한정시키고, 멜로디와 리듬을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가져갔다. 댄서블한 펑크(funk)-디스코 리듬에 접근성 높은 선율, 강한 소구력의 훅 라인이 러닝 타임 내내 큰 위력을 발휘한다. 싱글은 순식간에 빌보드 싱글 차트를 포함, 여러 차트의 정상을 점령했으며 또 다른 히트 싱글 「The hills」와 함께 위켄드를 올해의 뮤지션에 등극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수호)
드레이크(Drake) - 「Hotline Bling」
올해도 드레이크는 허슬했다. 연초부터 < If You're Reading This It's Too Late >를 갑작스럽게 발매하여, 모두를 지각시킨 뒤 「Energy」로 사랑받았다. 여름엔 대필 의혹을 제기한 믹 밀과의 디스전이 화제였다. 드레이크는 확실하게 두 곡으로 응수했고, 「Back to back」은 디스곡임에도 흔치 않게 그래미 후보로 올랐다. 가을엔 퓨처와 합작 앨범까지 냈다. 10월 말 공개된 「Hotline bling」 뮤직 비디오는 부지런했던 2015년 완결판이자 유종의 미, 정점 혹은 자축의 춤이다.
노래만 들어도 수많은 패러디 영상이 떠올라 웃기다. 퇴색되었으나 이국적인 까딱거림에 얹힌 드레이크 특유의 알앤비가 분위기 있다. 전처럼 감성적이면서도 이건 춤을 출 수가 있다. 새롭다. 투박하게 힙합하는 동안, 캐치한 멜로디 짜는 능력은 어디 안 갔다. 빌보드 2위, 자연스럽고 새삼스럽게 드레이크는 또 대박을 쳤다. (전민석)
마릴린 맨슨(Marilyn Manson) - 「Deep six」
뚜렷해진 주류 록의 연성, 경량화 경향에도 '교주' 마릴린 맨슨은 완고했다. 한창때의 쇼크록은 포스트 펑크의 골조로 변모했지만, 댄스 그루브를 만드는 드럼과 직선적인 기타 리프, 특유의 아이코닉한 보컬에는 여전히 짜릿한 '쇼크'가 꿈틀거렸다. 제우스와 나르시스, 이카루스의 날개 등 그리스 신화의 요소를 차용해 써 내려간 중의적 가사 역시 상당했다. 기존의 중량감을 덜어내고 선명하게 잘 들리는 선율과 부담없는 사운드로 밴드 사상 최고의 싱글 차트 성적을 기록하며 판도를 넓혔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유연하게 고수한 관록의 일격. (정민재)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 - 「King kunta」
컴튼(Compton) 출신의 왕은 성공을 자축하며 행진한다. 쿤타 킨테(소설 속 흑인 노예)와 King 을 조합한 '킹 쿤타'는 과거와 지금의 위치를 대비한 캐릭터이고, 거칠게 달려가는 펑크(Funk)는 트랩, 래칫과는 다른 멋이 있다. 마이클 잭슨 「Smooth criminal」 속 가사(Annie are you ok)와 구절을 반복하는 여성의 더블링은 곡의 온도를 높여준다. 후끈한 분위기 그 자체를 즐겨도 좋지만, 블랙 커뮤니티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은유들도 노랫말 겹겹이 녹아있다. 켄드릭은 We want the funk!를 외치며 사회성과 음악적 완성도 두 깃발을 잡아냈고, 그런 그를 올 한 해 모두가 인정했다. (정유나)
앨라배마 셰익스(Alabama Shakes) - 「Gimme all your love」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광적인 색채로 인지되는 혼란에 귀를 자른 반 고흐라는 인물도 있지만, 평범한 대다수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이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패드 광고 삽입곡인 「Sound and color」로 알려진 앨라배마 셰익스는 소포모어작을 통해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의 눈을 열어 올해 세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었다.
앨범 두 번째 싱글인 「Gimme all your love」는 마음의 기저에서부터 '네 온 사랑을 선사해 줘'라는 울림을 담아 예측 불가능하게 전환되는 템포에 맞춰 전달한다. A-B-A 액자구조와 닮아 시작과 끝이 맞닿아있는 사랑의 속성처럼, A파트 늘어지는 오르간에 얹히듯 털어놓는 좌절감과 B파트 으르렁거리는 기타로 토로되는 불안함은 연결되어 있다. 소울, 블루스, 펑크(Funk)가 한 데 섞여 뭉그러지는 소리의 벽이 조금 더 명확해짐은 새로이 추가한 키보드 멤버 덕도 있을 테다. 최우수 신인밴드가 이룩해낸 아티스트로의 발돋움. (이기찬)
잭 유(Jack U) - 「Where are you now (Feat. Justin Bieber)」

저스틴 비버가 악동이어도 음색 좋은 건 어쩔 수 없다. 감미롭게 신난다. 팝과 EDM의 경계를 영리하게 누볐다. 최정상급 DJ 둘다운 프로듀싱도 큰 역할을 했다. EDM의 어느 정도 뻔한 구성 안에서 소소한 장치들로 차별화한다. 피치 조작한 코러스라든지, 사운드의 공간감, 덜 부담스러운 드롭이 빛났다. 모든 게 끈끈하게 어울린다. 비버가 올해 앨범 내면서 여러 좋은 싱글들을 발표했지만 디플로, 스크릴렉스와의 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전민석)
에밀 헤이니(Emile Haynie) - 「Falling apart (feat. Andrew Wyatt & Brian Wilson)」
브라이언 윌슨을 모셔다 두고 에밀 헤이니는 2010년대의 새로운 브라이언 윌슨이 탄생했음을 알린다. 재능 있는 프로듀서의 첫 솔로 프로젝트를 알리는 「Falling apart」에는 반세기 전 비치 보이스의 선장이 항해해 지나갔던 서프 팝과 바로크 팝, 사이키델릭 팝의 물결이 멋지게 흐른다.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코러스, 흥겨운 마칭 드럼, 공간감 그득한 사운드, 부드러운 팝 선율이 이루는 아름다움이 상당하다. 여기에 자신의 유산에 목소리를 얹는 브라이언 윌슨과 동료의 곡에 매력적인 보컬을 더하는 앤드루 와이트와 함께하는 호흡도 또한 좋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프로듀서, 작곡가, 연주자로 활동해온 아티스트의 훌륭한 솔로 데뷔다. (이수호)
플로렌스 더 머신(Florence The Machine) - 「Ship to wreck」
사랑의 침몰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난파된 배처럼 이곳저곳 감정의 벽이 갈라지고, 슬픔으로 침수되다가 소중한 추억들이 물살에 의해 산산히 부서진다. 「Ship to wreck」은 이런 심리적 파탄과 그 과정을 담는다. 최근 가장 개성 있는 뮤지션으로 꼽히는 그는 이번에도 심하게 몸살을 앓는다. 연주와 목소리에 극단이 흘러넘친다. 날뛰고 흐느끼고 울부짖는다. 분노가 폭발한다. 피가 튈 정도로 난도질한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절망한다. 자신을 소진하며 거침없이 쏟아 붓는 노래는 선홍색 감정들이 팔딱팔딱 살아 움직인다. 이성으로 중무장한 현대인들에게 이런 광경은 낯설지만 한 켠으론 짜릿하다. 노래는 말라비틀어진 '만감'에 참 간단히도 불을 붙인다. 그야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마녀의 주문이다. 당신은 이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김반야)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 - 「Only one (Feat. Paul McCartney)」
올해, 그 어떤 곡이 가장 핫했는지는 몰라도, 가장 뜨거운 감상의 곡은 「Only one」일 것이다. 이 곡의 의미가 그저 60년대의 비틀스와 새 천년의 카니예 웨스트의 시대를 뛰어넘은 만남으로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 노랫말로 전해지는 '딸 바보' 카니예의 진심이다. 목소리를 왜곡하는 장치가 이렇게 따스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온화한 메시지를 전한 카니예가 퇴장하고, 바로 펼쳐지는 폴 매카트니의 건반 연주는 먹먹하기까지 하다. 말썽꾸러기도 딸아이 앞에선 이렇게 진지하다. 그러나 솔직히, 대통령은 좀 오버다. (이택용)
[관련 기사]
- 한 곡으로 영생을 얻은 가수, 조 퍼블릭
- Surfin' U.S.A.부터 Love And Mercy까지, 비치 보이스
- 드레스덴 축제의 매혹적인 단조
- 걸 그룹 뮤직비디오의 답습과 반복
- 2015 올해의 가요 앨범과 싱글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Tame Impala - Currents [2LP]
출판사 | Universal
CHVRCHES (처치스) - Every Open Eye 2집
출판사 | Universal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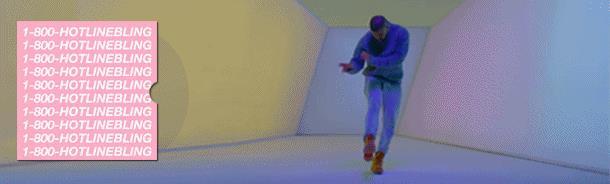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
![[더뮤지컬] 브로드웨이도 사랑에 빠진 <어쩌면 해피엔딩>](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3-a7379ff6.jpg)
![[더뮤지컬] 2025 올리비에 어워즈, 치열한 열정과 따뜻한 연대의 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11-495829a1.jpg)
![[케이팝] 데이식스 : 노래가 이끈 지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3-c5d9f9dd.png)









![Tame Impala - Currents [2LP]](https://image.yes24.com/goods/19677021?104x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