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만 뽑으라면….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마루야마 겐지 지음ㅣ 바다출판사
마루야마 겐지 씨는 누구에게 친구로 소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1943년생으로 올해 나이 일흔 넷인 그는 스물넷에 이미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나가노로 귀향해서 50년 넘게 살고 있다. 대개 사람들은 귀농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있는데, 여유를 찾았거나 달관했거나 적어도 괴팍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마루야마 씨는 그런 것이 없다. 여전히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만큼 직설적이고, 가리는 표현 없이 까칠하다.
한국어 번역서만 20여 종이 이르는 그의 소설과 에세이 가운데 몇 권의 제목만 뽑아봐도 알 수 있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라는 제목도 친절한 건 아니지만,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뭘 이렇게 번역했는지 일본어 원서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이 두 권의 원제는 이렇다. 『시골 생활에 살해 당하지 않는 법』, 『인생 따위 똥이나 먹어라』. 아아, 그렇다. 한국 출판사에서 그나마 다듬은 게 ‘엿이나 먹어라’였던 것이다.
사실 모든 에세이가 그의 시골 생활과 연관이 있다. 『개와 웃다』는 처음 귀농했을 때부터 함께 살았던 개들과의 추억이다. 『그렇지 않다면 석양이 이토록 아름다울 리 없다』에는 그가 가꾸는 350평 정원에서 벌어진 일들과 생각을 담았다.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와 『나는 길들지 않는다』는 회사에 다니고 갖가지 기대에 맞춰 사느라 ‘노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돌직구 충고이며 귀향해서 내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까칠한 마루야마 씨의 무례한 충고
그렇게 사는 마루야마 씨이다 보니 친구가 없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긴 『개와 웃다』에서 보듯이,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시’는 이웃이 키우던 뚱뚱한 달마시안이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시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싫어했어.” 나는 딱 잘라 말해주었다. “자네를 닮은 구석이 있어서 말이야. 소심한 주제에 어딘가 능글맞은 것 같아서.”
그는 잠자코 있었다.
“자네가 제시를 좋아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제시는 자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산보를 제대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루야마 겐지의 에세이를 읽는 독자는 이 대화 속 이웃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담배를 못 끊겠다고? 의지박약이야.” “살이 찐 사람은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이 있어 보이지 않지? 실제로도 그래.” “텔레비전을 종일 본다고? 국가는 골 빈 국민을 만들려고 하지. 너 같은 녀석 말이야.” “평화 교육 강화해봐야 소용없어. 일본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해결책이야.” “친한 친구 모임에 술이 빠질 수 없다고? 너는 그냥 중독인 거야.”
특히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심하게, 또 일관되게 욕하는 사람은 가족과 직장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직장인이 노예라고 잘라 말한다.
“노예처럼 실컷 부리다 써먹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차 없이 우리 밖으로 쫓아낸다. 적은 수입에서 세금을 뜯어 가고, 이런저런 돈도 내라고 한다. 과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조각배 같은 연금을 손에 쥐여주고는 파도가 출렁대는 바다로 내던진다.”
직장인은 노예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는 독자의 독립을 부추기려는 목적에서 만든 책 같다. 거기에서 작가는 산 자로 살고 싶다면 자영업에 뛰어들라고 충고한다. 자영업 중에서도 다른 이가 만든 물건을 팔거나 주문을 받는 일, 사람과 사람을 중재하는 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취급하는 일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란다. ‘그러면 대체 뭘?’이라고 반문할 때에 딱 맞춰 대답한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데 농사만 한 것이 없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외의 책들은 결국은 귀농 예찬이거나 권유다. 독자를 논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근거와 전망을 던진다.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거나 미래 전망도 밝다거나 채무에 허덕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잘한 것들 외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길들지 않은 야생동물로서 다시 서는 것이다.
경치가 좋다는 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마루야마 겐지의 에세이들과 마주 서 있는 책이다. 그건 책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딜 가든 삶은 따라온다.”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떠난 후에도 그 삶은 계속된단다. 결국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독립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시골이라고 외롭지 않을 리 없다. 더 외롭다. 춥거나 덥지 않을 리도 없고, 도시에서 마음을 괴롭혔던 후회, 고민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아주 얇은 책이다. 게다가 메시지도 명확하다. 각 장의 제목이나 본문 중간 중간에 큰 글씨로 들어가 있는 문구들만 읽어도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시를 떠날 일이 없다면 그것도 상관없다. 하지만 언젠가 떠날 생각이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여전히 무례하고 독단적이며 남녀 성별에 대한 편향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가만 읽어보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최소 여덟 마리 이상의 개, 네 마리 이상의 잉꼬, 길고양이와 떠돌이 꿩 가족을 키우거나 도와주면서, 350평 정원을 수차례 뒤집어엎고, 1년에 소설 한 권씩 쓰는 걸 목표로 살아온 것도 분명한 이 늙은이의 말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담겼다는 것도 느낄 것이다.
더 읽는다면…

|
자연해부도감
줄리아 로스먼 지음 | 더숲
물론 시골에 간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과 지층부터 자연을 설명하는 책이 생존과 생활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숲 속 동식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도감류 책들을 여럿 살펴봤는데, 결국 이름을 알게 되는 건 옆 사람에게 여러 번 물어보고 난 후의 일이었다. 상세한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 있는 책보다는 아예 분류 맨 위쪽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낫다는 게 결론이다. 게다가 이 책의 그림은 자연의 특징을 제대로 잡아서 그렸다.

|
도시농부 올빼미의 텃빝 가이드
유다경 지음 ㅣ 시골생활
주변 사람 중 누가 주말 농장이라도 하면 상추가 몇 광주리 쌓이고, 친척 중 누가 귀농이라도 하면 몸에 좋다는 즙 봉지들이 냉장고에 그득하다. 평생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 가자마자 트랙터 빌려서 수천 평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면, 이 책이 딱이다. 시작은 다 텃밭인 거 아닌가. 농사 도구, 약품, 비료, 실제 모범 사례를 상황에 따라서 사진과 그림으로 설명한 정성도 초보 농부에겐 무척 도움이 된다.

|
시골의 발견
오경아 지음 | 궁리출판
우리나라 시골이 아니라 유럽의 농촌 풍경과 이야기다. 농장과 미술관, 관람용 정원, 가든센터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유럽 농촌의 변화를 소개했다. 당연히, 이대로 하면 된다는 책이 아니다. 넘겨가며 좋아보이는 것들을 찾고, 어떻게 써먹어볼까 생각해보는 책이다.

이금주(서점 직원)
chyes@yes24.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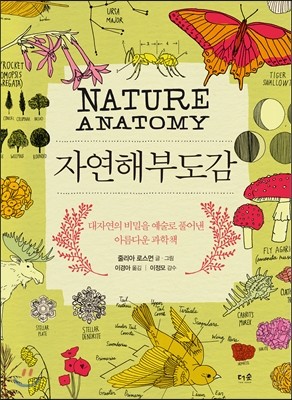




















lyj314
2016.06.09
책사랑
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