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_손은경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나 나는 신문도 방송도 잘 모른다. 부전공은 영어학이었다. 내가 영어학과에서 학위를 땄다는 사실이 가끔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할 줄 아는 영어라곤 아주 간단한 회화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잡지사 기자나 누드모델이나 만화 연재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므로 돈벌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학교생활에 충실했다. 그러자 전공과 부전공 수업에서 모두 학점 D를 맞으며 학기를 마쳤다. 영어학과와 나는 별로 안 어울리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과의 수업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다. 영어는 내 귓가 바깥만을 흐릿하게 맴돌았다. 정신을 마음껏 딴 데로 유영시키는 시간이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는 청각을 이완시키기도 했다. 수업 내내 쉬는 기분으로 한글로 된 글을 여러 편 썼다. F를 맞지 않을 정도로만 수업 내용을 주워 듣고 나머지 정신으로는 딴생각을 했다.
그 와중에 딴생각을 할 수 없던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영미 문학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다. 내용이 재밌기도 했지만 교수님의 억양에 찰떡같은 힘이 있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수업을 진행하는 분이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문장은 뭔가 정겨운 방식으로 예상을 비껴 나갔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왠지 익숙한 영어였다. 그게 재밌어서 귀가 자동으로 열리고 만 것이다. 교수님이 언급했던 샤를 페로, 루이스 캐롤, 그림 형제, 안데르센, 오스카 와일드, 디즈니, 톨킨 같은 이름들과 몇몇 원서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지금도 종종 떠오른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구전 동화 시절에 관한 이야기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오럴 트레디션. 문맹률이 높은 시대에도 널리 공유되던 서사. 교수님 말에 의하면 그 이야기에는 반복되는 대사와 문장이 많았다고 한다. 책처럼 다시 돌아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의 이야기를 까먹어도 자주 다시 상기시켜주는 친절함이 구전 동화에는 있었던 것이다. 이 불편하고도 재밌는 장르를 내가 제대로 체험할 기회는 아마 없을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게 기록되고 박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자가 기록된 책의 보급화는 다른 계층을 타깃으로 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의 관점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들을 고려하며 쓰인 책이자, 먹고살 만한 도시의 상류층에게 읽힐 책이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들이 주로 쓴 것은 동화였다고 한다. 살롱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수다 떨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읽었다. 주로 도덕성이 매우 강조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심지어 책 마지막에는 ‘moral’이라는 항목도 덧붙여 있었다. 이 책에서 배울 교훈을 작가가 확실하게 강조해주는 페이지였다. 이를테면 샤를 페로의 『빨간 망토』에도 그러한 moral 페이지가 이어진다. “늑대한테 빨간 망토가 잡아먹히는 결말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늑대한테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 이런 식의 내용이었으며 정확히는 근처에 있는 이웃집 남자를 경계하라는 암시였다. 그 시대 부모들은 가정 교육의 일환으로 딸들에게 ‘빨간 망토’를 읽히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의 윤리상을 동화책 뒤에 딸린 ‘moral’ 페이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그림 형제가 쓴 『빨간 모자』 는 비교적 전복적이지만 어쨌든 성인 남자의 결정적 위협이나 도움이 이야기를 장악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이야기가 달라져온 역사에 관해 쓰려면 세상에 나온 이야기만큼의 분량이 또 필요할 것이다. 어느 시대의 누가 읽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변해왔고, 변한 이야기가 새 시대와 새 사람을 만들기도 했다. 2019년의 나는 오럴 트레디션이 아닌 이메일로 이야기를 쓴다. 내 글에는 ‘moral’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티 나지 않게 다듬을 것이다. 이메일이라는 유통 방식은 글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한 편 읽기에 적절한 분량이어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읽기에 편안한 호흡의 문장이어야 한다. 또 이번 달에 구독한 사람이 다음 달에도 구독할 마음이 들 만큼 재밌는 이야기여야 한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박상영의 소설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다.
“제제가 우리 집에 살기로 했을 때 내가 말한 조건은 하나였다.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까지 웃긴 얘기를 해줄 것.”
약속대로 제제는 밤마다 혹은 잠든 주인공을 깨워가며 새벽마다 웃긴 얘기를 들려준다. 그러고는 “오늘의 웃긴 얘기 끝” 하고 돌아서서 코를 골거나 출근을 한다. 그 농담들이 매일 웃기지는 않다. 화가 날 만큼 안 웃기고 허무한 얘기를 하는 날도 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제제의 웃기거나 안 웃긴 얘기에 조금 기대어 살아간다. 핵심은 ‘웃긴’이 아니라 ‘얘기’일지도 모른다. 자기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충분치 않은 날이 인생에는 많기 때문이다. 혹시 나의 일간 연재 독자들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의지 자체에 시간과 마음과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 그래서 안 웃긴 글을 쓴 날도 몇 번은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것일까.
<일간 이슬아>와 비슷한 형식의 구독 모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메일 연재 글’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량이 곧 장르이기도 하듯, 유통 매체가 곧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일간 연재자가 다들 어디서 무슨 얘기를 지어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최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자정 즈음 만나자는 약속을 건네놓고는, 나처럼 초조한 하루를 보내지는 않는지도 궁금하다. 웃긴 얘기를 굳은 얼굴로 완성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건투를 빈다.

이슬아(작가)
연재노동자 (1992~). 서울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이슬아 수필집>,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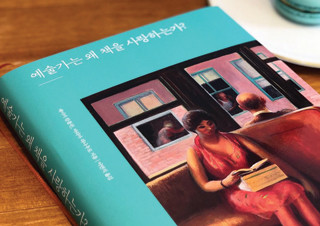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서점 직원의 선택] 전자책 담당자는 어떤 책을 읽을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6-beec83a8.jpg)

![[송섬별 칼럼] 외로움과 추위는 얼씬도 할 수 없기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9-d1259feb.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더 단단해질 한 해를 위한 목표 세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31-347d8b4f.jpg)


hanykly
2019.06.10
그런가요? 하긴 ㅇㄷ의 ㅁㄱ 이라고 하나는 알고 있지만..
암튼 시작은.. 근데,월간은 기다리기가.. ^^ 늘 재밌어요
찻잎미경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