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예스>가 미니 인터뷰 코너 ‘책이 뭐길래’를 매주 목요일 연재합니다. 책을 꾸준하게 읽는 독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심각하지 않은 독서를 지향합니다. 즐기는 독서를 지향합니다. 자신의 책 취향을 가볍게 밝힐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금융 공기업에서 일하는 10년차 직장인 ‘제이크’ 씨는 인스타그램(@jake11moon)을 통해 ‘북리뷰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주 사적인 북 리뷰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지만, 리뷰를 쓰는 일을 ‘업’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후기를 올린다. 제이크 씨가 한 해에 읽는 책은 약 200여 권. 문학, 인문, 경영서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읽는데, 각별하게 신뢰하는 신형철 문학평론가, 이동진 영화평론가, 고 황현산 문학평론가의 추천 도서는 가급적 모두 읽어보려고 노력한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주세요.
소설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 , 시는 '故허수경' 시인의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을 읽고 있습니다.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은 '존 버거'의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입니다.
어떤 계기로 선택하게 되었나요?
보르헤스의 『픽션들』 은 항상 제 읽을 책 리스트에 올랐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읽지 못하다가 김연경 교수의 『살다, 읽다, 쓰다』 를 읽고 바로 책장을 펼쳤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인간과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이미 그 작업을 거친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그것으로 귀결되는 만큼, 그의 소설은 그 태생에 있어 이론적이고 철학적, 즉 메타적이다(351쪽).”
故허수경 시인의 시집은 타계 1주기를 맞아 아직 저의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선택한 책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라는 시집에 '이국의 호텔'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집을 읽는 동안은 조금 우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 버거는 텍스트로 표현되지 않았던 형상(形象)을 텍스트화하여 하나의 언어로 포착해내는, 완벽한 사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림과 노래, 그리고 자연의 언어가 텍스트로 치환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텍스트는 말 없는 어떤 언어에 속한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읽어 온 언어, 하지만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언어 말이다(54쪽).”
평소 책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한 해에 책을 180권에서 200권 정도 읽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다른 책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이 책을 낳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특히 제가 하고 싶던 말들을 정확하고 섬세한 언어로 표현해 내는 신형철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 고 황현산 선생님의 추천 도서는 가급적 모두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북스타그래머들의 소개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좋은 리뷰에 소위 '영업을 당해'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형 서점보다는 동네 책방을 좋아하는데요.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순식간에 제 손에는 책들이 가득 들려 있게 되더라고요. 책이 있고 정(情)이 있고 사람이 있는 동네 책방이 언제나 제가 책을 선택하는 종착지입니다.
어떤 책을 볼 때, 특별히 반갑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를 떠올려 사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보면 반갑습니다. 책은 ‘타자’라는 훌륭한 도구를 통해 ‘자아’를 채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여성, 환경운동가이자 저술가인 리베카 솔닛의 저서 『멀고도 가까운』 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삶은 온갖 사연으로 가득한 은하수 같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때그때 몇 개의 성운을 고를 수 있을 뿐이다(359쪽).”
이런 문장을 보면 여러 가지 서사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때부터는 책 속의 활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아주 황홀합니다.
이근화 시인이 쓴 에세이 『고독할 권리』 를 읽고 이런 문장을 담은 리뷰를 쓴 게 기억나네요.
“글에 생명이 있다면, 눈앞에서 펄떡거리는 글자들의 목을 덥석 부여잡아서라도 느껴보고 싶었다. 맥박의 간절함을, 살려내 달라는 의식의 불투명함을.”
신간을 기다리는 작가가 있나요?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 시인이 있습니다. “시들은 산문과 달리 무엇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책갈피에 앉아 숨만 쉰다.”라고 말하는 시인이죠. 우리나라에는 『완벽한 날들』 , 『휘파람 부는 사람』 이라는 에세이가 출간됐지만 아쉽게도 시집은 번역서로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올리버 시인의 자연 친화적인, 아니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 인 시집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
완벽한 날들메리 올리버 저/민승남 역 | 마음산책
썰물 때 밀려 올라와 모래밭에 갇힌 아귀에 대해, 고래가 뿜은 물안개 세례를 받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올리버는 그녀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자신의 체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초대한다.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출판사 | 문학동네
픽션들
출판사 | 민음사
완벽한 날들
출판사 | 마음산책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출판사 | 열화당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출판사 | 열화당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 문학동네시인선 002
출판사 | 문학동네
픽션들 - 세계문학전집 275
출판사 | 민음사

엄지혜
eumji01@naver.com

김승수(디자인)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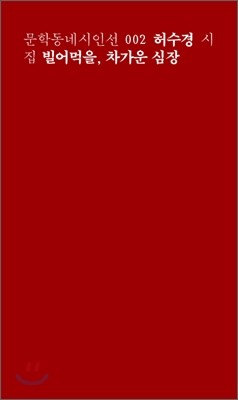



![[이상하고 아름다운 책] 우정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30-c0b54c6c.jpg)
![[큐레이션] 독주회 맨 앞줄에 앉은 기분을 선사하는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a343a9af.png)













psn502
2019.10.18
캔디
2019.10.17
dkghqtkf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