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자 한승훈의 '신화의 질문' 칼럼이 격주 금요일 연재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화를 새롭게 읽으며, 인류의 흥미진진한 질문과 만나 보세요. |
 루카 조르다노,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오늘날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건국신화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분명 단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주혁명기에 한반도로 이주해 와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자의 이야기가 훨씬 중시되었다. 민족의 기원과 연결시키기에 좋은 단군 이야기가 근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신화라면, 문명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는 기자 이야기는 유교적 엘리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였다. 그리고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동명성왕 주몽의 건국 이야기가 훨씬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동명왕편』을 쓴 이규보(1169-1241)에 의하면 당시 주몽 이야기는 교육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루카 조르다노,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오늘날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건국신화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분명 단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주혁명기에 한반도로 이주해 와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자의 이야기가 훨씬 중시되었다. 민족의 기원과 연결시키기에 좋은 단군 이야기가 근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신화라면, 문명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는 기자 이야기는 유교적 엘리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였다. 그리고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동명성왕 주몽의 건국 이야기가 훨씬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동명왕편』을 쓴 이규보(1169-1241)에 의하면 당시 주몽 이야기는 교육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국유사』 버전의 주몽 신화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 유화는 부여에서 햇빛을 받고 알을 하나 낳는다. 부여왕 금와가 그 알을 버렸지만 개, 돼지, 소, 말이 피해 가고 새와 짐승들이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주몽은 부여의 왕자들과 함께 자랐지만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길을 떠난다. 중간에 강이 있어 길이 막히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길을 만들어 주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졸본 땅에서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같은 유형의 신화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인 1세기의 『논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야기의 무대는 부여가 아니라 북방에 있는 "탁리국"이라는 나라다. 알을 낳은 것은 하백의 딸이 아니라 왕의 시녀다. 주인공의 이름은 주몽이 아니라 "동명"이다.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강을 건너 세운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다.
또 5세기의 「광개토왕비문」에 새겨져 있는 이 이야기의 다른 판본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추모"로 되어 있다. 주몽과 추모는 같은 이름의 두 가지 표기법이다. 이상한 점은 이 이야기에서는 추모(주몽)를 동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고구려 멸망 이후 당으로 망명한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산의 묘지명(702)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옛날에 동명이 기를 느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를 품고 패수에 임해 수도를 열었다.” 놀랍게도 고구려 사람들은 동명과 주몽을 연속해서 출현한 별개의 인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주몽이 동명성왕이 된 것은 고려가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며 건국 신화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진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시된 결과일 것이다.
‘동명=주몽’이든 ‘동명→주몽’이든,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인 뼈대는 비범하게 태어난 영웅적인 건국자가 외국에서 이주해 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은나라의 유민이 이주해 와서 지배자가 되었다는 기자조선 이야기와도 통한다. 국가의 시조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건국신화와 민족의 기원을 동일시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다소 낯선 사고방식이지만, 건국신화 일반에서 널리 나타나는 구조다. 일례로 그리스-로마 신화의 아이네이아스는 여신 아프로디테와 트로이의 왕족 안키세스의 아들로, 트로이 함락 이후 이탈리아로 건너가 로마의 시조가 된다. 13세기에 북유럽 신화를 산문 형태로 정리해 『신 에다』를 편찬한 스노리도 신화 속의 오딘과 아시르 신족이 트로이에서 기원한 정복민족이며 북유럽의 왕족들은 그 후예라고 썼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는 왕권의 기원을 토착사회 밖에서 온 외국인에게서 찾는 일반적 현상을 ‘이방인-왕권(stranger-kingship)’이라고 불렀다. 고대 국가나 현존하는 원시 사회에서 최초의 왕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온 왕자 혹은 전사다. 그는 토착민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인물이 된다. 이런 종류의 신화에서 난폭하고 폭력적인 이방인 왕은 토착민 여성과 결혼하여 ‘길들여진다.’ 은나라나 트로이와 같은 멸망한 옛 나라들에서 왕권의 기원을 찾는 것은 그 변형이다. 이들은 신화의 기록 시점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지만, 왕가의 시조가 그 후예라면 해당 국가는 멸망한 고전 문화의 계승자를 자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종족 의식이 장기간 지속되며 주변 국가들과의 분리 의식이 분명해지면 마침내 왕은 궁극적인 이방, 즉 ‘천상’으로부터 도래했다고 믿어진다. 하늘, 또는 신들의 세계에서 내려온 존재가 건국자의 조상이라는 환웅-단군, 스사노오-진무천왕 등의 이야기가 그렇다. 근대 이후까지 살아남은 건국신화는 대체로 이 마지막 유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왕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민족의 특별함이다. 따라서 근대 건국신화는 수많은 고전 신화 가운데 되도록 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본을 선택해 한 가지 요소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시조는 신성한 세계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왔으며, 모든 국민은 그 후손이라는 아이디어다. 즉,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어효선 작사, <서로서로 도와가며>(1930))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한승훈(종교학자)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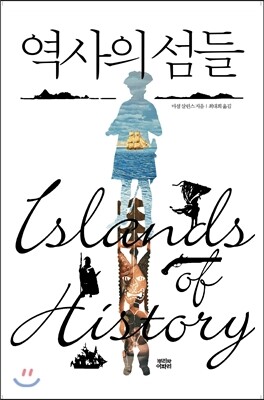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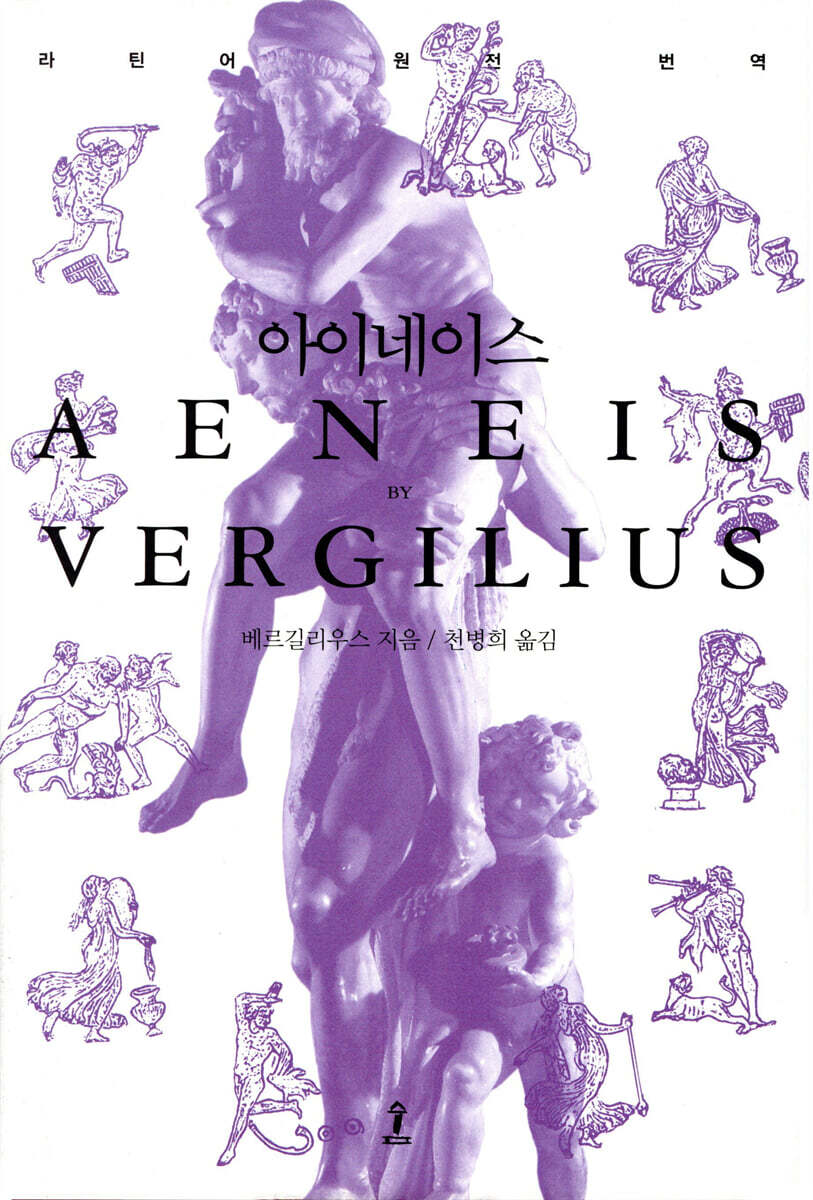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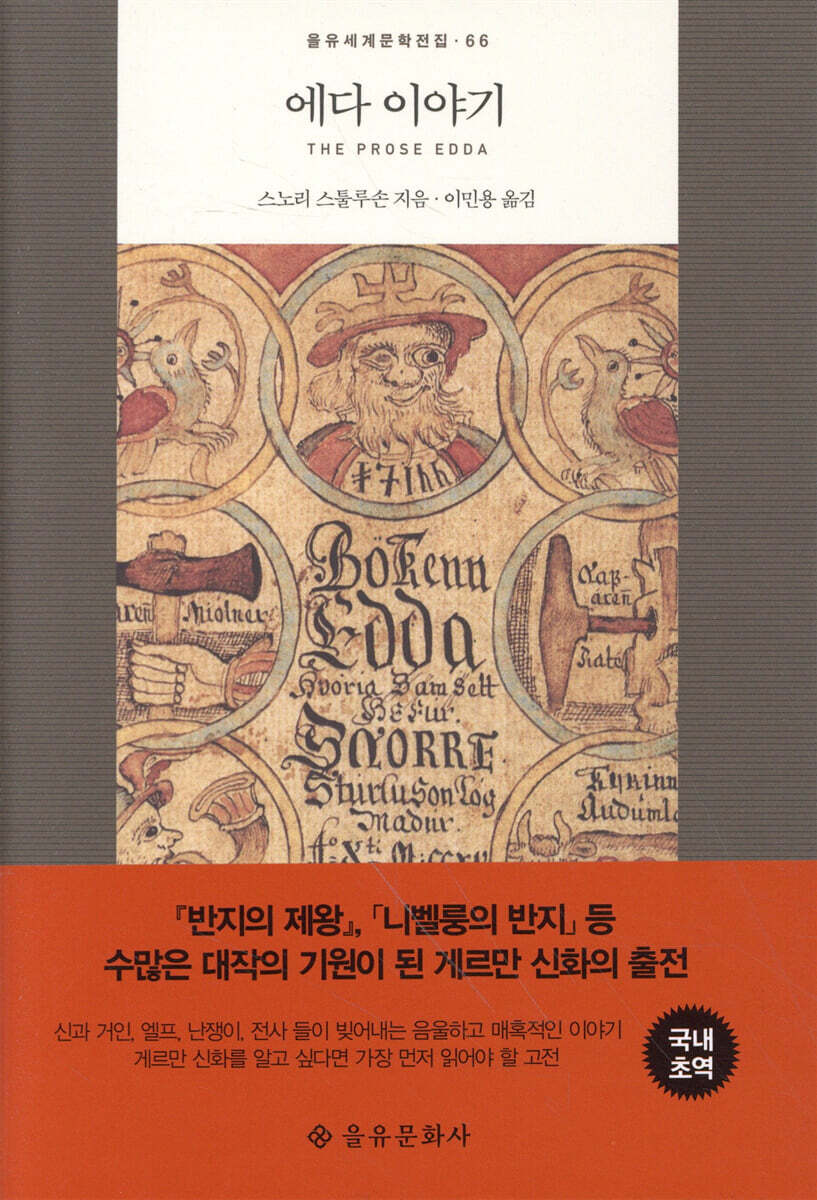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장진영 “글을 쓰면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3a5c6c82.jpg)

![[더뮤지컬] <명성황후> 김소현·손준호, 무수한 질문 끝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7-37c949b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