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가 진행하는 글쓰기 공모전 ‘나도, 에세이스트’ 대상 수상자들이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에세이스트의 일상에서 발견한 빛나는 문장을 따라가 보세요. |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2021년 10월 3일, 오늘은 허수경 시인의 3주기입니다’라는 김민정 시인의 트위터 글을 보았다. 허수경 시인의 49재에 다녀왔던 3년 전 하루가 떠올랐다.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때도 트위터 글을 보고 북한산 중흥사에서 열리는 49재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웬 49재?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해 10월에 동네 뒷산에서 넘어져 팔을 깁스한 상태였기 때문에 산행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다. 팔 다치고 첫 산행인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폐 끼치게 되지 않을까. 가보지 않은 산길인데 험하면 온전치 않은 오른팔로 몸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여러모로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 보기로 했다.
시인 허수경의 이 세상 마지막 길 배웅을, 먼 진주도 아니고 더 먼 독일의 뮌스터도 아니고, 서울 북한산에서 할 수 있다니 가야만 했다. 그의 시구에 기대어, 한 세상 빚지며 살아왔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기억하겠다고. 시인 하늘로 떠나는 날, 날씨는 어찌 그리 화창한지, 11월 중순의 메마른 산길에서 바라본 하늘은 시인 자리를 벌써 잘 준비해 놓았다는 듯 시리도록 맑고 푸르렀다. ‘떠나기 좋은 날씨다’, 『혼자 가는 먼 집』을 예비한 시인을 맞이하는 하늘이라 생각했다. 2년 전 봄, 오랜만에 친구들과 경남 지방 여행 중에도 굳이 진주에 들렀다. 허수경 시인의 고향이라 가보고 싶었다. 진주 남강을 지나기도 하고, 촉석루에도 앉아보고, 진주비빔밥도 먹으며 ‘진주 저물녘’에 시인이 그리워했을 공간이라 생각했다.
그의 첫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다시 꺼내 본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므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하고 시인의 ‘책 뒤에’ 말이 적혀있다. 1988년 11월 30일 펴냄. 시인이 새롭게 편집해 펴낸 산문집, 『그대는 할 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의 표지를 들추니 “2018년 허수경입니다”라고 쓰여있다. 첫 시집 이후, 동년배 여성 시인인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의 시가 좋았고 나중에는 독일에서 내가 배우고 싶던 고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았다. 그 30여 년 동안 시인이 먼 이국에서 시와 고고학으로 그의 언어를 찾는 동안, 나는 직장생활과 아이 키우며 살림하며 때로는 한 해에 책 한 권 읽지 못하는 바쁜 일상을 이어왔다. 그래도 어느 날, 그의 시집이 새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읽지 못해도 샀다. 시 한 편 읽을 여유가 없어도 내가 좋아하던 시인이 그 먼 곳에서 모국어를 벼려 또 한 권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생각이 들면 뭉클했다.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 게 좋았다.
그의 시 「탈상」을 다시 읽어본다. 어린 모를 흔드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떠난 사람 자리는 썩어나고 슬픔을 거름 삼아 고추는 익어가고, 우리는 처연하게 삶을 이어간다. 33년 전 어떤 마음 상태에서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구에 매혹되었는지는 잊었다. 다만 시집의 한 시의 제목도 아닌 한 구절이 시집 제목으로 쓰일 정도였으면 당시에도 많은 사람에게 가닿는 구절 아니었을까 상상해본다.
벅찬 일상을 이어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다. 고통을 대면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사는 게 좀 슬펐다. 어쩌니저쩌니해도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일상을 이어가는 일이 매번 고달프고 슬펐다. 그저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면 시를 읽고 노래를 듣고 그림을 보고 책을 읽으며 들과 산을 걸으며 살아냈다. 그러면 슬픔이 좀 가시고 딱 한 주일분의 살아갈 힘이 생겼다. 그렇게 슬픔을 거름 삼아, 그 시구에 기대어 힘을 내고 세상을 건너왔다.
시인이 그 마음을 적확하게 알아준 것 같아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그의 첫 시집에 오래 빚졌다. 이제 그의 시를 오래 읽으며 그를 기억할 일만 남았다.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그는 죽은 게 아니다. 허수경 시인의 3주기, 그의 시를 읽으며 하루를 보낸다.
*생강 지구에 쓰레기를 덜 남기기를 고민하며 매일 배운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출판사 | 실천문학사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출판사 | 난다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출판사 | 난다
혼자 가는 먼 집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생강(나도, 에세이스트)
지구에 쓰레기를 덜 남기기를 고민하며 매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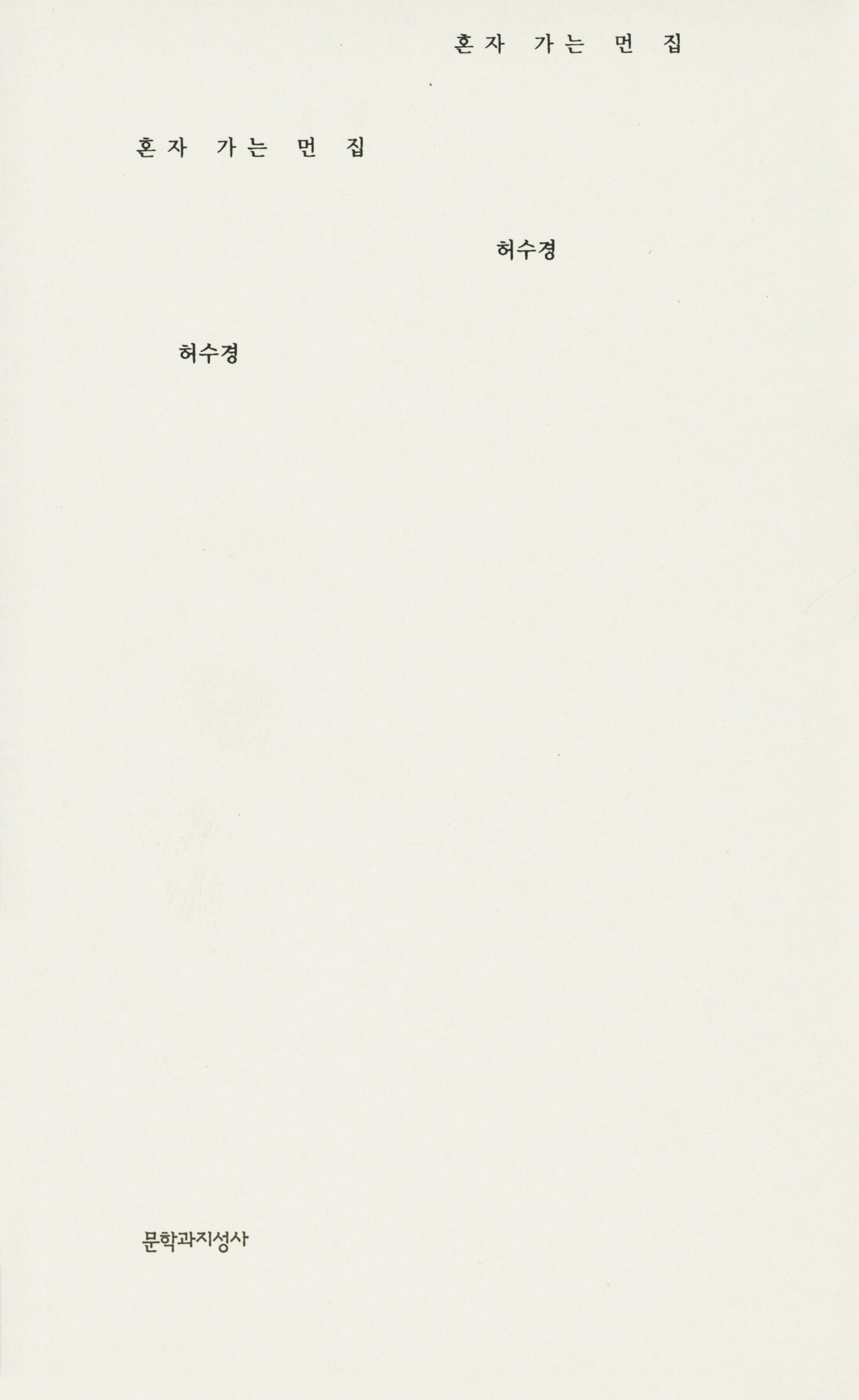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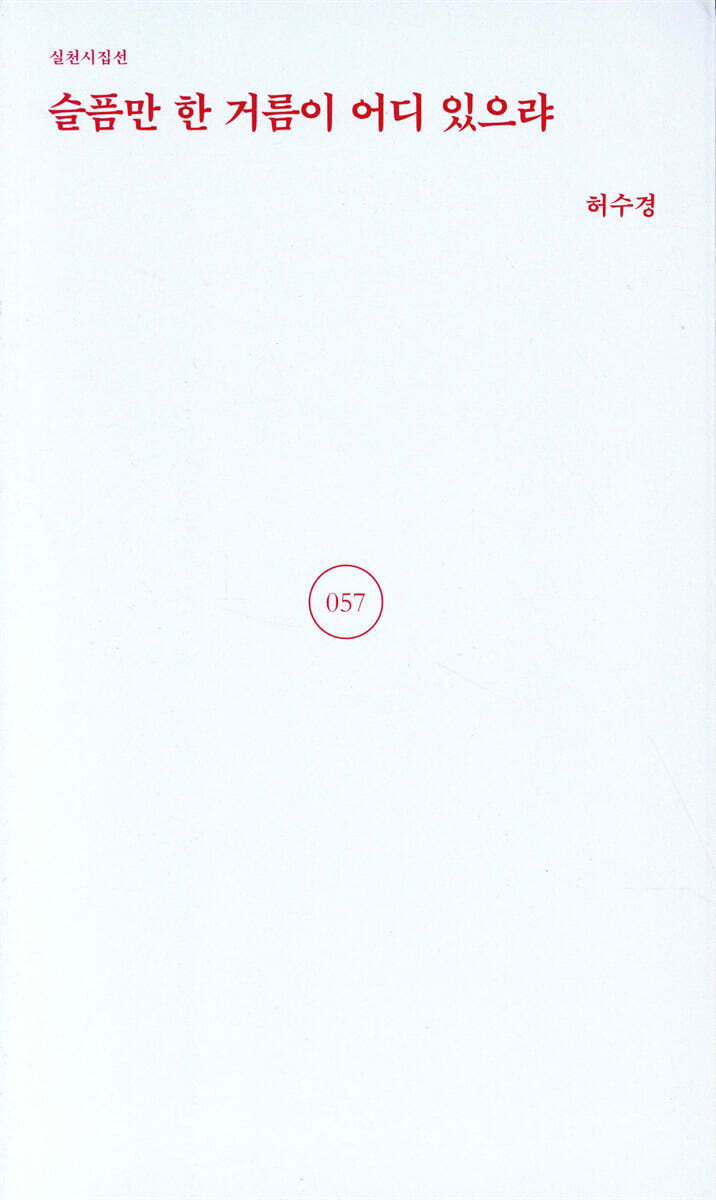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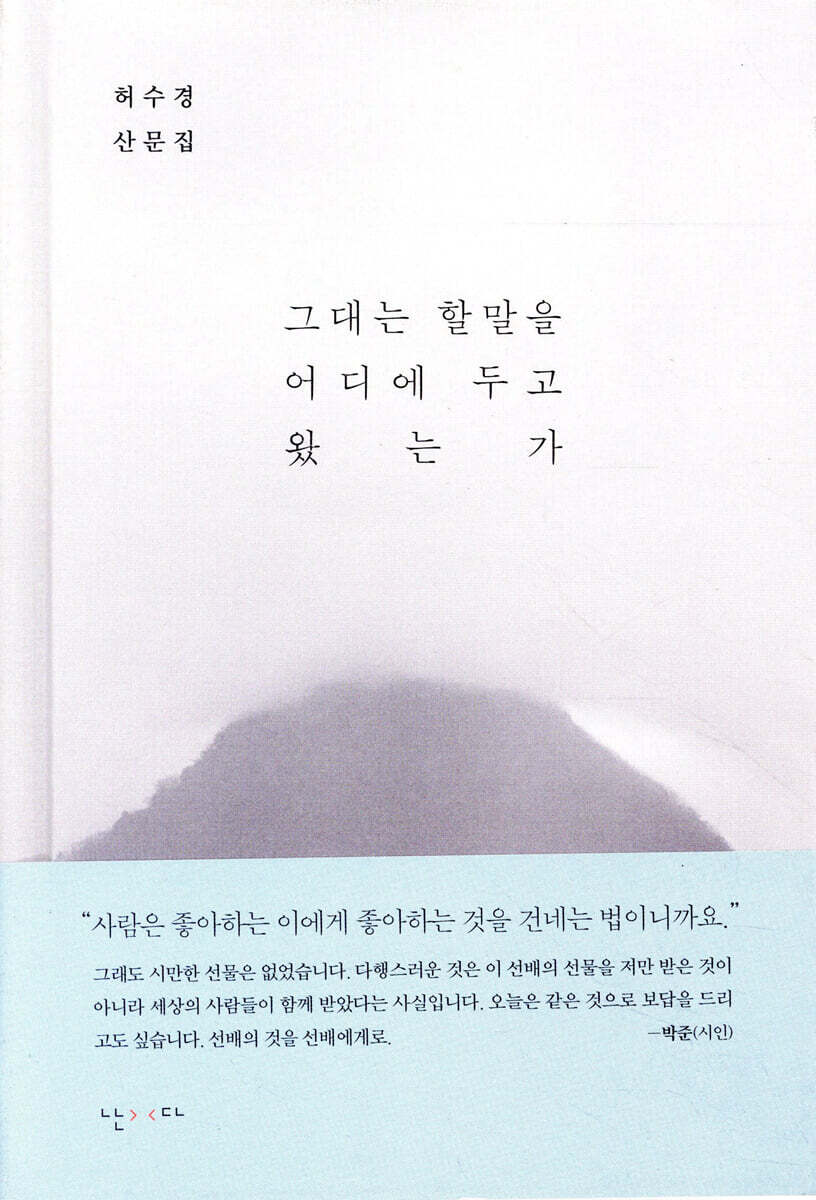
![[에세이스트의 하루] 오후의 맥주 한 캔 ? 김혜진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3/1/b/b31b38720e6e2ab6f02178b535c7925b.jpg)
![[에세이스트의 하루] 우주기행문 ? 김기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2/1/b/221baeb01eef574b907913afc589ba06.jpg)
![[에세이스트의 하루] 용기를 내보면 좋겠어 ? 제갈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8/4/0/1/8401e54418d87732b73a7858c3ecff1f.jpg)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더뮤지컬] <라흐 헤스트> 홍지희, 마음이 전하는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7-fec6e03d.jpg)
![[Do you know? 한강] 소설은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9/e/6/8/9e6833165b0983b83dc59a8e180bbfa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