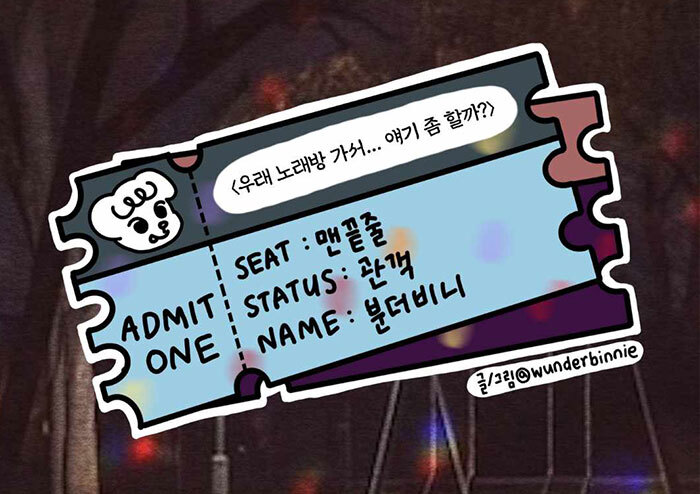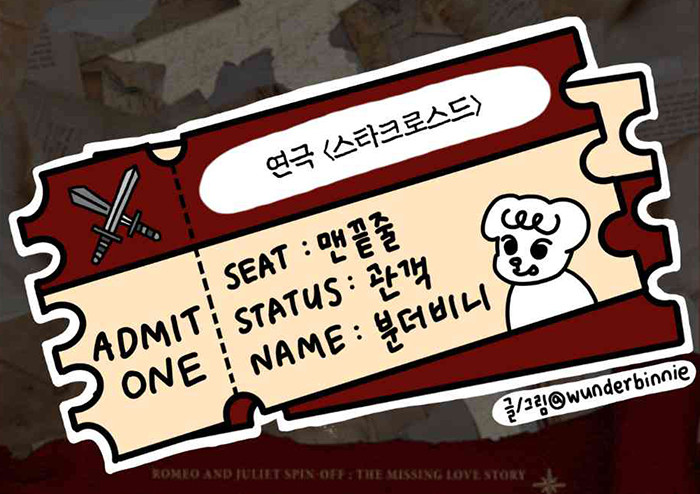르누아르 <피아노 치는 소녀들>(1892)
르누아르 <피아노 치는 소녀들>(1892)
사람들은 오래된 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 나는 보통 ‘어떻게 하면 망자(亡者)에게 최대한 누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저 무덤을 가를 수 있을까’ 생각한다. 오래전 잠시나마 고고학도였던 흔적이 기묘한 방식으로 나에게 남아 있다. 고고학도란 무덤의 집도법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 발굴장에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 시간의 층위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이다.
『고고학 입문』 교재를 들춰 발굴 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살펴본다. 고분을 발굴할 때는 사분법(quadrant method)을 쓴다고 대학의 첫 학기 때 배웠다. “원형의 봉분이 있다면 우선 원점 중심으로 봉분을 사등분한 후 서로 엇갈려 마주 보는 부분을 차례로 발굴한다. 이때 폭이 50센티미터, 1미터, 또는 그 이상의 둑을 남기는데, 이 둑에는 봉분의 퇴적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층위가 명확히 나타나므로 봉분의 축조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발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수업기간에 받아 적었다.
고고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강석경 소설 『내 안의 깊은 계단』에 이런 구절이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굴지의 이천 년 전 무덤들과 현대의 무덤이 공존하고 있다. (...) 층층이 쌓인 삶의 각질과 죽음,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 인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오늘도 주검을 거두며 시간의 강은 살쪄가는 것이다.
_강석경, 『내 안의 깊은 계단』 (창작과비평사, 2000)에서
『고고학 입문』에서 중요한 것들은 강의실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웠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굴장에서 배웠다. 주말이면 아차산에 올랐다. 당시 우리 학교 박물관은 아차산성을 발굴 중이었다.
‘사이트마스터’라 불리는 현장 총책임자 대학원 선배가 목장갑과 함께 트라울(trowel)이라 부르는 자그마한 삽 하나씩을 던져주면 하루 종일 흙구덩이 속에서 땅을 팠다. 신입생이 한 사람 몫을 할 리 없었지만 그래도 선배들은 소소한 일거리를 주었다. 그것이 그들이 후배에게 베푸는 애정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다. 대책 없이 파도 뭐라도 나왔다. 주로 깨어진 토기 조각이었다. 언젠가 나도 금붙이 같은 걸 파낼 날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파고 또 팠다.
트렌치에 들어가 지층의 단면을 살펴보는 걸 좋아했다. 켜켜이 쌓인 지층의 빛깔이 다른 것은 지층마다 누적된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층위마다 다른 시간과 역사, 문화와 삶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 신비로웠다. 요즘도 레이어드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지층을 떠올린다. 칼로 반듯이 잘린 단면을 보며 ‘이 빛깔과 이 빛깔의 경계가 고구려와 통일신라 사이라면?’ 하는 공상을 펼쳐본다.
학교 박물관에 꾸준히 나갔다. 선배들이 “언제든 오라.”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농 삼아 스스로를 ‘사이트마스코트’라 칭하던 4학년 언니가 토기 세척법과 복원법, 실측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해 박물관에선 아차산 4보루 발굴 결과 출토된 유물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아차산 4보루는 남한 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구려 유적. 어느 겨울날 저녁, 양동이 한가득 차가운 수돗물을 담아와 맨손으로 토기를 헹구던 기억이 난다. 세척을 마치고 나니 손에 흙물이 들어 있었다. 그 느낌이 싫지 않았다. 흙물이 손에 말라붙어 얇은 더께가 앉은 걸 보고 있자니 그 토기를 사용했을 아주 옛날 사람들과 잠시나마 한 지층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는 한눈에 고구려 토기를 알아볼 수 있다. 어깨가 좁고, 몸통이 길어 장동호(長胴壺)라 불리는 항아리.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김훈 소설을 보았을 때 생각했다. '고구려 장동호의 추억'이라면 나도 쓸 수 있을 텐데.
“인디아나 존스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고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많은 대한민국 고3들처럼 대학과 학과를 성적 맞춰 정했다. 아버지는 법대를 보내고 싶어 했고, 나는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다. 시험 결과 법대 갈 성적은 안 나왔고, 결국은 인문대 내에서 승부를 봐야만 했다.
아버지는 딸이 국문학도가 되는 걸 반대했다. “더 이상 즐기면서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고고미술사학과에는 의외의 호감을 보이셨다. 정확히는 고고학에 대한 호감이었다.
“Y(아버지 친구)가 그 과를 나왔잖아. Y를 보고 깨달았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공부는 이거였는데!”
박물관은 내게 익숙한 장소였다. 미술관도 화랑도 없는 작은 도시 진주에서 국립박물관은 보기 드문 문화 시설이었다. 어린 날, 어두컴컴하고 서늘한 박물관 안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박물관 1층 로비에 고대의 묘(墓)가 재현돼 있었다. 2층으로 이어지는 난간에서 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한 구조였다. 진짜 해골이 누워 있는 걸까? 무덤 안이 무척 궁금했지만 까치발을 해도 안을 들여다보기엔 역부족이었다. 오직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감지할 수 있었다. 무덤은 안을 볼 수 없어 더 신비로운 존재였다.
전시실 진열장에는 각종 부장품(副葬品)들이 놓여 있었다. 금귀걸이와 곡옥목걸이가 있는 전시실을 가장 좋아했다. 트로이아를 발굴한 하인리히 슐리만의 위인전을 읽었을 때, 슐리만이 무덤에서 꺼낸 목걸이를 아내 소피아의 목에 걸어주는 장면에서 나는 박물관에서 본 귀걸이와 목걸이를 직접 걸어보는 상상을 했다. 『내 안의 깊은 계단』에서 강주의 약혼녀 이진은 곡옥목걸이를 선물받고 싶다고 강주에게 말하는데, 고고학도를 애인으로 둔 여자가 누리고 싶어 할 법 한 낭만이라 생각한다.
 (좌) 트로이를 발굴한 하인리히 슐리만 / (우) 트로이에서 발굴한 장신구를 착용한 슐리만의 아내 소피아
(좌) 트로이를 발굴한 하인리히 슐리만 / (우) 트로이에서 발굴한 장신구를 착용한 슐리만의 아내 소피아
봄에, 발굴장에 벚꽃이 후두둑 떨어졌다. 벚꽃은 트렌치 안에도 쌓여 인간이 손댄 흔적을 여리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화시켰다. 낮에는 기계처럼 일만 하던 선배들이 밤이 되자 술에 취해 “네가 오늘 토기 조각을 파내던 그 자리에 벚꽃잎이 쌓이는데 말이야…… 그게, 그게 미치겠더라고.”라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주말에 발굴장에만 박혀 있기엔 아까운 청춘들이었다. 벚꽃은 빗물에 이내 쓸려가 없어졌고, 선배들은 다시 멀쩡한 얼굴로 발굴장에 나갔다. “너 그러면 정말 묻어버린다!” 같은 썰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책장에 꽂아두고 있던 발굴보고서는 얼마 전에 모두 버렸다. 한 권만은 버리지 못했다. 『아차산 제4보루 발굴보사 종합보고서』. 「서언(序言)」에 이런 문장이 있다.
“유물과 복원과 실측은 (……) 학부생 곽아람 등이 수고하였다.”
내 이름이 실린 최초의 책. 내가 서툴게 실측하고 사이트마스터 선배가 거듭 수정한 도면이 몇 장 수록돼 있을 것이다.
사이트마스터 선배는 도무지 진전이 없는 나의 토기 실측을 지도하다 “너 때문에 울화가 치민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곧 돌아와 사과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내가 뉴욕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있고 그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파견 가 있던 시절, 만나 그 이야기를 하며 놀렸더니 ‘내가 그랬었나?’ 겸연쩍어했다.
중정(中庭)이 아름다운 메트(MET)의 리먼컬렉션 전시실에 비스듬한 햇살이 내리쬐던 날, 그와 나란히 앉아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던 오후가 선명하게 기억난다. 한때의 고고학도는 안다. 기억과 마음에도 층위(層位)가 있다는 것을. 나는 종종 ‘내 안의 깊은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 층위마다 쌓인 묵은 이야기들을 헤집어 꺼내 헹군다. 깨어진 토기 조각을 이어 붙이듯, 복원한다.
사람을 사귈 때면 항상 마음속 지층을 가늠해 본다. 이 사람은 어느 층위까지 내게 보여줄 것이며, 나는 내 안의 어떤 층위까지 그를 허용하고 인도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층위마다 차곡차곡 고인 슬픔과 눈물과 어두움과 절망과 상처와 고통, 기쁨과 웃음과 약간의 빛의 흔적……. 나는 손을 내밀며 상대에게 묻는다. 더 깊은 곳까지 함께 내려가 주겠냐고, 그 어떤 끔찍한 것을 보게 되더라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곽아람(작가, 기자)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에세이스트의 하루] 세상 발레 가기 귀찮아하는 사람의 발레 예찬론 - 이윤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8/2/e/982e6309de2792fe745e44a4b55ca4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