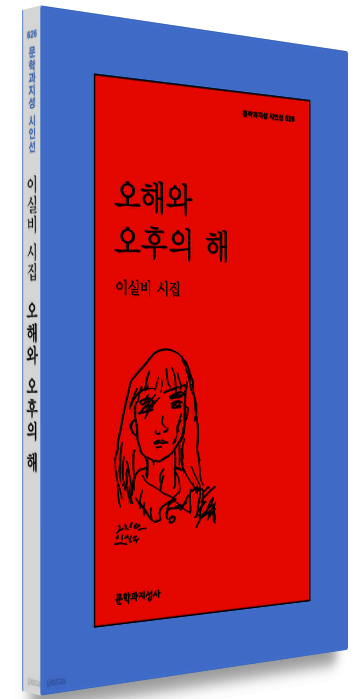202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실비 시인의 첫 시집 『오해와 오후의 해』가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다. 이실비의 시는 사랑이 불러온 어둠을 탐사하면서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사랑의 속성을 파헤친다. 지독한 성장통을 겪으며 사랑의 본질을 깨우친 끝에, 빈칸을 남겨둔 편지를 타인에게 건네는 이 시집의 움직임은 애틋할 만큼 깊은 울림을 준다. 강렬한 색채 이미지와 독창적인 서사 공간, 속도감 있는 시상의 전개로 출간 즉시 독자들을 사로잡은 시인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첫 시집 『오해와 오후의 해』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축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대학교 1학년 시 창작 수업이었어요. 당시엔 시라고 생각하며 썼다기보다는, 남들에게 말한 적 없는 나의 비밀을 서툴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해본다고 느꼈어요. 수업을 마치고 “무슨 말인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왜인지 네 시를 읽으면 슬퍼”, 그런 말을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를 쓸 때면 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이해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이 좋았습니다.
‘고통에 대한 응시’가 인상적인 이실비 시인의 시 세계의 문을 여는 시로 추천할 만한 작품이 있으실까요?
문을 여는 시라면, 「조명실」이라는 시를 독자들에게 건네고 싶어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응시할 때 그리고 그것에 연대할 때, 기억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하니까요. 그 약속을 시작으로 독자들과 저의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집 제목에 담긴 비밀―끝까지 고민했던 다른 제목이 있다든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시집 제목은 처음부터 “오해와 오후의 해”였어요. 처음 지어보는 시집 제목이라 혼자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 시집이 하나의 존재라면, 그에게 내가 편지를 써본다면 어떨지 떠올려보니 확실해졌어요.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때는 촘촘한 실타래였던 엉클어진 오해와 사랑을, 얇은 유리창 같은 당신의 어린 시절을, 감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를 쓸 때 ‘나만의 루틴’이나 습관이 있다면요?
초고는 언제나 손으로 써요. 무지 노트에 날짜를 적고 손이 가는 대로 떠오르는 문장과 이미지, 생각을 혼잣말처럼 마구 적어 내립니다. 고치지 않고 계속 적어요. 노트에 적어둔 후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서, 시의 문장으로 옮겨 와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글쓰기는 버려져요.) 시로 옮길 때도 손 글씨로 쓰고, 손 글씨로 시의 꼴을 갖추고 나면 노트북을 열고 한글 파일로 옮겨요. 옮기면서 퇴고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한글 파일로 옮긴 시는 다시 손으로 필사해요. 필사한 건 다시 필타해요. 필사와 필타를 반복하여 퇴고하는 이 루틴을 거의 고수하는데, 최근엔 손목이 아파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해요.
이 시집에서 “공백”과 “오해”는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어떤 시구보다 강하게 말을 거는 그 ‘비어 있는 자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혹은 어떻게 다루고 싶으신가요.
비어 있는 자리는 시인의 몫이 아닌 것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시인의 의도에 적확하게 맞닿게 읽는 것이 매번 가능할까요? 의도가 없는 시를 읽고 어떤 이는 없는 의도를 발견했다 믿을 때도 있고요. 시를 읽을 때마다 발생하는 저마다의 오해, 시와 오해 사이, 그 틈을 메우는 읽는 사람의 내밀한 마음을 환대하고 싶어요.
시를 쓴 이후로 삶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매번 비슷한 패턴의 상처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시를 쓰게 된 이후로는, 시를 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어떤 하루를 버티게 할 때도 있어요. 나의 비명이 당신의 비명과 닮았다는 사실이 슬프고 안타깝고 고마운 하루. 그 속에서 건져 올린 비밀과 진실. 시를 쓰고 싶다는 욕심으로 몇 글자 적고 있을 때면 내가 참 과분한 삶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와 오후의 해』는 주제가 맞물리는 여러 에피소드가 상영되는 ‘극장’ 같기도 합니다. 시집을 다 읽은 독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잔상’을 지니길 바라나요?
시집을 묶고 나니 드는 생각은, 이 시집이 자동차 뒷좌석에 태워져 덜컹거리며 바라보는 풍경 같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배회하며 예기치 못한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마주하는 것이,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어쩌면 극장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해요.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상영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독자의 마음은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요. 어떤 이는 즉시 자동차 뒷문을 열고 내리듯 시의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다시 마주하고 싶은 풍경으로 되돌아가 유리창 너머의 시와, 설핏 비치는 당신의 얼굴을 겹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와 겹쳐 보는 자신의 얼굴, 그 잔상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요.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오해와 오후의 해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