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신이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십시다.”
어머니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미간이 좁혀졌고 달뜬 욕이 튀어나올 것처럼 입술이 뒤틀렸다. 나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곧장 깨달았다. 웃어른에게는 게다가 부모님께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은 대학교의 동아리 후배에게나 건넬 말이었다. 혹은 백일 휴가를 나온 이등병에게나.
나는 청춘의 어느 시기를 그 말처럼 살고자 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당장에 전쟁이 나서 예비군으로 끌려간다면, 우산을 쓰고 가다가 번개를 맞아 즉사한다면. 물론 그런 일들은 확률적으로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내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다.(파스칼, <팡세> 3장 194~1절)’ 꼭 극단적인 죽음을 이르는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이 순간을 똑같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한 걸음으로 현재에서 멀어지고 있다. 결국 이 순간은 시곗바늘의 초침에 찔려 죽어버리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은 마지막이다.

반대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말은 제법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오늘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결국 내일이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오늘을 살아낸다는 표현에는 무언가 의지가 엿보인다. 그건 시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기억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넘어가는 달력이나, 떨어지는 잎사귀나, 스쳐가는 바람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파도에 깎여온 몽돌의 작은 움직임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제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것일까, 잊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것일까. 결국 이 에세이는 포구에 서서 바라본 바다에 대한 이야기였겠으나, 씻겨 내려간 망각 혹은 아직 남아 있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내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가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나는 태어났다. 외항선원 생활로 2년간의 항해 후에야 비로소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편지로 아들의 이름을 보내왔다. 안아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핏덩어리에게 자신의 성(姓)을 붙여 보내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연필을 쥔 아버지의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 필체가 좋아 군에서도 수기를 담당했다는 아버지는 몇 번이고 이름을 고쳐 쓰고 지우고 다시 적었을 테다. 늦은 밤, 기관실의 불을 켜고 옥편을 뒤져보았을까. 점을 친다는 늙은 선원에게 쌈짓돈이라도 건넸을까.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나의 이름은 바다 위에서 완성되었다. 그 이름은 스페인의 항구에서 또다시 바다를 건너 부산의 작은 섬 영도로 도착했다.
아버지는 그 즈음 스페인의 시장에서 필름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다. 자신의 모습을 필름으로 기록하여 훗날 내게 보여주기 위한 작정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야자수 나무에 기대어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자유로운 기운이 가득한 술집에서 얼굴이 붉어져 웃고 있었다. 외국인 선원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도, 커다란 배가 묶인 밧줄을 잡으면서도 오로지 단 한 곳을 응시하며 웃고 있었다. 무엇을 바라보며 웃었던 것일까. 렌즈 속으로 빛과 함께 흡수된 그 미소는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
나는 그곳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갈 곳은 단 한 점, 세상의, 우주의, 이 거대한 혼돈 속의 단 하나의 점. 어머니와 내가 있는 그곳이리라.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태어난 곳,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파하며 아버지를 낳았던 그 자리, 내 할머니의 치마 속, 넓은 자궁, 그 속에 출렁거리는 양수와 한 줄기의 살 고름, 배꼽, 그 깊고 어두운 곳에서 터져 나오던 아버지의 울음. 그 속으로, 바다 속으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는 어느 날 문득 카메라를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작동법도 잘 모르고, 무엇을 찍어야 하는 지도 잘 몰랐다. 여러 날의 실패 끝에서야 비로소 카메라가 내 것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내 것이 되었으니, 나는 아직 아무것도 찍지 못했다. 쓰지 못했다. 다시 말해, 찍고 써야할 것투성이다. 바다 소년의 포구이야기의, 그 소년은 어쩌면 내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어렸을 적, 소년이었을 적, 그 소년은 포구에서 뛰어 놀았다. 지금도 여전히 바다에 나가서 밧줄을 당긴다. 결국 이 에세이는 포구에 서서 바라본 바다에 대한 이야기였겠으나, 씻겨 내려간 망각 혹은 아직 남아 있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읽어준 그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지금까지 '바다소년의 포구 이야기'를 사랑해주신 독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
바다 소년의 포구이야기 오성은 저 | 봄아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축복받은 자연환경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포구를 간직하고 있다. 마도로스의 아들로 부산에서 태어나 아직 청춘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젊은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행은 그곳에 서서 잠시 읽어보는 것, 그려보는 것,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누구나 지금 당장 푸른 바다를 품은 포구를 향해 떠날 수 있다. 이들 포구로 향하는 길은 분명, 언제나 청춘 같은 삶의 힘찬 생명력을 발견하는 기쁨이며, 다시 삶의 소중함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바다를 통해 더 넓고 깊은 마음을 품게 된 자신을 발견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추천 기사]
- 포르부에서의 한나절
- 바다에서 소년에게, 오성은
- 광안리 밤바다와 청춘의 까대기
-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 오페라 하우스

오성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씨네필
문학청년
어쿠스틱 밴드 'Brujimao'의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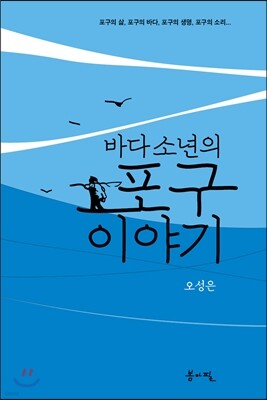

![[젊은 작가 특집] 백온유 “언젠가는 공포 소설을 제대로 써보고 싶습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8e240083.png)
![[젊은 작가 특집] 김지연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b0f5351.pn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소나기
2014.09.30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읽었습니다.
inee78
2014.09.25
앙ㅋ
2014.09.25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