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4.
 |
 |
김언수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 2년 전에 <문장 웹진>에 연재할 때 도입부까지 읽었는데, 그때 제목은 ‘구암의 바다’였다. 후반부까지 집필을 마친 후 『뜨거운 피』라는 새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 새 옷에서 좀 더 수컷 냄새가 난다.
당시에도 느꼈지만, 도입부터 독자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 끈다. 손과 눈이 책에 포박당해 꼼짝달싹 못 하는 느낌이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아깝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다. 내일이 추석이라 아내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뜨거운 피』의 스토리가 어찌 전개될지 궁금해 안부 인사에 아무렇게나 답해버리고 말았다.
“최 서방 요즘은 글 안 써?”
“아. 네.”
“아니 작가가 글 안 쓰면 어떻게 지내. 놀아?”
“네.”
“이거. 최 서방 요즘 큰일이네!”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설이다.
9. 15.
오늘은 아버지 내외가 집에 다녀갔다. 오전에 식사하신 후 빨리 가신 덕에, 『뜨거운 피』를 100쪽가량 읽을 수 있었다. 『뜨거운 피』는 기본기에 충실한 소설이다. 특히, 인물을 등장 시키는 기술이 그러하다. 가령, 작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공이 OO와 마주쳤다’와 같은 문장을 쓴 후, 그때부터 갑자기 OO의 성격, 특기, 세계관, 그리고 지나온 삶의 여정까지 태연하게 늘어놓는다. 아울러, 차후에 등장할 인물 역시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미리 소개해놓는다.
예컨대, 이런 식.
‘희수가 담배 한 대를 다 피우자 단가도 소파에 있는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아미가 내일 출감한다는데. 들었어요?’
그러면, 작가는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미’에 대한 설명을 한다. ‘아미가 감옥에 간 것은 1989년이었다’라고 운을 띄운 뒤, 무려 4쪽에 걸쳐 그가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는지, 그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는지, 도대체 주인공과 어떠한 관계인지, 체구는 어떠한지, 거의 모든 사연을 소설의 배경지인 부산 암흑가의 흥망성쇠까지 곁들여 설명해낸다.
이런 식으로 차후에 등장할 인물을 소개하고, 대사마다 사건의 불씨를 남겨둔다. 그리고 잠복시켜 놓은 사건의 불씨는 그게 50쪽 뒤이든, 200쪽 뒤이든 기어코 점화시킨다. 결국, 독자는 작가가 심어놓은 불씨가 점화되는 광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점점 더 소설에 몰입하게 된다. 추석에 가족 만나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는 나처럼.
이 기본적인 기술을 나는 그동안 잘 활용하지 않았다. 뭔가 다른 소설을 써보려고, 나만의 방법대로 서사를 전개해보려 애썼는데, 결국 나만 즐기는 서사가 나와 버렸다. 하여, 절도일기의 취지에 걸맞게 오랜만에 김언수 작가의 인물 등장 기법과 서사 점화법을 훔치기로 했다.
9. 16.
356쪽까지 읽었다. 읽을수록 대사와 대사 사이의 지문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깔끔하기도 하고, 적확한 묘사가 곁들여져 있기도 하고, 적당한 멋을 부린 수사가 빛을 발하기도 한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피』는 김언수 작가가 이때껏 쓴 장편 소설 중에 가장 몰입도가 높고, 가장 빠르고, 가장 독하다. 미학적 분위기도 빼어나다. 건달들의 이야기가 어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쓴 작품 중에서 최고인 것 같다.
9. 19.
『뜨거운 피』는 너무 재미있기에, 아껴 읽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재미있는 소설은 뒤 장면이 궁금해 밤잠을 포기하고 읽었을 텐데, 그럴 경우 대부분 스토리가 잘 기억나지 않고, 문장의 참맛도 음미할 수 없었다. 하여, 지난 이틀간 몸이 피곤할 때는 읽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일부러 잤다. 그리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읽었다. 마치 맥주를 음미하기 위해, 땀 흘리며 달리듯 말이다. 그러니, 확실히 소설의 매력이 더욱 진하고, 깊게 전해졌다.
더글라스 케네디와 김언수 작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야기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장면에서는, ‘어이. 바쁠 땐 돌아가라고’라고 하듯이 한 템포 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듣는 사람이 조바심이 나듯. 그럴수록 다급한 독자는 허겁지겁 이야기를 읽어치울 것이다. 걸신들린 먹보처럼.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 픽처』를 읽으며 일찌감치 이 기술을 훔치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훔쳐 마땅한 기법이라는 걸 확인했다.
내 안에 별이 계속 늘어가는 것 같다.
물론, 이 별은 독자들이 리뷰를 올릴 때 달아주는 별이 아니라, 절도한 나의 전과를 상징하는 별이다.
9.20.
마침내 『뜨거운 피』를 다 읽고 말았다. 완독을 한 후 슬픔이 밀려왔다. 대개 독서를 마치면, 한 권을 끝냈다는 보람이 느껴지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할 때의 설렘과 흥분으로 읽을 수 없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과연 올해, 아니 향후 몇 년 동안 이처럼 강렬하고 흥미로운 소설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훔치고 이 소설을 읽는 느낌을 정리한다.
『뜨거운 피』는 한국판 갱스터 무비 같은 소설이다. 우리가 마피아나 야쿠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촌스럽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이른바 ‘문화적 완충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 태연하게 스크린이나 소설 속 페이지에 ‘날 것’으로 등장하면 독자나 관객은 뒷걸음질 치게 된다. 쉽게 말해 ‘예술적 아우라’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 일상과는 ‘뭔가 다른’, ‘조금 거리가 있는 걸’ 작품 속에서 보길 원한다. 그렇기에 건달의 이야기가 한국을 배경으로 하면 너무 익숙하다 못해 촌스럽다는 인상을 준다. 같은 이유로, 시카고나 시실리아가 배경인 마피아의 이야기는 예술적 공기를 선사한다고 여긴다. 가령, 갱단의 하수인이 낡은 가죽 재킷 깃을 세우고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씹어 먹는 장면과, 한국의 조폭 말단 건달이 ‘김밥천국’에서 김밥 한 줄을 1,500원 주고 사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왠지 후자의 장면은 너무 일상적이라, 영화 혹은 소설로 쓰이기에 가치 없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기에, 모든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어떻게 하면 ‘예술적 장치’로서 격이 떨어지지 않게 보이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 그런 점에서 김언수 작가의 『뜨거운 피』는 보란 듯이 성공을 거둬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과는 다른 격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산의 이미지도 충실히 재현해낸다. 등장인물의 별명, 대사, 지문 묘사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훌륭한 소설이다.
이런 말은 뭣하지만, 내 신작 소설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과 김언수의 『뜨거운 피』 중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뜨거운 피』를 읽기 바란다. 그만큼, 이 소설은 훌륭하다. 물론, 시간과 금전이 허락된다면 내 소설도 읽어주길. 당연한 말 아닌가.
끝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뜨거운 피』는 올해 읽은 한국 소설 중 가장 재미있었다. 아니, 대단했다.
몰입도, 서사력, 묘사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다. 600쪽이 아니라, 1,000쪽이라고 해도 나는 다 읽었을 것이다.

최민석(소설가)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제10회 창비신인소설상(2010년)을 받으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능력자> 제36회 오늘의 작가상(2012년)을 수상했고, 에세이집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를 썼다. 60ㆍ70년대 지방캠퍼스 록밴드 ‘시와 바람’에서 보컬로도 활동중이다.










![[구구X리타] 책은 아이들에게 권리가 있다 - 장르 소설과 쾌락](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3-d56fd06e.jpg)
![[젊은 작가 특집] 예소연 “소설이 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e92deff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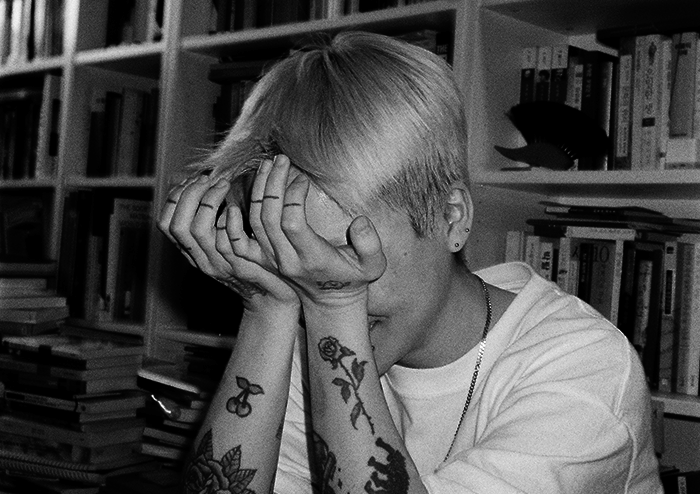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큐레이션] 부모가 먼저 감동할지도 몰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9-abd83d47.jpg)






ben21273
2016.10.06
iuiu22
2016.09.29
lyj314
2016.09.28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