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현대무용계에서 벨기에 출신 무용 단체와 안무가들의 보여주고 있는 눈부신 활약은 이제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얀 파브르(Jan Fabre)나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Anne Teresa De Keersmaeker), 혹은 빔 반데키부스(Wim Vandekeybus)같은 대표적인 벨기에 출신 안무가들은 현대무용의 흐름을 새롭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대가들의 출현 이후에도 벨기에 출신 안무가나 단체가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2000년에 등장한 피핑 톰(Peeping Tom)의 출현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사실, 피핑 톰 무용단을 설립한 가브리엘라 카리조(Gabriela Carrizo)와 프랭크 샤르티에(Franck Chartier)는 각각 스페인과 프랑스 출신의 무용수이지만, 두 사람이 안느 테레사나 니드 텀퍼니 등과 작업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왔고 무용단을 창단한 뒤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벨기에 출신’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다.
피핑톰 무용단은 발표하는 작품마다 동시대의 문제를 포착하는 작품의 시의성과 신체 표현의 놀라움, 인간의 삶을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평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특히, 이들이 선보이는 작품들은 서사적?극적 구조를 갖추고 무용수들이 배역을 연기하며 대사를 읊는 등 연극적?영화적 기법을 연출하면서 형식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피핑 톰은 대표적인 레퍼토리 공연의 투어를 포함해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족 시리즈’를 차례로 공개하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족 시리즈’는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의 세 에피소드로 구성돼 차례로 공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인 <아버지(Vader)>는 2014년에 초연된 뒤 14/15년 시즌에 투어 공연을 가진 바 있고, 두 번째 작품 <어머니(Moeder)>가 작년에 초연 무대를 올린 뒤 현재 유럽 투어 중에 있다.

재미있는 점은, 그간 함께 작업을 해왔던 프랭크와 가브리엘라 두 사람이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프랭크가 <아버지>를, 가브리엘라가 <어머니>를 각각 따로 연출했다는 점이다. 시리즈의 전체적인 구성은 함께 논의했지만, 안무가로서 독자적이면서도 보다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에서 이들이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어머니>는 올해 초인 1월에 파리에서 먼저 공연 된 바 있는데, 지난 9월 리옹의 무용 전용극장인 메종드라당스(Maison de la Danse)의 시즌 개막공연으로 기획돼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가족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아버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은퇴 후 요양원에서 지내는 연로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와 자녀들과의 관계, 요양원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공간의 제약, 뻣뻣하게 굳은 신체, 현실과 분리되는 비현실적 환상 등이 ‘아버지’의 초라하고 외로운 말년을 그려내는 식이다.
이번에 공연된 <어머니>도 앞선 작품의 형식을 따르기는 하나 중심인물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옮겨가면서 작품의 시선도 사뭇 달라졌다. <아버지>에서는 감정 표현이 서툴고 고집스러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었다면, 이번 <어머니>에서는 ‘모성애’란 감정이 어머니의 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그 존재로서 얼마나 고독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 작품에서는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대와 주어진 상황이 다른 여러 명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아버지>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미술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미술관이라고는 하나, 이 공간이 외부에 완전히 공개된 공공장소로써의 미술관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미술관에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초상화로 추정되는 그림과 가족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공간을 구성하는 일원(경비, 청소부, 도슨트, 관리자 등)도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엄마’들은 대체로 고독하고, 슬프며, 위로 받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의 처연한 감정은 거의 모성애와 관련되어 있다. 배가 산처럼 부른 산모가 하혈하며 사지를 비틀어 절규하고, 아이를 안은 엄마의 몸이 공중회전을 하며 부서지듯 바닥에 곤두박질쳐지는데도 아픈 티도 내지 않는다. 아이가 눈앞에서 세상을 뜰 때에도, 남편은 폭력적으로 주변 가구를 때려 부수는데 여자는 그저 바닥에 몸을 내리꽂으며 자학하는 것으로 아이를 잃은 고통을 삭힌다. 다른 한편으론, 중년 여성의 드러내지 못하는 욕망을 묘사하기도 한다. ‘엄마의 성욕은 왜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하는 질문 이 전면에 노출되고, 이를 불편하게 묘사하면서 사회적 금기 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인물의 생의 주기를 바라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가브리엘라는 특히 이 작품에서 영화적 기법을 다수 차용하면서 시간을 교란시키고 시각적으로 착시를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소리의 활용이나 카메라의 줌인, 슬로우 등의 촬영기법을 적용한 무대 연출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 가브리엘라는 ‘소리’가 기억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존재의 부재를 드러낼 수 있는 단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모성애와 관련된 소리들을 찾기 시작했다. ‘엄마’라는 인물 혹은 존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찾아 무 대 위에서 확성시키는 방식이다. 공포, 광기, 외로움, 슬픔 등 의 인간 내면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소리들은 물소리, 바람 소리 등으로 변환돼 무대 위로 발화된다.

피핑 톰은 공연의 독특한 형식과 연출 방법으로도 그 특이성을 갖지만, 관절을 예민하게 분절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마치 곡예를 하듯 기이한 포즈로 긴장감 있게 곡선을 그려내는 신체야말로 피핑 톰 공연에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용수가 완벽하게 중력과 힘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근육을 미세하게 사용해야만 가능한 동작들이 결과적으로 나약하게 흔들리는 인간의 내 면을, 거침없이 요동치는 상처받은 한 인간을 섬세하고 또한 거칠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쩌면 조금 거친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문장은, 그 수식만으로도 이미 깊은 슬픔을 안기지 않는가. ‘엄마’를 연기하는 무용수들의 신체가 고통으로 휘어져 꺾일 때마다 객석에 깊은 탄식이 내려앉았다.
이제 ‘가족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아이들>만이 남았다. 피핑 톰이 인간의 고 뇌와 나약함, 외로움의 정서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봤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창작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글 박다솔(프랑스 해외특파원)

춤과사람들
월간 <춤과사람들>은 무용계 이슈와 무용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전문잡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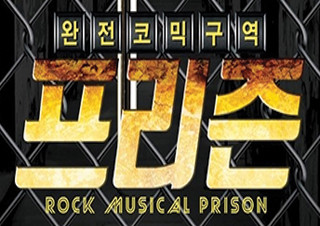

![[더뮤지컬] <생계형 연출가 이기쁨의 생존기> 예상치 못한 질문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c8d7850b.jpg)
![[더뮤지컬] "韓 뮤지컬 60년 역사 정리" 국내 최초 한국뮤지컬학회 창립](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5f8e717b.jpg)
![[미술 전시] 두 거장](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1-3322cc20.jpg)

![[리뷰]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혁신적 틀의 모색, 『밤과 낮』](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2-00286d20.png)

